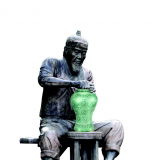시대와의 불화, 여기 이 山水에 젖어 잊었노라
2024년 08월 04일(일) 20:20 가가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일보 공동기획-호남 누정 원림-전남 <9> 화순 송석정]
광해군 5년 양팽손 증손 양인용 건립
당쟁에 정계 혼란…관직 버리고 낙향
암벽과 솔숲·지석강변 수려한 경관
자연 벗삼아 시문 짓고 벗들과 교류
묵객들 150여 시액, 30여개만 보존
추사 김정희·의병장 안방준·송홍 등
광해군 5년 양팽손 증손 양인용 건립
당쟁에 정계 혼란…관직 버리고 낙향
암벽과 솔숲·지석강변 수려한 경관
자연 벗삼아 시문 짓고 벗들과 교류
묵객들 150여 시액, 30여개만 보존
추사 김정희·의병장 안방준·송홍 등
후텁지근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갈증이 인다. 뙤약볕 아래 모든 사물들이 다 녹아 없어질 것만 같다.
장마가 물러간 자리에 폭염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객(客)의 모습으로 들어 앉았다. 올 여름도 불볕은 그 존재를 여실히 증명하겠다는 태세다. 곧 입추인데 폭염의 맹위는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휴가를 소진해버린 이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당겨써버린 휴가에 빈주머니의 허랑함은 카드 결제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무려면 어떠랴. 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은 것이다. 물과 나무, 숲이 그리운 계절이다. 마실이라도 나서려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찾기 일쑤다. 물가에 그림자가 들이치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삼삼히 어른거린다. 찰랑이는 물살에 귓가를 씻고, 불어오는 솔바람에 이런저런 생각을 털어내고 싶은 것이다.
요사스러운 소음이 남실대는 세상이다. 소음과 소문, 거짓과 거짓이 뒤섞여 진실의 경계는 흐릿해진지 오래다. 편을 갈라 벌이는 말의 쟁투 또한 끝이 없다. 민초들 삶은 점점 팍팍해져가고,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은 그저 허공을 향해 한숨만을 몰아쉴 뿐이다.
빛고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길을 잡았다. 오늘 찾아가는 누정은 소나무와 나무, 물빛이 좋은 곳이다. 칼날 같은 시퍼런 수평선이 손짓하는 바다까지는 가지 못할망정 선조들이 벗이라 칭하였던 자연의 친구들을 찾아 간다.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과 분주함을 젖혀둘 참이다.
화순군 송석정(松石亭·이양면 강성리 754). 누정 앞으로 지석강변 수려한 경관이 펼쳐져 있다. 한마디로 기품이 서려 있다. 솔숲과 기암이 어우러진 곳에 들어선 정자는 멀리서 봐도 도드라진다. 마치 주변의 풍광을 거느린 형국이다. 사방의 절경에 정자가 덩그러니 앉혀진 모양이 아니라, 주변 산하가 누정에 수렴되는 지세다. 그러니 ‘절경이다’, ‘풍광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의례적 상찬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 도도한 아름다움, 극미(極美)의 아우라는 일반의 수려함과는 다른 차원이다.
소나무와 돌들은 누정의 명칭에 값할 만큼 천혜의 조화를 이룬다. 청향의 송과 빼어난 돌의 형상은 정자의 품격을 높인다.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소나무와 돌이 주는 품격이다.
조선의 선비 고산 윤선도는 오우가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그는 물과 돌,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달을 벗이라 칭하였다. 고산은 당대 사대부들의 여기였던 한시(漢詩)보다 홀대받던 시조를 즐겨 창작한 문인이었다. 지적인 감성과 감칠맛 나는 우리말을 버무린 그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좋아한다.
송석정을 둘러보며 이름에 담긴 뜻을 가만히 생각해본다. 주인장은 변하지 않는 절개, 시류에 타협하지 않는 독야청청의 삶을 견지했을 것이다.
이곳 누정은 학포 양팽손의 증손인 양인용이 1613년(광해군 5년)에 지었다. 양팽손은 ‘사상적인 벗’ 조광조가 개혁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약을 받고 죽자, 그의 시신을 거둔 장본인이다. 양인용은 그런 의리와 기개, 선비의 도를 추구했던 증조부 양팽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왕대밭에서 왕대난다’는 말은 그와 같은 예에서 연유한 말일 것이다.
무도하고 무모한 시절이었다. 역사서에 따르면 광해군은 권좌에 오른 후,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키고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킨다. 의를 추구하고 상식을 좇던 양인용은 저간의 부당함에 대해 충간(忠諫)했다. 그러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 양인용은 더 이상 관직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벼슬을 버리고 홀연히 낙향을 감행하는 것만이 시류에 섞이지 않는 유일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낙향 후 그는 이곳에 송석정을 세웠다. 소나무와 대나무의 푸른 빛을 벗 삼아 시문을 지었다. 유연자약한 여생을 그렇게 자연의 벗들과 학문의 벗들과 담소하며 보냈다.
누정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골기와 건물이다. 인절미 모양의 수많은 돌들이 축대를 이루고 있다. 그 위에 지어진 누정은 단촐하면서도 우아하다. 가운데 재실이 있고, 주위로 마루가 깔려 있다. 소유자는 제주양씨학포공파송석정종회다.
수려한 암벽과 솔숲에 지어진 연유로 이곳에는 시인묵객들 출입이 잦았다. 원래는 150여 개의 시액이 걸려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30여 개의 시액이 보존돼 있다. 특히 송석정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활달하면서도 고아한 서체는 주변의 산하와 어울려 고아한 정취를 발한다.
정내는 물론 의병장이자 조선 중기 학자였던 안방준의 시액은 물론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의 주역인 송홍의 시액도 걸려 있다. 이밖에 양인용의 원운시에 차운한 문인들로는 송병선, 조희일, 김창흡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음은 양인용의 ‘원운시’다. 정내를 둘러보며 가만가만 뜻을 헤아려본다.
사내가 때를 만나지 못하여
도를 지키며 숲에 누워 있네
궁함과 검약함은 마음먹은 일이며
헛된 공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네
소나무를 매만지며 월곡 땅을 쳐다보니
많은 돌들이 용두에 쌓였구나
깊은 충정을 어느 누구와 누구와 더불어 말하리
또 얼마나 많은 나그네는 예에서 머무를까
작은 소리로 풍경시문을 읊조리다 저편의 지석강변을 바라본다. 장마에 부푼 강물이 여전히 푸르다. 시원한 바람 한줄기 이마를 훑고 지난다. 풍경은 여전하지만 옛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천천히 걸으며 이곳 주인장의 마음을 떠올려본다. 미음완보(微吟緩步)하며 오늘의 세상과 세태를 생각해본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마가 물러간 자리에 폭염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객(客)의 모습으로 들어 앉았다. 올 여름도 불볕은 그 존재를 여실히 증명하겠다는 태세다. 곧 입추인데 폭염의 맹위는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려면 어떠랴. 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은 것이다. 물과 나무, 숲이 그리운 계절이다. 마실이라도 나서려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찾기 일쑤다. 물가에 그림자가 들이치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삼삼히 어른거린다. 찰랑이는 물살에 귓가를 씻고, 불어오는 솔바람에 이런저런 생각을 털어내고 싶은 것이다.
요사스러운 소음이 남실대는 세상이다. 소음과 소문, 거짓과 거짓이 뒤섞여 진실의 경계는 흐릿해진지 오래다. 편을 갈라 벌이는 말의 쟁투 또한 끝이 없다. 민초들 삶은 점점 팍팍해져가고,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은 그저 허공을 향해 한숨만을 몰아쉴 뿐이다.
  |
조선의 선비 고산 윤선도는 오우가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그는 물과 돌,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달을 벗이라 칭하였다. 고산은 당대 사대부들의 여기였던 한시(漢詩)보다 홀대받던 시조를 즐겨 창작한 문인이었다. 지적인 감성과 감칠맛 나는 우리말을 버무린 그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좋아한다.
송석정을 둘러보며 이름에 담긴 뜻을 가만히 생각해본다. 주인장은 변하지 않는 절개, 시류에 타협하지 않는 독야청청의 삶을 견지했을 것이다.
이곳 누정은 학포 양팽손의 증손인 양인용이 1613년(광해군 5년)에 지었다. 양팽손은 ‘사상적인 벗’ 조광조가 개혁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약을 받고 죽자, 그의 시신을 거둔 장본인이다. 양인용은 그런 의리와 기개, 선비의 도를 추구했던 증조부 양팽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왕대밭에서 왕대난다’는 말은 그와 같은 예에서 연유한 말일 것이다.
무도하고 무모한 시절이었다. 역사서에 따르면 광해군은 권좌에 오른 후,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키고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킨다. 의를 추구하고 상식을 좇던 양인용은 저간의 부당함에 대해 충간(忠諫)했다. 그러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 양인용은 더 이상 관직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벼슬을 버리고 홀연히 낙향을 감행하는 것만이 시류에 섞이지 않는 유일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낙향 후 그는 이곳에 송석정을 세웠다. 소나무와 대나무의 푸른 빛을 벗 삼아 시문을 지었다. 유연자약한 여생을 그렇게 자연의 벗들과 학문의 벗들과 담소하며 보냈다.
  |
| 송석정 앞을 흐르는 지석강의 풍광. |
수려한 암벽과 솔숲에 지어진 연유로 이곳에는 시인묵객들 출입이 잦았다. 원래는 150여 개의 시액이 걸려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30여 개의 시액이 보존돼 있다. 특히 송석정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활달하면서도 고아한 서체는 주변의 산하와 어울려 고아한 정취를 발한다.
정내는 물론 의병장이자 조선 중기 학자였던 안방준의 시액은 물론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의 주역인 송홍의 시액도 걸려 있다. 이밖에 양인용의 원운시에 차운한 문인들로는 송병선, 조희일, 김창흡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음은 양인용의 ‘원운시’다. 정내를 둘러보며 가만가만 뜻을 헤아려본다.
사내가 때를 만나지 못하여
도를 지키며 숲에 누워 있네
궁함과 검약함은 마음먹은 일이며
헛된 공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네
소나무를 매만지며 월곡 땅을 쳐다보니
많은 돌들이 용두에 쌓였구나
깊은 충정을 어느 누구와 누구와 더불어 말하리
또 얼마나 많은 나그네는 예에서 머무를까
작은 소리로 풍경시문을 읊조리다 저편의 지석강변을 바라본다. 장마에 부푼 강물이 여전히 푸르다. 시원한 바람 한줄기 이마를 훑고 지난다. 풍경은 여전하지만 옛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천천히 걸으며 이곳 주인장의 마음을 떠올려본다. 미음완보(微吟緩步)하며 오늘의 세상과 세태를 생각해본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