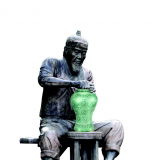[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강진, 정약용 선생의 정원과 동백나무
2021년 12월 22일(수) 23:00 가가
지난여름 경기도 남양주시청이 보낸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메일에는 함께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시청 직원분들은 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의 고향이 남양주라며 선생이 자연을 바라보며 쓴 시 ‘다산화사 20수’에 등장하는 식물을 그려 달라고 했다. 정약용 선생의 고향이 내가 사는 지역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가 식물을 특별히 좋아했으며, 식물에 관한 시까지 썼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였다. 평소 실학자로서의 선생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다산화사’ 속 식물을 그리게 되었다.
시청 직원분들이 내게 건넨 종이에는 한자와 한글로 풀이된 시 전문이 적혀 있었다. 그림을 그리기 전 내가 할 일은 한자의 식물이 정확히 어떤 종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이미 풀이된 자료들이 있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 부르는 식물명이 같을지라도 실제 식물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옛 식물명에 관한 문헌을 뒤져 시에 나오는 20종의 식물명을 알아냈다. 동백나무와 차나무, 치자나무와 매실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천남성….
식물을 다 찾고 나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였다. 정약용 선생의 거처는 이 근처인데, 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식물은 남부 지방에 분포하는 난대수종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다산화사는 정약용 선생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쓴 시였다. 내가 사는 중부 지방에서는 온실에서나 이 식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시에 등장하는 식물들의 자생지인 강진으로 향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고 그중 10여 년을 만덕산 기슭, 지금의 다산초당에서 지냈다. 다산초당에 도착해 선생의 집 앞에 서니 그가 그토록 소중히 가꾸었을 원림이 한눈에 들어왔다. 시를 읊으며 상상만 했던 식물들, 동백나무와 차나무 그리고 대나무도 보였다. 정약용 선생과 나의 시대 간극이 느껴지는 듯 나무는 울창하고도 높게 자랐다.
선생은 다산화사 여섯 번째 연작에서 ‘산다 잎이 겹쳐 푸르른 숲을 이룬다’라고 썼다. ‘산다’(山茶)는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에서 부르던 동백나무의 옛 이름이다. 특히 이곳의 동백나무는 개체수가 많은 데다 도시에서 볼 법한 수고(樹高)가 아니었다. 전국의 동백나무 50% 이상이 전라도에 분포한다고 하는 만큼 어찌나 제멋대로 잘 자랐는지 잎 또한 유독 색이 짙고 두꺼웠다. 이 정도의 잎 두께라면 건조한 겨울 동안에도 푸르른 숲을 이룰 것이다. 또 얼마나 붉고 탐스러운 꽃이 필까?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생이 붓을 들어 동백나무를 본 사유를 시로 기록했듯, 나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 나무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그가 꾸린 원림의 식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동백나무와 차나무가 양옆에 서있는 오솔길이 보이고,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백련사라는 절이 나온다. 백련사에는 더 큰 규모의 동백나무 군락이 있다. 나는 늦겨울이 되면 다시 이곳을 찾으리라 다짐했다. 이 정도 군락의 동백나무라면 겨우내 분명 매개동물인 동박새들이 찾아올 것이고, 붉은 동백과 연둣빛 동박새가 함께하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강진을 다녀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다산화사 속 20종의 식물 중 10종의 기록을 완성했다. 과거 누군가가 정약용 선생에게 언젠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될 텐데 무엇 하러 유배까지 와서 원림을 가꾸느냐 물었다고 한다. 그 말에 선생은 원래 인생이란 떠다니는 것이니 순간순간의 삶을 영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원림을 가꾸며 행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이다.
나 역시 작업 중 힘에 부칠 때면 종종 눈앞의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진에 다녀온 후 생각이 바뀌었다. 떠다니고 떠다니며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나와 내 앞의 식물의 만남은 더욱 우연하고도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지금 눈앞에 있는 식물을 더 충실히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식물 세밀화가>
선생은 다산화사 여섯 번째 연작에서 ‘산다 잎이 겹쳐 푸르른 숲을 이룬다’라고 썼다. ‘산다’(山茶)는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에서 부르던 동백나무의 옛 이름이다. 특히 이곳의 동백나무는 개체수가 많은 데다 도시에서 볼 법한 수고(樹高)가 아니었다. 전국의 동백나무 50% 이상이 전라도에 분포한다고 하는 만큼 어찌나 제멋대로 잘 자랐는지 잎 또한 유독 색이 짙고 두꺼웠다. 이 정도의 잎 두께라면 건조한 겨울 동안에도 푸르른 숲을 이룰 것이다. 또 얼마나 붉고 탐스러운 꽃이 필까?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생이 붓을 들어 동백나무를 본 사유를 시로 기록했듯, 나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 나무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그가 꾸린 원림의 식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동백나무와 차나무가 양옆에 서있는 오솔길이 보이고,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백련사라는 절이 나온다. 백련사에는 더 큰 규모의 동백나무 군락이 있다. 나는 늦겨울이 되면 다시 이곳을 찾으리라 다짐했다. 이 정도 군락의 동백나무라면 겨우내 분명 매개동물인 동박새들이 찾아올 것이고, 붉은 동백과 연둣빛 동박새가 함께하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강진을 다녀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다산화사 속 20종의 식물 중 10종의 기록을 완성했다. 과거 누군가가 정약용 선생에게 언젠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될 텐데 무엇 하러 유배까지 와서 원림을 가꾸느냐 물었다고 한다. 그 말에 선생은 원래 인생이란 떠다니는 것이니 순간순간의 삶을 영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원림을 가꾸며 행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이다.
나 역시 작업 중 힘에 부칠 때면 종종 눈앞의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진에 다녀온 후 생각이 바뀌었다. 떠다니고 떠다니며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나와 내 앞의 식물의 만남은 더욱 우연하고도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지금 눈앞에 있는 식물을 더 충실히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식물 세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