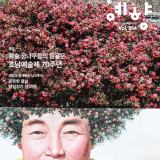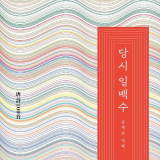정치의 사법화 -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2025년 03월 24일(월) 00:00 가가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본래 정치에서 다뤄야할 사안이 사법부에 넘겨져 판단·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 과정, 권력구조, 사회적 가치관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치와 거리를 두기 위해 ‘공공정책의 사법판단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법학자들은 ‘비공식적이고 비사법적으로 해결되던 문제들이 법적이거나 준사법적인 규칙, 절차에 종속되는 현상’, ‘사법적 결정 과정이 정치적 영역에 주입되는 현상’, ‘사법심사를 통해 공공정책 입안이 결정되는 현상’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한다.
대표적인 정치의 사법화 사례는 2004년 헌법재판소(헌재)가 심리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특별법) 이었다. 헌재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10월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법인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없이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 수도이전을 해야한다는 취지였다. 야당의 심판 청구로 내려진 결정이어서 헌재가 본의 아니게 정치적 캐스팅 보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비쳐졌다.
해외 학계에서는 헌법재판 기관과 정치권력 기관이 제도화된 대화를 통해 타당한 헌법해석을 내려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헌법 재판제도의 실익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른바 ‘헌법적 대화’(constitutional dialogue) 이론이다. 정파·정략적 판단에 따라 헌재의 심리 절차를 문제삼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우리 현실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최근 사법부에 무더기로 정치현안을 떠넘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실종을 의미한다. 정치권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사례다. 결국 사법부에 판단을 맡긴 사안 자체가 정치현안이기 때문에 결과물도 정치 논란과 파장을 부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다.
/penfoot@kwangju.co.kr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