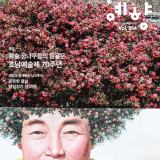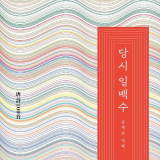호남 누정-광주 <14> 칠송정
2023년 10월 22일(일) 20:40 가가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의 청고한 절개 오롯이…
광곡마을 백우산 아래 위치…중수 거쳐 정자로
고봉 기대승 장남 기효증 1650년대 건립
정면 3칸·측면 2칸 팔작지붕…건물 4면 머름 설치
임진왜란 때 의병·의곡 모아 의병 활동
선조 “천리 길 멀다 않고 나라 위한 충의 가상”
인근에 기대승 배향된 월봉서원 ‘눈길’
광곡마을 백우산 아래 위치…중수 거쳐 정자로
고봉 기대승 장남 기효증 1650년대 건립
정면 3칸·측면 2칸 팔작지붕…건물 4면 머름 설치
임진왜란 때 의병·의곡 모아 의병 활동
선조 “천리 길 멀다 않고 나라 위한 충의 가상”
인근에 기대승 배향된 월봉서원 ‘눈길’
하루가 다르게 해가 짧아지고 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진다. 땅거미 지는 시간이면 쓸쓸함이 밀려온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꾸 먼 곳을 보게 된다. 늦가을의 정취려니 싶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까닭 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한다. 별 수 없다. 시간의 흐름 앞에 허허로워지는 건 나이를 먹어간다는 증거다.
내일이면 상강(霜降),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다. 이슬이 엉겨 서리가 내리면 늦가을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노랗던 들판도 어느새 추수가 끝나 휑하니 비어간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제법 한기가 묻어난다. 산야의 색들도 하루하루 다르게 붉어지고 파랗던 하늘은 깊어만 간다.
밖으로 나가기에 좋은 날이다. 머릿속에 들어찬 세상의 일들을 잠시 비워두고 산야로 발걸음을 옮긴다. 지친 몸과 마음을 푸른 곳에 의탁하고 싶은 것이다. 진풍경이 아니더라도 회색의 도심을 떠나 자연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푸근해진다.
오늘 찾아가는 누정은 이름만큼이나 유서가 깊은 곳이다. 칠송정(七松亭).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광곡(廣谷)마을에 있는 정자다. 칠송정이라는 이름도 하나의 시어인데 광곡이라는 마을도 그에 못지않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넓은 골짜기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풍류가 깃든 이름을 지어 일상에서 통용했다. 사람들은 ‘너브실’이라고도 부른다. ‘광곡’보다 훨씬 정감이 가고 ‘귄’이 있는 지명이다. 그곳에 가면 막혀 있던 무엇이 ‘툭’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칠송정을 모르는 이들도 한번쯤 그 마을에 가봤을 것이다. 누정이 자리한 ‘너브실’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서원이 있다. 칠송정에서 월봉서원이 지척이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칠송정과 월봉서원이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맞다. 고봉(高峯) 기대승(1527-1572)의 장남이 바로 함재(涵齋) 기효증(1550~1616)이다. 칠송정은 고봉의 장남 기효증의 올곧은 정신을 담고 있는 정자다. ‘함재’(涵齋)라는 호가 예사롭지 않다. 부친 기대승이 임종 시에 아들에게 내린 훈계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온다. ‘넣고 들이며 가라앉히고 쌓아두라’는 의미다.
기효증은 부친의 뜻을 받들어 그 말을 삶의 지표로 삼았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현감에 이르렀지만 부친이 별세하자 광곡마을 백우산 아래에 정자를 짓고 시묘살이를 3년 했다. 그 시묘살이했던 곳이 지금의 칠송정이다.
정자의 건립 연대는 문헌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추정하건대 초건(初建)은 임란 이후인 1650년대로 본다. 물론 몇 차례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하지만 정자의 명칭에는 깊은 뜻과 충의가 담겨 있다.
임진왜란 당시 기효증은 의곡과 의병을 모았다. 그의 의병활동에 선조는 탄복했다. ‘천리 길을 멀다 않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충의가 가상하다’라며 그를 칭송했다. 훗날 함재에게 군기사검정(軍器寺僉正)을 제수했지만 완곡히 사양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칠송정을 지어 선친의 학통을 계승했다.
칠송정이라는 명칭은 사계절 변함없는 푸르름을 견지하는 소나무의 청고한 절개를 함의한다. 누정을 짓고 소나무의 절개를 투영한 함재 선생의 기상과 깊은 뜻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정자는 원래 구들이 놓인 움막 형태였다고 하지만, 지금의 정자는 당초 위치에서 중수하면서 이거했다고 한다.
가을볕이 들이치는 누정은 적요 속에 들어앉아 있다. 백우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일까. 잘 정비된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운다. 누정을 에두른 나뭇가지 사이로 햇볕이 들이쳐 반짝인다. 이제 나무들은 시나브로 단풍물이 들어갈 것이다.
일곱 그루의 소나무를 찾으려했지만 흔적이 없다. 주위를 에두른 고목만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뿐이다. 혹여 소나무가 있었으면 싶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는 애국가의 노랫말처럼 우리에게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그뿐인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샛바람에 떨지 마라”고 노래했던 안치환의 ‘솔아 푸르른 솔아’는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를 기약하는 희망을 소나무의 절의에 빗대었다.
정내에는 구한말 유학자 거유(巨儒) 윤용구의 현판이 있다. 도한 1905년 기동준이 쓴 ‘칠송정 중건기’, ‘호산승처필명정’이 걸려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8세손 기봉국이 쓴 ‘칠송정운’이라는 시문이다.
산의 풍광 좋은 곳에 정자를 들이니
아득한 넓은 산과 말은 물이 병풍처럼 둘렀구나.
땅이 열려 동산의 숲은 푸르고 아름다워
자연이 펼친 산수의 정취가 신선의 영기 가득하다.
뛰어난 자연 풍광 즐길 만 하고 인지의 덕을 겸하였네.
깊어지는 흥취로 취하고 깨기를 마음 가는대로 하여
높이 치솟은 나무 사람이 유독 사랑하는데
옛적에 닦은 유적이 여전히 씩씩하구나.
(기봉국의 ‘칠송정운’ 전문)
정자를 에둘러 보며 기봉국의 시문을 잠시 되뇌어 본다. ‘뛰어난 자연 풍광 즐길 만 하고 인지의 덕을 겸하였네’라는 표현에서 함재의 학덕과 됨됨이가 그려진다.
칠송정의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형태다. 건물 네 면에 머름을 설치했으며 머루는 우물마루로 돼 있다. 건물은 외벌대 기단 위에 주초를 쌓았고, 위로 원주 기둥을 세웠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조일형 박사는 “칠송정 인근에는 기대승을 모신 월봉서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봄과 가을 춘추제향을 하고 있다”며 “칠송정과 월봉서원의 역사적, 학술적 관계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향후 기대승과 기효증을 토대로 스토리 외에도 문화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봉서원에 들러 찬찬히 정내를 보고 나니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다. 주위를 에워싼 나무들이 “쏴”하고 소곤거리듯 속삭인다. 이곳에 오기 위해 황룡강을 따라왔던 시간이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조선의 어느 한때로 역류하듯 돌아갔다 귀환한 것만 같다. 어느 한켠에 조선의 선비가 있을 것도 같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일이면 상강(霜降),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다. 이슬이 엉겨 서리가 내리면 늦가을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노랗던 들판도 어느새 추수가 끝나 휑하니 비어간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제법 한기가 묻어난다. 산야의 색들도 하루하루 다르게 붉어지고 파랗던 하늘은 깊어만 간다.
  |
오늘 찾아가는 누정은 이름만큼이나 유서가 깊은 곳이다. 칠송정(七松亭).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광곡(廣谷)마을에 있는 정자다. 칠송정이라는 이름도 하나의 시어인데 광곡이라는 마을도 그에 못지않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넓은 골짜기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풍류가 깃든 이름을 지어 일상에서 통용했다. 사람들은 ‘너브실’이라고도 부른다. ‘광곡’보다 훨씬 정감이 가고 ‘귄’이 있는 지명이다. 그곳에 가면 막혀 있던 무엇이 ‘툭’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
| 기효증의 부친 고봉 기대승이 배향된 월봉서원. |
정자의 건립 연대는 문헌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추정하건대 초건(初建)은 임란 이후인 1650년대로 본다. 물론 몇 차례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하지만 정자의 명칭에는 깊은 뜻과 충의가 담겨 있다.
임진왜란 당시 기효증은 의곡과 의병을 모았다. 그의 의병활동에 선조는 탄복했다. ‘천리 길을 멀다 않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충의가 가상하다’라며 그를 칭송했다. 훗날 함재에게 군기사검정(軍器寺僉正)을 제수했지만 완곡히 사양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칠송정을 지어 선친의 학통을 계승했다.
칠송정이라는 명칭은 사계절 변함없는 푸르름을 견지하는 소나무의 청고한 절개를 함의한다. 누정을 짓고 소나무의 절개를 투영한 함재 선생의 기상과 깊은 뜻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정자는 원래 구들이 놓인 움막 형태였다고 하지만, 지금의 정자는 당초 위치에서 중수하면서 이거했다고 한다.
가을볕이 들이치는 누정은 적요 속에 들어앉아 있다. 백우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일까. 잘 정비된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운다. 누정을 에두른 나뭇가지 사이로 햇볕이 들이쳐 반짝인다. 이제 나무들은 시나브로 단풍물이 들어갈 것이다.
일곱 그루의 소나무를 찾으려했지만 흔적이 없다. 주위를 에두른 고목만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뿐이다. 혹여 소나무가 있었으면 싶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는 애국가의 노랫말처럼 우리에게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그뿐인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샛바람에 떨지 마라”고 노래했던 안치환의 ‘솔아 푸르른 솔아’는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를 기약하는 희망을 소나무의 절의에 빗대었다.
  |
| 8대손 기봉국의 시가 새겨진 현판. |
산의 풍광 좋은 곳에 정자를 들이니
아득한 넓은 산과 말은 물이 병풍처럼 둘렀구나.
땅이 열려 동산의 숲은 푸르고 아름다워
자연이 펼친 산수의 정취가 신선의 영기 가득하다.
뛰어난 자연 풍광 즐길 만 하고 인지의 덕을 겸하였네.
깊어지는 흥취로 취하고 깨기를 마음 가는대로 하여
높이 치솟은 나무 사람이 유독 사랑하는데
옛적에 닦은 유적이 여전히 씩씩하구나.
(기봉국의 ‘칠송정운’ 전문)
정자를 에둘러 보며 기봉국의 시문을 잠시 되뇌어 본다. ‘뛰어난 자연 풍광 즐길 만 하고 인지의 덕을 겸하였네’라는 표현에서 함재의 학덕과 됨됨이가 그려진다.
칠송정의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형태다. 건물 네 면에 머름을 설치했으며 머루는 우물마루로 돼 있다. 건물은 외벌대 기단 위에 주초를 쌓았고, 위로 원주 기둥을 세웠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조일형 박사는 “칠송정 인근에는 기대승을 모신 월봉서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봄과 가을 춘추제향을 하고 있다”며 “칠송정과 월봉서원의 역사적, 학술적 관계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향후 기대승과 기효증을 토대로 스토리 외에도 문화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봉서원에 들러 찬찬히 정내를 보고 나니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다. 주위를 에워싼 나무들이 “쏴”하고 소곤거리듯 속삭인다. 이곳에 오기 위해 황룡강을 따라왔던 시간이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조선의 어느 한때로 역류하듯 돌아갔다 귀환한 것만 같다. 어느 한켠에 조선의 선비가 있을 것도 같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