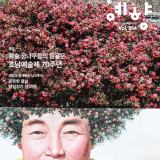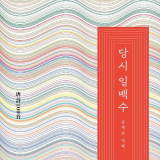주민 통행 막는 ‘사유지 도로’ 해결책은 -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23년 08월 21일(월) 06:00 가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통행하거나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던 도로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파헤치고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고 ‘사유지-통행금지’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모습을 가끔 본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도로부지 내 사유지와 관련한 공익과 사익 간 다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토지가격의 상승 때문이다.
도로를 막는 원인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본인의 사유지를 시급히 매입해 주기를 원하거나 보상가격이 지목상 ‘도로’는 주변 토지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다. 또 사유지인 ‘도로’를 의도적으로 매입 또는 경매 받아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사줄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통행금지에 대해 주민들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한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2022)’에 따르면 전체 도로 면적 중 ‘사실상 도로’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27.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15.9%), 울산(12.2%), 인천(11.7%), 광주(9.7%), 서울(9.3%), 부산(9.0%) 순이다. 광주의 ‘사실상 도로’ 면적은 387만4000㎡(117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도로’와 관련한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9~2020년 사이 2년 동안 광주의 소송사례는 광주시 승소 2건, 패소 3건, 화해권고 22건, 기타 21건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에는 20건이 진행 중이었다. 총 사례 수로는 광주가 44건으로 서울, 부산 다음으로 특·광역시 중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도로’는 ‘관습상 도로’라고도 하지만, 보통 ‘현황도로’라고 한다. ‘사실상 도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 법정도로로 사유지(국공유지도 일부 있다)이며 지목이 ‘도로’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가 훨씬 많다.
불특정 다수가 언제부터인가 타인의 땅을 길로 삼아 밟고 다니다 보니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것이 바로 ‘사실상 도로’의 전형이다. 이 경우 주민 민원은 통행권 보장이 우선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노후화, 파손, 침하, 침수, 비포장 등 차도 및 보도 관리 요청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보수하면 도로를 점용 및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소유자와 소송 시 부당이득금 등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 관리·정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도로 이용에 대한 불편은 이용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와 같이 ‘사실상의 도로’를 둘러싸고 빈발하는 민원은 건축 인허가를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도 발생한다. 건축허가에서 건축물이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부터 있었다. 1976년 건축법 개정에서는 4m 이상 도로이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사용 동의를 얻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지정된 도로가 1994년 이전까지 통일된 양식으로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사실상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이용 현황, 소유 주체, 법적 근거, 지목, 면적 등에 관한 지자체의 현황 파악이 기본이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상황에 맞게 보다 정교한 대응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과거 건축허가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서 ‘사실상 도로’의 개설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 근거를 찾는다. 그러한 도로는 사용자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상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공로로 만든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로를 개설하거나, 대체도로를 신설하거나, 적정 이용료를 지급하는 재원을 마련한다. 일신·전남방직 부지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에서 마련된 ‘공공기여금’을 ‘사실상 도로’ 개선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2022)’에 따르면 전체 도로 면적 중 ‘사실상 도로’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27.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15.9%), 울산(12.2%), 인천(11.7%), 광주(9.7%), 서울(9.3%), 부산(9.0%) 순이다. 광주의 ‘사실상 도로’ 면적은 387만4000㎡(117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특정 다수가 언제부터인가 타인의 땅을 길로 삼아 밟고 다니다 보니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것이 바로 ‘사실상 도로’의 전형이다. 이 경우 주민 민원은 통행권 보장이 우선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노후화, 파손, 침하, 침수, 비포장 등 차도 및 보도 관리 요청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보수하면 도로를 점용 및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소유자와 소송 시 부당이득금 등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 관리·정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도로 이용에 대한 불편은 이용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와 같이 ‘사실상의 도로’를 둘러싸고 빈발하는 민원은 건축 인허가를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도 발생한다. 건축허가에서 건축물이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부터 있었다. 1976년 건축법 개정에서는 4m 이상 도로이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사용 동의를 얻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지정된 도로가 1994년 이전까지 통일된 양식으로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사실상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이용 현황, 소유 주체, 법적 근거, 지목, 면적 등에 관한 지자체의 현황 파악이 기본이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상황에 맞게 보다 정교한 대응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과거 건축허가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서 ‘사실상 도로’의 개설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 근거를 찾는다. 그러한 도로는 사용자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상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공로로 만든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로를 개설하거나, 대체도로를 신설하거나, 적정 이용료를 지급하는 재원을 마련한다. 일신·전남방직 부지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에서 마련된 ‘공공기여금’을 ‘사실상 도로’ 개선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