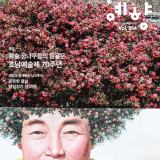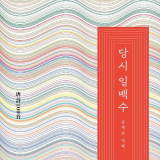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전라도 1000년 인물열전] <26>진도-남종 문인화 대가 소치허련
2018년 08월 15일(수) 00:00 가가
독창적 남종화 정립 “압록강 동쪽 이만한 작품 없다”
진도(珍島)는 문자 그대로 보배로운 섬이다. 토지가 비옥해 예로부터 옥주(沃州)라고 일컬어졌다. 또한 예술의 고향, 예향(藝鄕)이라 불린다. 남종문인화(남종화)의 거목인 진도 출신 소치(小痴) 허련(1808~1892)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구한말 운미 민영익은 “운림산방에 사는 소치는 묵신(墨神)이다”라고 평했다. ‘호남화단의 종조(宗祖)’ 소치 허련의 삶과 작품세계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진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빠짐없이 들리는 곳이 운림산방(雲林山房)이다. 첨찰산(해발 485.2m)이 병풍처럼 산방을 두르고 있어 누구나 첫눈에 끌리는 선경(仙景)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자연풍광뿐만 아니라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운림산방은 소치 선생이 말년에 기거했던 화실의 당호(堂號)입니다. 소치 선생과 미산, 남농, 임인, 임전 등 양천 허씨가문의 화맥(畵脈)이 200여년 동안 5대를 이어져 왔다는게 대단한거죠.”
배정희 진도군 관광해설사의 설명이다. ‘남종화의 성지’로 불리는 운림산방은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비끼내 마을) 6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981년 10월에 전남도기념물 제51호, 2011년 8월에 명승 제80호로 지정됐다.
소치 허련은 1808년 진도읍 쌍정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이름은 유(維)라 했으나 뒷날 련(鍊)으로 개명했다. 김상엽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은 지난 2008년 발행된 ‘진도가 낳은 소치 허련 탄생 200주년’ 기념 작품집에 실린 논문에서 “양천허씨 세보 등에 의거하면 그의 초명은 련만(鍊萬)이었다.…허련은 초명 ‘련만’을 사용하다가 김정희에게 지도받은 후 일정기간 ‘유’라는 이름을 썼고, 대략 1850년을 전후한 시기 이후에는 ‘련’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작은 어리석음’이라는 의미의 소치라는 호는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중국 원나라 대화가인 대치(大痴) 황공망(1269~1354)과 비교해 내려주었다.
소치는 어릴 적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다. 숙부에게서 ‘오륜행실도’를 추천받아 여름철 3개월에 걸쳐 그리기도 했다. 그러나 주위에 찾아가 그림을 배울 스승이 없었다. 28살때인 1835년에야 초의선사의 도움으로 해남 연동에 있는 공재 윤두서의 고택을 찾아 ‘공재화첩’을 빌려 모사를 하면서 그림을 익힐 수 있었다.
이듬해 봄에 초의선사가 한양으로 올라가 추사 김정희에게 허련의 습작 그림을 보였다. 이에 추사는 허련의 재주를 칭찬하면서 서울로 올라오도록 했다. 허련은 추사의 집(월성위궁)에서 머물며 본격적으로 글과 그림을 배우게 된다.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인연으로 허련은 그림에 개안(開眼)을 하게 된다. 소치는 추사 문하에서 시(詩)·서(書)·화(畵)를 체계적으로 익히면서 잠재된 재능을 마음껏 꽃 피울 수 있었다. 조선 초·중기 주류를 이룬 북종화는 직업화가들의 기교적인 산수화인 반면 조선 후기 유입된 남종화는 선비들의 여기(餘技)로 수묵과 담채(淡彩)를 사용했다.
추사는 제주도 귀양시절에 신헌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자 허련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화법(畵法)은 종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루한 기습을 떨어 버렸으니, 압록강 동쪽에는 이만한 작품이 없을 것입니다.”
소치는 열악한 배편에도 스승 추사가 유배중인 제주도 대정을 3차례(1841년, 1843년, 1847년)나 찾아갔다. 그의 봇짐속에는 초의 선사가 보내는 녹차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소치는 42살때인 1849년 궁궐에 불려가 헌종 앞에서 먹을 갈아 산수와 모란 그림을 그렸다. 또 왕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서화를 보며 품평을 하기도 했다. 이때 어명을 받아 그린 모란 그림이 뛰어나 ‘허모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됐다. 왕은 그에게 ‘시법입문’(詩法入門) 책을 하사했다.
고향을 오랫동안 떠나있던 소치가 진도에 운림산방을 마련한 때는 1856년(49세)이다. 이후에도 한양과 전주, 남원 등지를 오가며 당대 명사들과 교류하고 그림을 그렸다. 아들 고종이 친정(親政)을 하자 물러나 운현궁에 머물고 있던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만나기도 했다. 이하응은 난초 그림을 잘 그렸다. 석파(이하응)가 소치에게 말했다.
“소치가 이승에서 나(이하응)를 알지 못하면 소치가 못되지요.”
소치는 산수화를 비롯해 매화도, 사군자, 괴석목단(怪石牧丹)과 같은 많은 그림과 글씨를 남겼다. 글씨는 추사체를 닮았다. 특히 붓과 같은 도구를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그리는 ‘지두화’(指頭畵)를 잘 그렸다. 그의 화론(畵論)은 운림산방 대련으로 쓴 ‘그림의 법칙은 장강 만리의 유장함이 담겨야 하고(畵法有長江萬里)/ 글씨의 기세는 노송가지의 굳건함과 같아야 한다(書勢如孤松一枝)’라는 문구에 압축돼 있다.
운림산방에 들어서면 연못이 시원스레 한눈에 들어온다. 잔잔한 수면에 산방과 주변 숲이 거울처럼 반영된다. 연못 중앙에 자리한 동그란 섬에 배롱나무 한 그루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조선시대 전통정원을 꾸밀 때 연못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연못 중앙에 나무를 심으면 ‘곤할 곤’(困)자가 되기 때문이죠. 후손들이 곤하게 살지 않도록 깊은 뜻을 가지고 다섯 개 각으로 이뤄졌습니다.”(배정희 진도군 관광해설사)
연못에는 비단 잉어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다. 산방 입구 왼편에 있는 바위는 소치가 그림을 그렸다는 조양암(朝陽巖)이다. 산방과 살림채 주변에는 매화나무와 홍도화, 파초 등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심어져 있다. 산방 옆 쌍계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목 매실나무는 초의선사가 준 묘목을 소치가 심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다.
소치는 제자를 기를 때 그림에 앞서 글을 가르쳤다. 그래서 연꽃 그림 여백에 쓰인 화제(畵題)는 한편의 시다.
“무정과 유한을 어느 누가 알까?(無情有限何人見)/ 달밝은 새벽 산뜻한 바람에 떨어지려 한다(月曉風淸欲墮時).”
진도군은 지난 2008년 11월 소치 허련 선생 탄생 20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고 작품집을 펴냈다. 소치는 1893년 9월 6일 세상을 떠났다. 60세와 72세때에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몽연록’과 ‘속연록’(나중에 ‘소치실록’, ‘소치실기’로 고침)을 남겼다. 묘소는 진도군 고군면 염경산에 있다. 소치는 남종화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그의 작품세계는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들과 제자들에 의해 맥을 이으며 호남 회화의 커다란 물줄기를 형성했다. 국학자 위당 정인보 선생은 ‘허소치갈’(許小癡碣)에서 소치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소치의 특기는 산수와 바위와 골짜기의 담백하고 그윽하고 아스라하고 윤탁한 경지에 있다. 붓이 몇 번만 스쳐도 드높고 메마른 데에 신취(神趣)가 스며있으니 화훼화는 그의 장점이 아닌 것이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운림산방은 소치 선생이 말년에 기거했던 화실의 당호(堂號)입니다. 소치 선생과 미산, 남농, 임인, 임전 등 양천 허씨가문의 화맥(畵脈)이 200여년 동안 5대를 이어져 왔다는게 대단한거죠.”
배정희 진도군 관광해설사의 설명이다. ‘남종화의 성지’로 불리는 운림산방은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비끼내 마을) 6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981년 10월에 전남도기념물 제51호, 2011년 8월에 명승 제80호로 지정됐다.
이듬해 봄에 초의선사가 한양으로 올라가 추사 김정희에게 허련의 습작 그림을 보였다. 이에 추사는 허련의 재주를 칭찬하면서 서울로 올라오도록 했다. 허련은 추사의 집(월성위궁)에서 머물며 본격적으로 글과 그림을 배우게 된다.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인연으로 허련은 그림에 개안(開眼)을 하게 된다. 소치는 추사 문하에서 시(詩)·서(書)·화(畵)를 체계적으로 익히면서 잠재된 재능을 마음껏 꽃 피울 수 있었다. 조선 초·중기 주류를 이룬 북종화는 직업화가들의 기교적인 산수화인 반면 조선 후기 유입된 남종화는 선비들의 여기(餘技)로 수묵과 담채(淡彩)를 사용했다.
추사는 제주도 귀양시절에 신헌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자 허련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화법(畵法)은 종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루한 기습을 떨어 버렸으니, 압록강 동쪽에는 이만한 작품이 없을 것입니다.”
소치는 열악한 배편에도 스승 추사가 유배중인 제주도 대정을 3차례(1841년, 1843년, 1847년)나 찾아갔다. 그의 봇짐속에는 초의 선사가 보내는 녹차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소치는 42살때인 1849년 궁궐에 불려가 헌종 앞에서 먹을 갈아 산수와 모란 그림을 그렸다. 또 왕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서화를 보며 품평을 하기도 했다. 이때 어명을 받아 그린 모란 그림이 뛰어나 ‘허모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됐다. 왕은 그에게 ‘시법입문’(詩法入門) 책을 하사했다.
고향을 오랫동안 떠나있던 소치가 진도에 운림산방을 마련한 때는 1856년(49세)이다. 이후에도 한양과 전주, 남원 등지를 오가며 당대 명사들과 교류하고 그림을 그렸다. 아들 고종이 친정(親政)을 하자 물러나 운현궁에 머물고 있던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만나기도 했다. 이하응은 난초 그림을 잘 그렸다. 석파(이하응)가 소치에게 말했다.
“소치가 이승에서 나(이하응)를 알지 못하면 소치가 못되지요.”
소치는 산수화를 비롯해 매화도, 사군자, 괴석목단(怪石牧丹)과 같은 많은 그림과 글씨를 남겼다. 글씨는 추사체를 닮았다. 특히 붓과 같은 도구를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그리는 ‘지두화’(指頭畵)를 잘 그렸다. 그의 화론(畵論)은 운림산방 대련으로 쓴 ‘그림의 법칙은 장강 만리의 유장함이 담겨야 하고(畵法有長江萬里)/ 글씨의 기세는 노송가지의 굳건함과 같아야 한다(書勢如孤松一枝)’라는 문구에 압축돼 있다.
운림산방에 들어서면 연못이 시원스레 한눈에 들어온다. 잔잔한 수면에 산방과 주변 숲이 거울처럼 반영된다. 연못 중앙에 자리한 동그란 섬에 배롱나무 한 그루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조선시대 전통정원을 꾸밀 때 연못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연못 중앙에 나무를 심으면 ‘곤할 곤’(困)자가 되기 때문이죠. 후손들이 곤하게 살지 않도록 깊은 뜻을 가지고 다섯 개 각으로 이뤄졌습니다.”(배정희 진도군 관광해설사)
연못에는 비단 잉어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다. 산방 입구 왼편에 있는 바위는 소치가 그림을 그렸다는 조양암(朝陽巖)이다. 산방과 살림채 주변에는 매화나무와 홍도화, 파초 등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심어져 있다. 산방 옆 쌍계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목 매실나무는 초의선사가 준 묘목을 소치가 심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다.
소치는 제자를 기를 때 그림에 앞서 글을 가르쳤다. 그래서 연꽃 그림 여백에 쓰인 화제(畵題)는 한편의 시다.
“무정과 유한을 어느 누가 알까?(無情有限何人見)/ 달밝은 새벽 산뜻한 바람에 떨어지려 한다(月曉風淸欲墮時).”
진도군은 지난 2008년 11월 소치 허련 선생 탄생 20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고 작품집을 펴냈다. 소치는 1893년 9월 6일 세상을 떠났다. 60세와 72세때에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몽연록’과 ‘속연록’(나중에 ‘소치실록’, ‘소치실기’로 고침)을 남겼다. 묘소는 진도군 고군면 염경산에 있다. 소치는 남종화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그의 작품세계는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들과 제자들에 의해 맥을 이으며 호남 회화의 커다란 물줄기를 형성했다. 국학자 위당 정인보 선생은 ‘허소치갈’(許小癡碣)에서 소치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소치의 특기는 산수와 바위와 골짜기의 담백하고 그윽하고 아스라하고 윤탁한 경지에 있다. 붓이 몇 번만 스쳐도 드높고 메마른 데에 신취(神趣)가 스며있으니 화훼화는 그의 장점이 아닌 것이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