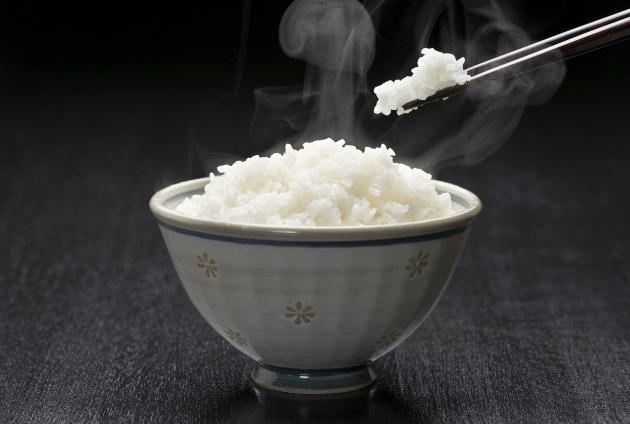맛없는 쌀 더는 대접 못 받는다
2025년 08월 24일(일) 19:40 가가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품종 개량보다 ‘수확 후 관리’ 수준 높여 고품질화해야
품종 개량보다 ‘수확 후 관리’ 수준 높여 고품질화해야
살다 보면 주위 사람이 나랑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다. 이때 “그 사람 참 밥맛이야”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왜 이런 상황을 “밥맛없다”나 “밥맛이야”라고 할까. 내가 아는 한 밥맛은 좋은 것이고, 그런 표현에 우리 주식인 쌀이 사용되는 것은 당사자 쌀의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이 은유적인 표현은 “재수없다”나 “꼴 보기 싫다” 등과도 연결된다. 이는 “밥맛 떨어진다”라는 말에서 “밥맛 없게 한다-밥맛 없다”로 변형되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가미된 것이다.
다른 관점도 있다. 배고픈 시절 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먹을거리 정도로 취급되다 보니 그 가치가 하락해 좋은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나온 말이라는 견해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쌀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우선 맛없는 쌀이 없을 정도이니, 밥맛 없다는 이 표현부터 바꿔야 할 상황이다. 이젠 단순히 값싼 열량 공급원이 아닌, 풍부한 맛과 향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급 식재료로 위상이 재정립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쌀 산업의 미래는 ‘고품질화’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품질 쌀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내려져 있진 않지만 대체로 ‘밥맛’이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따르면 밥맛을 평가하는 요소는 ▲아밀로스 함량 ▲단백질 함량 ▲젤화 온도 ▲쌀 외관 ▲밥의 향과 보존성 등이다.
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푸석거리고 적을수록 찰기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밥맛이 좋게 평가되는 함량은 16∼18%로 알려졌다. 단백질도 함량이 높으면 밥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탄력과 점성이 떨어지는데 6.0∼6.5%가 좋은 밥맛이 느껴지는 구간이다.
전분이 익는 온도를 뜻하는 젤화 온도는 71∼74℃가 적당하다. 너무 낮으면 쌀이 쉽게 퍼지고, 높으면 설익은 식감을 유발해서다. 쌀 외관의 경우 심복백미(쌀알의 중심이나 외곽이 백색을 띠는 것) 비율이 높으면 밥이 퍼석해지고, 동할미(금이 간 쌀)·싸라기(깨진 쌀) 비율이 높으면 죽밥이 될 수 있어 완전립 비율이 높아야 한다. 여기에 고소하고 담백한 향이 나며, 식어도 쉽게 굳지 않는 밥이 되면 밥맛 좋은 쌀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절대적일 순 없다. 사람의 입맛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밥맛은 주관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쌀 품종은 모두 품질이 보장되고 맛도 좋은 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더해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하고 고품질 품종 중심의 생산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다. 올해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질소비료의 적정 시비로 쌀 단백질 함량을 낮추면 생산량이 조절돼 안정적인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려면 품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고품질 쌀 논의가 품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품종보다 소비자에게 쌀이 어떤 상태로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저장과 도정·유통 등 각 단계에서 쌀 품질을 유지하는 ‘수확 후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밥맛의 성패는 최근 소비자와 전문가들이 인증한 고품질 쌀 ‘알찬미’와 ‘참드림’, ‘일품’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bigkim@kwangju.co.kr
다른 관점도 있다. 배고픈 시절 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먹을거리 정도로 취급되다 보니 그 가치가 하락해 좋은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나온 말이라는 견해다.
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푸석거리고 적을수록 찰기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밥맛이 좋게 평가되는 함량은 16∼18%로 알려졌다. 단백질도 함량이 높으면 밥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탄력과 점성이 떨어지는데 6.0∼6.5%가 좋은 밥맛이 느껴지는 구간이다.
전분이 익는 온도를 뜻하는 젤화 온도는 71∼74℃가 적당하다. 너무 낮으면 쌀이 쉽게 퍼지고, 높으면 설익은 식감을 유발해서다. 쌀 외관의 경우 심복백미(쌀알의 중심이나 외곽이 백색을 띠는 것) 비율이 높으면 밥이 퍼석해지고, 동할미(금이 간 쌀)·싸라기(깨진 쌀) 비율이 높으면 죽밥이 될 수 있어 완전립 비율이 높아야 한다. 여기에 고소하고 담백한 향이 나며, 식어도 쉽게 굳지 않는 밥이 되면 밥맛 좋은 쌀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절대적일 순 없다. 사람의 입맛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밥맛은 주관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쌀 품종은 모두 품질이 보장되고 맛도 좋은 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더해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하고 고품질 품종 중심의 생산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다. 올해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질소비료의 적정 시비로 쌀 단백질 함량을 낮추면 생산량이 조절돼 안정적인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려면 품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고품질 쌀 논의가 품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품종보다 소비자에게 쌀이 어떤 상태로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저장과 도정·유통 등 각 단계에서 쌀 품질을 유지하는 ‘수확 후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밥맛의 성패는 최근 소비자와 전문가들이 인증한 고품질 쌀 ‘알찬미’와 ‘참드림’, ‘일품’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