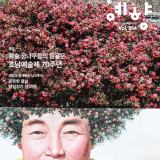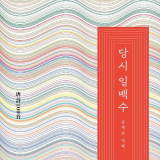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1982년 국제보청기] 세상에 귀 열어 주고 문화에 눈 뜨게 하다
2016년 07월 06일(수) 00:00 가가
경상도 부부 무작정 광주행 김기창 화백 권유로 시작한 언어치료실, 국제보청기 모태
소록도·‘도가니’ 피해자 등에 보청기 무료제공 등 나눔 활동 광주장애인재활협회장 취임
소록도·‘도가니’ 피해자 등에 보청기 무료제공 등 나눔 활동 광주장애인재활협회장 취임
“노동 없는 부를 갖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이 오십이 넘어서면서 조금씩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가 인터뷰 때 들려준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앞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전체를 갤러리로 꾸밀 거라는 말을 듣고 “아니, 공간을 임대해 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요.” 웃으며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광주 남동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보청기 건물은 붉은 벽돌이 인상적이다. 국제보청기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보청기 매장이다. 경북 영덕 출신인 신종인(65)대표가 아무 인연도 없는 광주에 온 게 1982년이니 34년 넘는 세월이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우둘투둘 점자가 박혀 있었다. 보청기 무료 지원 등 청각 장애인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해온 신대표는 지난 6월 (사)광주장애인재활협회 8대 회장에 취임했다.
국제보청기의 모태는 전남청각언어치료실이다.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친구의 주선으로 운보 김기창 화백을 만난 게 출발이었다. 7살 때 장티푸스로 청각을 잃은 운보는 한국농아인협회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에는 장애인 재활, 복지가 거의 없었는데 김 화백이 언어치료실을 해보라며 허가를 내주셨어요. 또 전남농아복지회 후원회장을 맡아 달라는 부탁도 하셨죠. 이 때 농아, 청각 장애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당시 난청을 치료하는 교육이 있었지만 많이 벅찬 상태였어요.”
지금도 1층 매장에는 김기창 화백 그림 두 점이 수호신처럼 그를 지키고 있다. 또 1982년 당시 사용했던 언어발성훈련기, 청력 검사 기기, 청각 언어 검사기기 등 국제보청기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도 놓여 있다.
대학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한 그는 1t 트럭에 짐을 싣고 아내와 함께 7시간 걸려 광주로 왔다. 서른살 때였다.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때라 초창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서울 종로점을 비롯해 순천, 목포, 장흥 지점을 운영중이다. 2000년 들어서면서 광주에도 보청기 매장이 많이 늘었고 지금은 40여개 정도가 영업중이다.
처음 매장 문을 연 곳은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리인 이연 안과 맞은 편이었다. 임대해 들어간 건물에 국제 펜팔사, 국제약국 등이 있어 자연스레 상호는 국제보청기가 됐다. 1988년 즈음에는 광주 충장로 5가 제일반점 옆에 세기 보청기를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자리로 옮겨 온 건 지난 2005년이다.
“당시에는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죠. 눈이 나쁘면 안경 쓰듯이 귀가 나쁘면 보청기를 쓰는 건데 말이죠. 007 서류 가방을 들고 영업을 나가면 병원에서 원장님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홍보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무등극장, 광주극장 등 영화 상영전에 자막 광고를 했어요. 초창기엔 5·18 직후라 경상도 출신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을 때여서 택시를 탈 때면 행선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고는 했습니다(웃음) ”
서울에서 열리는 외국 보청기 시연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일본, 독일 등 보청기 제조 회사에 연수를 가기도 했다. 보청기 기술은 일취월장했다. 초창기에는 일본 제품 등도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독일, 미국, 덴마크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삼성 등 국내 기업도 보청기 시장에 진출했지만 금방 접고 말았다.
예나 지금이나 보청기 가격 대는 천차만별이지만 초창기에는 평균 10만원대 보청기를 많이 사용했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요즘 제품은 160∼180만원대가 많이 팔린다. 난청인들은 보장구 지원금을 받는다.
기억에 남는 이들도 많다. 언어치료실을 운영할 때 주 이용자는 2∼11살까지의 어린이들이었다. 그 때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이 장성해 시집, 장가 간다고 찾아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고객은 고(故)김대중 대통령이다. 지금도 이희호 여사의 보청기를 관리중이다.
“아는 분의 소개로 동교동 서재에서 김전대통령을 만났는데 한 주먹 분량의 보청기를 내놓으셨어요. 외국 나가셔서 좋은 걸 구입하고 그러셨나봐요. 보청기 ‘업자’인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왜 광주까지 왔냐, 살아보니 어쩌냐 물으셨어요. 참 따뜻하신 분이셨죠. 보청기도 틀니 하듯이 귀본을 뜨는 과정부터 시작해 음 이해도 측정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청각 장애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고 그들을 위해 조금씩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소록도 나환자들에게 보청기를 끼워주고 ‘도가니’ 피해 학생들에게 보청기를 제공했다. 또 중국조선족장애인 한국후원회를 설립, 회장을 맡기도 했다.
신 대표는 그림을 좋아해 작품을 한두 점 구입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유화 300여점을 비롯해 1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박진, 박석규, 김봉진, 박진희 등 장애인 작가의 작품을 많이 구입했다.
현재 자리로 이사를 오고 나서는 지하 1층을 갤러리로 꾸미고 ‘문화 갤러리’라는 이름 붙였다. 방문객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작품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지난 5월에는 2층도 정식 갤러리로 만들었다. 개관 기념전으로 박유자 작가 개인전을 진행했고 현재는 소장품을 전시중이다. 조만간 3층과 옥상을 겸한 4층도 갤러리로 꾸밀 예정이다.
특히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현재 매장으로 쓰고 있는 1층까지도 모두 갤러리로 꾸며 건물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매장은 전남대병원 인근 건물에 임대해 들어간다.
“듣는 게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시각적인 걸 보여주자는 생각에 갤러리를 꾸미게 됐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문화를 접하고 더 나은 삶, 새로운 삶을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역 신진 작가를 비롯해 장애인 작가들을 위해 갤러리 공간을 내줄 생각이예요. 문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 전문 컬렉터가 아니예요. 특별히 대단하거나 고가 작품은 없어요. 그저 손님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풍경이나 꽃 등 밝은 분위기 작품을 주로 전시합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작가 작품을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 대표는 “청각 장애인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참 많은 이야기를 한다”며 “눈빛만 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순수한 자비심을 갖고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신 대표는 30여년 전 운보 선생이 해 준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그가 인터뷰 때 들려준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앞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전체를 갤러리로 꾸밀 거라는 말을 듣고 “아니, 공간을 임대해 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요.” 웃으며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광주 남동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보청기 건물은 붉은 벽돌이 인상적이다. 국제보청기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보청기 매장이다. 경북 영덕 출신인 신종인(65)대표가 아무 인연도 없는 광주에 온 게 1982년이니 34년 넘는 세월이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우둘투둘 점자가 박혀 있었다. 보청기 무료 지원 등 청각 장애인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해온 신대표는 지난 6월 (사)광주장애인재활협회 8대 회장에 취임했다.
“당시에는 장애인 재활, 복지가 거의 없었는데 김 화백이 언어치료실을 해보라며 허가를 내주셨어요. 또 전남농아복지회 후원회장을 맡아 달라는 부탁도 하셨죠. 이 때 농아, 청각 장애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당시 난청을 치료하는 교육이 있었지만 많이 벅찬 상태였어요.”
처음 매장 문을 연 곳은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리인 이연 안과 맞은 편이었다. 임대해 들어간 건물에 국제 펜팔사, 국제약국 등이 있어 자연스레 상호는 국제보청기가 됐다. 1988년 즈음에는 광주 충장로 5가 제일반점 옆에 세기 보청기를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자리로 옮겨 온 건 지난 2005년이다.
“당시에는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죠. 눈이 나쁘면 안경 쓰듯이 귀가 나쁘면 보청기를 쓰는 건데 말이죠. 007 서류 가방을 들고 영업을 나가면 병원에서 원장님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홍보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무등극장, 광주극장 등 영화 상영전에 자막 광고를 했어요. 초창기엔 5·18 직후라 경상도 출신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을 때여서 택시를 탈 때면 행선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고는 했습니다(웃음) ”
서울에서 열리는 외국 보청기 시연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일본, 독일 등 보청기 제조 회사에 연수를 가기도 했다. 보청기 기술은 일취월장했다. 초창기에는 일본 제품 등도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독일, 미국, 덴마크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삼성 등 국내 기업도 보청기 시장에 진출했지만 금방 접고 말았다.
예나 지금이나 보청기 가격 대는 천차만별이지만 초창기에는 평균 10만원대 보청기를 많이 사용했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요즘 제품은 160∼180만원대가 많이 팔린다. 난청인들은 보장구 지원금을 받는다.
기억에 남는 이들도 많다. 언어치료실을 운영할 때 주 이용자는 2∼11살까지의 어린이들이었다. 그 때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이 장성해 시집, 장가 간다고 찾아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고객은 고(故)김대중 대통령이다. 지금도 이희호 여사의 보청기를 관리중이다.
“아는 분의 소개로 동교동 서재에서 김전대통령을 만났는데 한 주먹 분량의 보청기를 내놓으셨어요. 외국 나가셔서 좋은 걸 구입하고 그러셨나봐요. 보청기 ‘업자’인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왜 광주까지 왔냐, 살아보니 어쩌냐 물으셨어요. 참 따뜻하신 분이셨죠. 보청기도 틀니 하듯이 귀본을 뜨는 과정부터 시작해 음 이해도 측정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청각 장애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고 그들을 위해 조금씩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소록도 나환자들에게 보청기를 끼워주고 ‘도가니’ 피해 학생들에게 보청기를 제공했다. 또 중국조선족장애인 한국후원회를 설립, 회장을 맡기도 했다.
신 대표는 그림을 좋아해 작품을 한두 점 구입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유화 300여점을 비롯해 1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박진, 박석규, 김봉진, 박진희 등 장애인 작가의 작품을 많이 구입했다.
현재 자리로 이사를 오고 나서는 지하 1층을 갤러리로 꾸미고 ‘문화 갤러리’라는 이름 붙였다. 방문객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작품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지난 5월에는 2층도 정식 갤러리로 만들었다. 개관 기념전으로 박유자 작가 개인전을 진행했고 현재는 소장품을 전시중이다. 조만간 3층과 옥상을 겸한 4층도 갤러리로 꾸밀 예정이다.
특히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현재 매장으로 쓰고 있는 1층까지도 모두 갤러리로 꾸며 건물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매장은 전남대병원 인근 건물에 임대해 들어간다.
“듣는 게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시각적인 걸 보여주자는 생각에 갤러리를 꾸미게 됐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문화를 접하고 더 나은 삶, 새로운 삶을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역 신진 작가를 비롯해 장애인 작가들을 위해 갤러리 공간을 내줄 생각이예요. 문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 전문 컬렉터가 아니예요. 특별히 대단하거나 고가 작품은 없어요. 그저 손님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풍경이나 꽃 등 밝은 분위기 작품을 주로 전시합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작가 작품을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 대표는 “청각 장애인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참 많은 이야기를 한다”며 “눈빛만 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순수한 자비심을 갖고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신 대표는 30여년 전 운보 선생이 해 준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