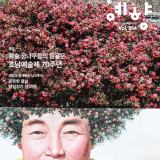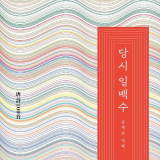옛집 그 마당 - 김향남 수필가
2023년 12월 10일(일) 23:00 가가
아참, 마당 있는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설거지를 하다말고 나도 모르게 푸념을 쏟는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오늘처럼 김장이라도 하는 날엔 주방 개수대가 유난히 좁게 느껴져서다. 물은 튀고, 큼지막한 양푼들은 주체하기도 어렵다. 마당이 있으면 할랑할랑 편하게 했을 일이다. 쪽창 너머로 하늘은 흐리고, 문득 숨어 있던 풍경 몇이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
늦가을, 아니 초겨울쯤 되겠다. 드문드문 눈발이 날리고 바람도 조금 불었던 것 같으니까. 엄마는 장꽝 옆 널찍한 마당에서 김장을 했다. 옆집 할머니도 오시고 종신이 엄마, 표수 엄마도 일손을 더했다.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와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다. 수북하던 배추는 어느새 발갛게 버무려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김장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긴 겨울이었다. 그럴 때면 마당도 할 일을 마친 듯 휴식에 들어갔다. 고추도 콩깍지도 없는 빈 마당은 우리들의 놀이터가 돼 주었다. 고무줄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땅따먹기도 했다.
마당은 잔치판도 되었다가 놀이판도 되었다가 장례식장도 되었다. 언니의 혼삿날, 청사초롱 내걸린 마당엔 높다란 지붕처럼 차일이 쳐졌다. 손님들은 왁자하고 잔칫상은 풍성하고 화려했다. 혼례상엔 수북하게 쌓아 올린 떡이며 과일이 놓여 있고, 푸른 솔가지와 대나무도 꽂혀 있고, 동백도 몇 송이 붉은 꽃을 피웠다. 이윽고 사모관대 갖춰 입은 신랑이 당도하고 방 안에 있던 신부도 마당으로 나왔다. 원색의 예복은 눈부시게 화사했다. 연지곤지 찍고 족두리를 쓴 언니는 먼 나라의 공주처럼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도 희미한데, 엊그제 마침 그때 찍은 사진을 보았다. 신랑신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사진이었다. 거기에는 색동저고리 입고 눈썹이 보일 듯 말 듯 앞머리를 반듯하게 자른 다섯 살짜리 소녀도 있었다. 아버지 품에 쏙 들어가 있던 고 조그만 계집애를 나는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설 지나고 보름이 되면 마을엔 한바탕 굿판이 벌어졌다. 종일토록 매구 치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마을회관 앞 당산나무 아래서부터 시작된 매구 행렬은 동네 우물을 거쳐, 술고래 장천양반네, 보바댁, 화순댁, 유정댁, 봉동댁을 거쳐 맨 꼭대기에 있는 우리집까지 올라왔다.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부엌이며 장독대, 뒤꼍을 돌아 다시 마당으로 나와서는 더욱 요란하게 매구를 쳐댔다. 그 사이 엄마는 전과 나물, 유과 등을 걸게 차려 술상을 내왔다. 사람들은 불콰하게 달아올라 무장무장 신이 났다. 매구 소리는 더 크고 더 높게 퍼져 아무리 요사한 잡신이라도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을 놓을 판이었다.
나는 ‘깨갱깨갱’ 수선스럽기만 한 저 소리가 어서 그치기만을 바랐다. 어른들의 그 요란한 놀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 지금은 아무리 들어도 물리지를 않는 것이다. 뭔가 가슴 저 밑바닥을 휩쓸고 올라와 어깨까지 들썩이곤 한단 말이지….
언제부턴지 마당엔 삐죽삐죽 풀들이 돋았다. 금세 마루 밑까지 치고 올 기세였다. 엄마는, 뭔 놈의 풀은 이렇게나 났쌌는고, 성가셔하시더니 댓돌 아래 두어 길만 남기고는 뭐든 심어 버렸다. 평생 징글징글 풀매기 바빴던 엄마는 앞마당을 홀랑 풀밭으로 내줄 수는 없었다. 못 말리는 울 엄마, 마당을 온통 가내농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도 샘가의 채송화는 오롯이 살아서 또록또록 맑은 꽃을 피우고 있더랬다. ‘알록달록 하도 이빼서, 느그들도 보여주고 자운(싶은)’, 엄마를 위한, 엄마의 꽃이었다.
오래전 겨울. 아, 그날 아침 풍경은 지금도 선하다. 겨울이 깊어도 오지 않던 눈이 그날 아침 소복히 쌓였다. 눈 위에 상여가 놓여 있었다. 빨강 노랑 하양 꽃들을 탐스럽게 매달고서 눈 쌓인 마당에 둥두렷이 놓였다. 세상에나, 나는 상여가 그렇게 어여쁜 줄 몰랐다. 멀리서만 봐도 공연히 무섭기만 했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하늘하늘 어찌나 곱고 화사한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뭉클, 가슴조차 두근거렸다.
“하아따, 날 좋네. 우리 아짐 가신다고 하늘도 아시능갑따.”
상여꾼들이 오고, 엄마는 그들의 어깨 위로 둥실 올라섰다. 그리고는, 요령소리를 따라 너울너울 동구 밖으로 향하셨다. 눈은 펄펄 나리고….
설거지를 하다말고 나도 모르게 푸념을 쏟는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오늘처럼 김장이라도 하는 날엔 주방 개수대가 유난히 좁게 느껴져서다. 물은 튀고, 큼지막한 양푼들은 주체하기도 어렵다. 마당이 있으면 할랑할랑 편하게 했을 일이다. 쪽창 너머로 하늘은 흐리고, 문득 숨어 있던 풍경 몇이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
마당은 잔치판도 되었다가 놀이판도 되었다가 장례식장도 되었다. 언니의 혼삿날, 청사초롱 내걸린 마당엔 높다란 지붕처럼 차일이 쳐졌다. 손님들은 왁자하고 잔칫상은 풍성하고 화려했다. 혼례상엔 수북하게 쌓아 올린 떡이며 과일이 놓여 있고, 푸른 솔가지와 대나무도 꽂혀 있고, 동백도 몇 송이 붉은 꽃을 피웠다. 이윽고 사모관대 갖춰 입은 신랑이 당도하고 방 안에 있던 신부도 마당으로 나왔다. 원색의 예복은 눈부시게 화사했다. 연지곤지 찍고 족두리를 쓴 언니는 먼 나라의 공주처럼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도 희미한데, 엊그제 마침 그때 찍은 사진을 보았다. 신랑신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사진이었다. 거기에는 색동저고리 입고 눈썹이 보일 듯 말 듯 앞머리를 반듯하게 자른 다섯 살짜리 소녀도 있었다. 아버지 품에 쏙 들어가 있던 고 조그만 계집애를 나는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턴지 마당엔 삐죽삐죽 풀들이 돋았다. 금세 마루 밑까지 치고 올 기세였다. 엄마는, 뭔 놈의 풀은 이렇게나 났쌌는고, 성가셔하시더니 댓돌 아래 두어 길만 남기고는 뭐든 심어 버렸다. 평생 징글징글 풀매기 바빴던 엄마는 앞마당을 홀랑 풀밭으로 내줄 수는 없었다. 못 말리는 울 엄마, 마당을 온통 가내농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도 샘가의 채송화는 오롯이 살아서 또록또록 맑은 꽃을 피우고 있더랬다. ‘알록달록 하도 이빼서, 느그들도 보여주고 자운(싶은)’, 엄마를 위한, 엄마의 꽃이었다.
오래전 겨울. 아, 그날 아침 풍경은 지금도 선하다. 겨울이 깊어도 오지 않던 눈이 그날 아침 소복히 쌓였다. 눈 위에 상여가 놓여 있었다. 빨강 노랑 하양 꽃들을 탐스럽게 매달고서 눈 쌓인 마당에 둥두렷이 놓였다. 세상에나, 나는 상여가 그렇게 어여쁜 줄 몰랐다. 멀리서만 봐도 공연히 무섭기만 했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하늘하늘 어찌나 곱고 화사한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뭉클, 가슴조차 두근거렸다.
“하아따, 날 좋네. 우리 아짐 가신다고 하늘도 아시능갑따.”
상여꾼들이 오고, 엄마는 그들의 어깨 위로 둥실 올라섰다. 그리고는, 요령소리를 따라 너울너울 동구 밖으로 향하셨다. 눈은 펄펄 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