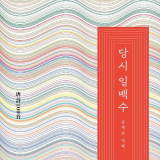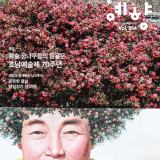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이원범 광주지방법원 판사]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위험성
2016년 11월 07일(월) 00:00 가가
2018년부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사전 범죄 예방 시스템을 시범 운행한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이하 피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범죄 징후를 파악해 이를 사전 차단하는 예측 시스템이 개발되어 2018년부터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탐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가 현실이 되어 범죄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며 환영하는 듯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부착자는 위치만이 국가에 노출될 뿐 자신의 행위가 국가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치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그것이 주거 이전이나 출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례에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등 부착을 통한 범죄 예방 시스템은 국가가 피부착자의 위치를 감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맥박, 체온, 호흡 등 생리적 변화와 과거 범죄수법과 행동패턴 등의 분석을 통하여 우범자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부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데, 더 나아가 특정 상황에서는 위치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 하에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피부착자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오류를 통해 나타난 국가의 예방활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즉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예방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범죄예방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부착자는 위치만이 국가에 노출될 뿐 자신의 행위가 국가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치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그것이 주거 이전이나 출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례에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등 부착을 통한 범죄 예방 시스템은 국가가 피부착자의 위치를 감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맥박, 체온, 호흡 등 생리적 변화와 과거 범죄수법과 행동패턴 등의 분석을 통하여 우범자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범죄예방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