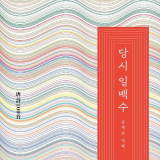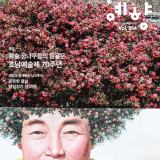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수필의 향기] 이름의 진화-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2023년 05월 22일(월) 00:00 가가
“방안에 켜져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던가.
저 촛불 나와 같아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세조 때 단종 복위를 추진하다 작형(灼刑)을 당하면서도 의연했던 ‘이개’의 단가이다. 그때 같이 죽은 사육신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다. 이름들이 좀 희귀하고 부르기 어색하다. 특히 ‘이개’는 어떻게 호명했을까.
이름만 불렀을까. 성명을 같이 불렀을까. 물론 성인이 되어선 백옥헌(白玉軒)이라는 호를 주로 썼겠지만, 유년 시절에는 성과 명을 같이 또는 따로 부르든, 지금 같으면 상당한 놀림감이 되고, 언어 폭력 소송까지 가고 남지 않았을까.
하지만 ‘ㅐ’는 조선 중기까지 이중 모음이었고 게다가 당시 개는 ‘가히’라고 했으니 우리 호기심은 여기까지다.
인디언 이름도 독특하다. 이들은 캔자스주를 ‘남쪽 바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듯이 주로 자연에서 이름을 취한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늑대와 춤을’은 남자 주인공에게, 그의 연인은 ‘주먹 쥐고 일어서’로 인디언들이 붙어준 이름이다. 너무 빨리 달리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이들 격언처럼 이름 속에도 자연과 공존하는 철학과 의식이 담겨 있다.
고대사에 나오는 을지문덕은 탁월하고 대단하신 분, 연개소문은 진달래꽃, 박혁거세는 밝은 세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니, 인디언 언어를 무척 닮았다.
이름은 이렇게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제 치하 작품을 읽다 보면 개똥 서운 말똥 능묘 칠푼이처럼 참 부르기 민망한 이름들이 많다. 각종 질병으로 아이들이 죽자, 액이 붙지 않도록 작명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이름에도 시대의 흉터처럼 남았다.
우리가 자란 마을은 대부분 씨족 공동체였다. 자작일촌이어서 이름만 봐도 항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른바 이름에 목화토금수라는 한자 부수를 넣는 방식으로 서열을 알 수 있게 했다. 현주, 봉주, 효주, 종오, 종진, 종기, 영수, 창수, 만수처럼, 유교 사회의 서열은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말의 엉덩이에 남은 낙인처럼 시대의 화인이 되었고, 고유 명사라기보다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열을 알기 위한 기호의 기능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50~60대 세대는 기존 이름에 대한 저항감과 새로운 이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 결과 한 세대 뒤 90년대는 정형화된 틀과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들의 바람이 작명에 그대로 나타난다. 한글 이름 짓기 바람이 휘몰아친 것이다. 한솔, 가람, 하늘, 다솜, 별…. 꼭 인디언들처럼 자연에서 따온 듯한 것과 고유어에서 따온 이름이 상당수였다.
그런데 이런 이름은 10여 년 뒤에는 양이 많지 않고, 어릴 때는 자연스럽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또 업그레이드된다. 한자어이지만 예스럽지 않고 한글과 잘 어울리는 세련된 이름들, 무엇보다 다정한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호명하기 쉬운 친근한 지금의 이름들이 대거 등장한다. 겸이, 무부, 찬휘, 진목, 가희 나희 다희, 은지 단비 금비. 가은 나은 다은. 남녀 구분이 없는 이름도 많아졌다. 가율, 서율, 경서 민서 세현 현진….
한때, 프로야구에서 개명 바람이 불기도 했다. 지금의 상황을 바꿔 보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작가들도 소설을 쓸 때 고심하는 것이 등장인물 작명이다. 싫증 나지 않으면서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이름 말이다. 성명학은 이름으로 인해 액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부르기 좋고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면 좋지 싶다.
이름은 실체를 대신하는 고유 명칭이다. 그런데도 분명 입신양명이나 호명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과연 30년 60년 뒤에는 어떤 유형의 이름이 또 유행할까.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던가.
저 촛불 나와 같아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세조 때 단종 복위를 추진하다 작형(灼刑)을 당하면서도 의연했던 ‘이개’의 단가이다. 그때 같이 죽은 사육신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다. 이름들이 좀 희귀하고 부르기 어색하다. 특히 ‘이개’는 어떻게 호명했을까.
하지만 ‘ㅐ’는 조선 중기까지 이중 모음이었고 게다가 당시 개는 ‘가히’라고 했으니 우리 호기심은 여기까지다.
인디언 이름도 독특하다. 이들은 캔자스주를 ‘남쪽 바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듯이 주로 자연에서 이름을 취한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늑대와 춤을’은 남자 주인공에게, 그의 연인은 ‘주먹 쥐고 일어서’로 인디언들이 붙어준 이름이다. 너무 빨리 달리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이들 격언처럼 이름 속에도 자연과 공존하는 철학과 의식이 담겨 있다.
이름은 이렇게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제 치하 작품을 읽다 보면 개똥 서운 말똥 능묘 칠푼이처럼 참 부르기 민망한 이름들이 많다. 각종 질병으로 아이들이 죽자, 액이 붙지 않도록 작명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이름에도 시대의 흉터처럼 남았다.
그래서 지금의 50~60대 세대는 기존 이름에 대한 저항감과 새로운 이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 결과 한 세대 뒤 90년대는 정형화된 틀과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들의 바람이 작명에 그대로 나타난다. 한글 이름 짓기 바람이 휘몰아친 것이다. 한솔, 가람, 하늘, 다솜, 별…. 꼭 인디언들처럼 자연에서 따온 듯한 것과 고유어에서 따온 이름이 상당수였다.
그런데 이런 이름은 10여 년 뒤에는 양이 많지 않고, 어릴 때는 자연스럽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또 업그레이드된다. 한자어이지만 예스럽지 않고 한글과 잘 어울리는 세련된 이름들, 무엇보다 다정한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호명하기 쉬운 친근한 지금의 이름들이 대거 등장한다. 겸이, 무부, 찬휘, 진목, 가희 나희 다희, 은지 단비 금비. 가은 나은 다은. 남녀 구분이 없는 이름도 많아졌다. 가율, 서율, 경서 민서 세현 현진….
한때, 프로야구에서 개명 바람이 불기도 했다. 지금의 상황을 바꿔 보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작가들도 소설을 쓸 때 고심하는 것이 등장인물 작명이다. 싫증 나지 않으면서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이름 말이다. 성명학은 이름으로 인해 액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부르기 좋고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면 좋지 싶다.
이름은 실체를 대신하는 고유 명칭이다. 그런데도 분명 입신양명이나 호명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과연 30년 60년 뒤에는 어떤 유형의 이름이 또 유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