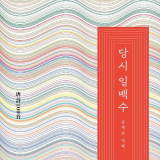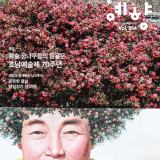해남 우수영과 법정 스님의 고향-박종섭 전 목포대학교 강사
2022년 09월 27일(화) 04:00 가가
법정 스님은 1932년 10월 8일 명량해협이 내려다보이는 한반도의 서남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 마을에서 박근배의 아들(박재철)로 태어났다.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세수 79세(법랍 56세)로 입적하기까지 맑고 향기로운 삶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고 떠난 우리 시대의 청빈한 스승이었다.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울돌목 벽파진에서 정유재란을 맞아 선조 30년(1597년 9월 16일) 판옥선 13척으로 진을 쳤다. 왜군이 서해를 통과 한양에 입성하려는 길목을 원천 봉쇄하고자 해남 어란진에서 출전한 왜선 133척에 대해 일자진 전술로 수군 선봉장 구루시마 미치후사를 울돌목의 좁은 해협(300m)으로 유인했다. 그 결과 왜선 31척을 침몰시키고 왜군 3100여 명(왜선 세키부네 승선 수군 100명 추산)을 수장시켰다. 역사적인 명량해전이다.
명량대첩의 빛나는 승리로 남원과 전주를 점령한 채 천안에서 명과 대치하면서 수군이 서해를 통과해 보급과 협공을 기대했던 왜군 육군의 계획은 철회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 철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곳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빠른 곳으로 ‘울면서 돌아가는 길목’이라는 뜻으로 울돌목이라고 불린다. 흐르는 물이 바닥의 암초와 충돌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마치 바다가 우는 것 같이 들린다.
우수영 마을은 서남해의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라우수영이 설치되었다. 현재도 수륙을 잇는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제주를 오가는 정기 항로가 운영되고 있다. 강강술래는 임란 당시 군사적 전술로 활용된 중요 무형문화재다.
아울러 해남군에서는 법정 스님의 생가를 찾는 탐방객이 늘자 부지를 조성해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법정(박재철)의 부친 박근배는 성품이 곧은 사람이었다. 당시 일본인 선주들의 조선인에 대한 착취와 횡포가 심하면 주재소나 면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그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항의문을 작성해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지를 발휘하곤 했다. 그러나 폐결핵에 걸려 점차 병색이 완연해지고 임종을 기다리는 위급함에 빠졌다. 조모 김금옥과 어머니 김인엽은 가장이 세상을 뜨면 네 식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당시 박재철은 숙부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진학하기에 이른다. 우수영초등학교 재학 시절 작문 시간에 글을 잘 써 선생님으로부터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칭찬을 받곤 했다. 그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할머니는 집에서 계란 꾸러미를 챙겨 보내는 것으로 화답했다.
재철은 글쓰기에 고무돼 밤이면 할머니에게 옛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졸랐고, 할머니는 소금 장수나 반딧불 이야기 등으로 훗날 손자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언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재철은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들으며 마을 앞에서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등대지기를 꿈꿨다. 목포상고에 진학해서도 그 결심은 여전하였다. 집안은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해야 생계가 가능할 정도로 궁핍했다. 어렵사리 숙부에게 육성회비를 부탁했지만 기일을 넘겨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지만 책을 보기 위해 학교 도서관만은 꾸준히 오갔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숙부의 권유에 따라 목포에 있는 전남대 상과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그는 동족 간 이념 대립과 한국전쟁으로 삶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된다. 책을 읽고 고민해도 현명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법정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연유다. 싸락눈이 내리는 겨울날, 그는 남의 집 일을 하고 잔기침으로 콜록거리는 죽창에 비친 초롱불의 어머니를 향해 절을 올렸다. “어머니, 언젠가는 돌아오리다. 이 방황이 끝나는 날 언젠가는 꼭 돌아오리다.” 그는 오대산 월정사로 가기 위해 밤 열차에 올라 출가의 길을 택했다.
해남 우수영은 그렇게 법정의 고향이자 이순신이 명량의 승리를 거머쥐었던 요충지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수영은 ‘내일’과 ‘승리’로 상징되는 해남의 브랜드이자 대표 장소인 것 같다.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울돌목 벽파진에서 정유재란을 맞아 선조 30년(1597년 9월 16일) 판옥선 13척으로 진을 쳤다. 왜군이 서해를 통과 한양에 입성하려는 길목을 원천 봉쇄하고자 해남 어란진에서 출전한 왜선 133척에 대해 일자진 전술로 수군 선봉장 구루시마 미치후사를 울돌목의 좁은 해협(300m)으로 유인했다. 그 결과 왜선 31척을 침몰시키고 왜군 3100여 명(왜선 세키부네 승선 수군 100명 추산)을 수장시켰다. 역사적인 명량해전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당시 박재철은 숙부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진학하기에 이른다. 우수영초등학교 재학 시절 작문 시간에 글을 잘 써 선생님으로부터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칭찬을 받곤 했다. 그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할머니는 집에서 계란 꾸러미를 챙겨 보내는 것으로 화답했다.
재철은 글쓰기에 고무돼 밤이면 할머니에게 옛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졸랐고, 할머니는 소금 장수나 반딧불 이야기 등으로 훗날 손자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언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재철은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들으며 마을 앞에서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등대지기를 꿈꿨다. 목포상고에 진학해서도 그 결심은 여전하였다. 집안은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해야 생계가 가능할 정도로 궁핍했다. 어렵사리 숙부에게 육성회비를 부탁했지만 기일을 넘겨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지만 책을 보기 위해 학교 도서관만은 꾸준히 오갔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숙부의 권유에 따라 목포에 있는 전남대 상과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그는 동족 간 이념 대립과 한국전쟁으로 삶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된다. 책을 읽고 고민해도 현명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법정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연유다. 싸락눈이 내리는 겨울날, 그는 남의 집 일을 하고 잔기침으로 콜록거리는 죽창에 비친 초롱불의 어머니를 향해 절을 올렸다. “어머니, 언젠가는 돌아오리다. 이 방황이 끝나는 날 언젠가는 꼭 돌아오리다.” 그는 오대산 월정사로 가기 위해 밤 열차에 올라 출가의 길을 택했다.
해남 우수영은 그렇게 법정의 고향이자 이순신이 명량의 승리를 거머쥐었던 요충지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수영은 ‘내일’과 ‘승리’로 상징되는 해남의 브랜드이자 대표 장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