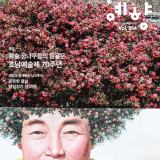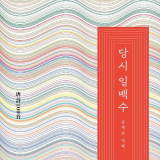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을 외치다-박정은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3년
2022년 09월 27일(화) 00:45 가가
국내 최대 고려인 집거지이자 역사 마을 1번지인 광주 광산구 고려인 마을(대표 신조야)은 한·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을 선보인다. ‘나는 고려인이다’는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 선조들의 피어린 삶과 광주에 정착한 후손들의 힘든 삶을 스토리텔링화 한 작품이다. 이 공연은 10월 2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한국교육원과 10월 6일 키르기즈스탄의 비쉬케크 국립드라마극장에서 진행된다. 호남대학교 미디어 영상공연학과 최영화 교수가 총연출을, 고용한 교수가 기술 감독을 맡았고,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참여한다.
고려인 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꼽히는 이 작품은 2017년에 호남대학교 미디어 영상공연학과, ‘고려인 마을극단 1937’,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무대에 올려졌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 그 안에 자리 잡은 고려인 마을과 그들의 역사를 담은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는 독창적인 아시아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본 공연을 제대로 즐기려면 먼저 고려인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고려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 그들은 왜 머나먼 땅으로 가야만 했는가? 먼저 고려인(高麗人)이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소련 붕괴 후의 구소련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의미하는 민족 명칭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강점기에 함경도 부근에 살던 조선인들은 새로운 농경지를 찾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러시아로 넘어갔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조선인들이 독립을 위해 무장봉기를 하거나 일본인 첩자로 활동한다는 정치적 모략과 소수 민족 탄압 정책으로 인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계속 탄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나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은 지금까지도 사과나 보상은 없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당시 피해 당사자들은 고령화로 타국에서 사망하였으며 3세대 이후의 젊은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아픈 과거’라며 언급을 꺼리게 되었다. 그 결과 고려인의 강제 이주 역사는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나는 이번 공연에 음향 오퍼레이터로 참가하게 됐다. 고려인들의 본토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설레고 기대가 되지만 사실 음향 오퍼레이터라는 막중한 역할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해서 굳어 버린 몸과 마음을 녹여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극 중에 나오는 노래들의 정겨운 멜로디,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가사, 그리고 각 잡힌 군무와 화려한 퍼포먼스들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더해져 긴장된 마음이 풀리고 기대와 희열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오는 3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국할 예정이다. 해외 공연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라 무척 기대되고 떨린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나에게 마냥 설레는 첫 해외 공연이 아닌,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다.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으로 가 그들 앞에서 공연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또 공연을 선보였을 때 그분들이 어떤 반응일지 기대되고 궁금하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인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공연을 통해 소통하며 그분들의 수고와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공연을 제대로 즐기려면 먼저 고려인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고려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 그들은 왜 머나먼 땅으로 가야만 했는가? 먼저 고려인(高麗人)이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소련 붕괴 후의 구소련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의미하는 민족 명칭이기도 하다.
나는 이번 공연에 음향 오퍼레이터로 참가하게 됐다. 고려인들의 본토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설레고 기대가 되지만 사실 음향 오퍼레이터라는 막중한 역할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해서 굳어 버린 몸과 마음을 녹여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극 중에 나오는 노래들의 정겨운 멜로디,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가사, 그리고 각 잡힌 군무와 화려한 퍼포먼스들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더해져 긴장된 마음이 풀리고 기대와 희열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오는 3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국할 예정이다. 해외 공연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라 무척 기대되고 떨린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나에게 마냥 설레는 첫 해외 공연이 아닌,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다.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으로 가 그들 앞에서 공연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또 공연을 선보였을 때 그분들이 어떤 반응일지 기대되고 궁금하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인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공연을 통해 소통하며 그분들의 수고와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