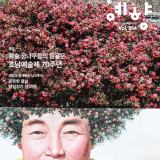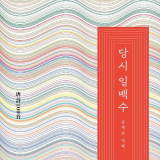세상을 바꾸는 분노-박영진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1년
2021년 10월 11일(월) 22:30 가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노’라는 키워드는 한병철 교수의 책 ‘피로 사회’를 읽고 진행한 독서 토론에서 영감을 얻은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빈번하게 불만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간다. 불만과 분노의 대상은 정부가 될 수 있고 교육 체제나 가정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삶 자체일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도출한, 분노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다.
먼저 우리는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이 의식적인 인식으로 바뀌는 계기를 통해 그 사건이나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관심을 통해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정립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약하거나 강한 내적 분노를 느끼게 된다. 사회 변화 역시 개인적인 분노 표출, 혹은 비슷한 내적 분노를 느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의 의식화가 단순히 내적 분노의 단계에서 끝난다면 이는 짜증에 불과할 뿐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가 중요한 핵심이다. 이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예로는 시민혁명, 민주화운동, 여성·아동 인권운동, 촛불시위, 투표, 청원 등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느껴온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무의식이 인식으로 바뀌는 순간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반면 분노에 따른 변화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신이 분노에 휩싸여 제삼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지 않은지, 분노의 방향성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의견이 진리인 양 그들을 따라서 무작정 분노하는 무지함을 경계해야 하며, 이견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도 조심해야 한다. 이는 근거 없는 혐오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체제에 무뎌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양도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기업·기관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비판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그들만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 화려한 술수로 언제든 분노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바꾸어 현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지근한 물 속에서 천천히 끓어오르는 물을 느끼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위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자극을 느끼는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변화라는 결과는 거창해 보일지 몰라도 그 시작은 개인의 문제의식과 관심으로부터다. 과도기라서 어쩔 수 없다거나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거나 하는 핑계는 잠시 접어 두길 바란다. 미래 세대의 현재를 빌려 쓰는 과거의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또한 분노는 연대할수록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 무모하고 무지한 연대는 화를 입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분노한다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고하며 분노해야 한다.
우리는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빈번하게 불만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간다. 불만과 분노의 대상은 정부가 될 수 있고 교육 체제나 가정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삶 자체일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는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이 의식적인 인식으로 바뀌는 계기를 통해 그 사건이나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관심을 통해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정립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약하거나 강한 내적 분노를 느끼게 된다. 사회 변화 역시 개인적인 분노 표출, 혹은 비슷한 내적 분노를 느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의 의식화가 단순히 내적 분노의 단계에서 끝난다면 이는 짜증에 불과할 뿐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가 중요한 핵심이다. 이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예로는 시민혁명, 민주화운동, 여성·아동 인권운동, 촛불시위, 투표, 청원 등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체제에 무뎌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양도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기업·기관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비판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그들만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 화려한 술수로 언제든 분노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바꾸어 현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지근한 물 속에서 천천히 끓어오르는 물을 느끼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위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자극을 느끼는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변화라는 결과는 거창해 보일지 몰라도 그 시작은 개인의 문제의식과 관심으로부터다. 과도기라서 어쩔 수 없다거나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거나 하는 핑계는 잠시 접어 두길 바란다. 미래 세대의 현재를 빌려 쓰는 과거의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또한 분노는 연대할수록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 무모하고 무지한 연대는 화를 입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분노한다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고하며 분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