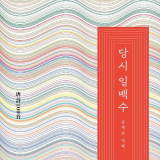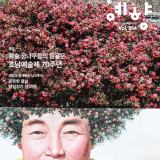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174> 백거이, 실천문학 선도한 中唐 대표 시인
2019년 03월 26일(화) 00:00 가가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자는 낙천으로 낙양 인근 신정 출신이다. 중당(中唐) 시기의 대표적 시인이다.
소년 시절 가세가 기울어 어려움을 겪었다.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가련한 어린 시절, 곤궁한 시절이었네” (可憐少壯日 適在貧賤時)라는 시구를 남겼다. 800년 진사에 급제했다. 교서랑을 거쳐 현위로 근무하며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목격하고 마음 아파했다. 처사 진홍과 교우하며 양귀비의 묘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유명한 장한가(長恨歌)를 썼다. 807년 한림학사 808년 좌습유로 승진했다. 간관(諫官)으로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위법이 있으면 직언”하는 공복의 자세를 보였다. 807년 번진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지해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최근 들어 각 도의 절도사가 조정의 명을 받기 무섭게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환관이 직접 군대를 통솔해서는 안된다는 상소도 올렸다.
재상 무원형이 절도사 이사도가 보낸 자객에게 입궐 중 피살되자 살해한 범인을 붙잡아 반드시 설욕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여러번 올렸다. 이로 인해 강주사마로 좌천되어 6년을 보냈다. 이때 비파행(琵琶行)을 지었다. 충주자사, 항주자사, 소주자사를 역임했다. 항주자사 시절 서호에 제방을 쌓아 관개와 저수 작업을 했다. 지금도 백거이 제방이 남아 있다. 828년 형부시랑으로 중앙에 복귀했다가 하남윤으로 낙양에 내려가 계속 살았다. 장안을 멀리해 당쟁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하는 선비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시와 술과 거문고를 삼우(三友)로 삼아 취음선생(醉吟先生)이라는 호에 걸맞게 유유자적의 삶을 영위했다. 말년에는 불교에 심취했는데 회창법난(會昌法難)으로 사찰이 폐지되고 승려들이 환속되는 것을 마음 아파했다. 846년 75세로 죽었다.
백거이는 이백이 죽은 지 10년, 두보가 죽은 지 2년 후 태어났다. 시인 한유와 더불어 이두한백(李杜韓白)으로 불리운다. 원진과 함께 원백(元白)으로, 유의석과 함께 유백(劉白)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시는 통속성과 사회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된다. ‘안사의 난’ 이후 문단은 시의 자연미와 소박함을 강조하였다. ‘늙은 부인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시를 짓는데 진력했다. 안사의 난과 번진의 반란으로 백성들의 삶이 곤궁해지고 중앙은 재정난에 빠졌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사회시다. 백거이가 선구적 역할을 했다. “문장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게 저작되어야 하며 세상사에 맞추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일찍이 “글재주가 이정도니 장안에서 사는 건 문제 없겠소”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글재주가 탁월했다.
장한가는 806년 주질현위로 재직 중 왕질부, 진홍과 같이 선유사에 놀러갔다가 지은 시다.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다룬 시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패륜적 만남과 사랑을 풍부한 감정으로 묘사해 깊은 회한과 슬픔을 느끼게 한다.
37세에 부인 양씨와 결혼했다. 친구 양여사의 사촌 누이로 평생 깊이 사랑했다. 중당 이후 최고의 실천 시인으로 평가된다. 원진 등과 함께 신악부(新樂府) 운동을 주도했다. “자고로 문학이란 임금과 신하, 백성, 만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유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학의 사회성, 실천성을 주창했다. 또 다른 걸작 비파행(琵琶行)은 816년 강주사마로 있을 때 쓴 것으로, 늙고 시든 장안의 기생이 장사꾼의 아낙네가 되니 강주로 내려오게 된 사연을 다뤘다. 829년 58세에 얻은 아들이 3년만에 죽었다. 죽마고우인 시인 원진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비명을 써주니 유족들이 사례금을 주었다. 사례금을 낙양의 향산사 보수비용으로 기증했다. 846년 죽으면서 시인 이상은이 묘비명을 쓰도록 하고 후한 사례금을 주었다고 한다. “이상은은 재능이 있으나 고집이 세서 살림이 가난하고 고달프니 사례금을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묘비명을 그가 쓰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임종을 맞이해서도 주변 사람을 챙기는 휴머니스트였다.
소년 시절 가세가 기울어 어려움을 겪었다.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가련한 어린 시절, 곤궁한 시절이었네” (可憐少壯日 適在貧賤時)라는 시구를 남겼다. 800년 진사에 급제했다. 교서랑을 거쳐 현위로 근무하며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목격하고 마음 아파했다. 처사 진홍과 교우하며 양귀비의 묘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유명한 장한가(長恨歌)를 썼다. 807년 한림학사 808년 좌습유로 승진했다. 간관(諫官)으로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위법이 있으면 직언”하는 공복의 자세를 보였다. 807년 번진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지해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최근 들어 각 도의 절도사가 조정의 명을 받기 무섭게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환관이 직접 군대를 통솔해서는 안된다는 상소도 올렸다.
37세에 부인 양씨와 결혼했다. 친구 양여사의 사촌 누이로 평생 깊이 사랑했다. 중당 이후 최고의 실천 시인으로 평가된다. 원진 등과 함께 신악부(新樂府) 운동을 주도했다. “자고로 문학이란 임금과 신하, 백성, 만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유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학의 사회성, 실천성을 주창했다. 또 다른 걸작 비파행(琵琶行)은 816년 강주사마로 있을 때 쓴 것으로, 늙고 시든 장안의 기생이 장사꾼의 아낙네가 되니 강주로 내려오게 된 사연을 다뤘다. 829년 58세에 얻은 아들이 3년만에 죽었다. 죽마고우인 시인 원진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비명을 써주니 유족들이 사례금을 주었다. 사례금을 낙양의 향산사 보수비용으로 기증했다. 846년 죽으면서 시인 이상은이 묘비명을 쓰도록 하고 후한 사례금을 주었다고 한다. “이상은은 재능이 있으나 고집이 세서 살림이 가난하고 고달프니 사례금을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묘비명을 그가 쓰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임종을 맞이해서도 주변 사람을 챙기는 휴머니스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