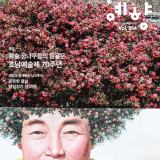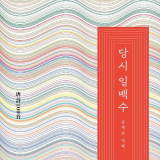온누리안 리포트-안정적 일터 없어 한 직장 1년 못 넘겨
2007년 03월 12일(월) 09:42 가가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금동의 ‘무지개 다문화 가족’사무실. 10여명의 조선족 출신 이주여성들이 모여앉아 ‘얘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저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 자녀 교육이나 한국생활에서의 고민 등을 먼저 털어놓으려는 마음에 때때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네 명의 ‘온누리안’은 유독 근심스런 얼굴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근 1년간 함께 근무하던 일자리를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했지만 지난달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나란히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중국 연길 출신의 박성화(35)씨는 “한국생활 10여년간 전단지 돌리기와 우유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했는데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이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였다”며 말끝을 흐렸다.
국제결혼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한 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는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생계나 생활비 충당을 위해 경쟁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도의 이주여성실태조사 결과 이주여성 가정의 총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132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이주여성의 취업률은 31.8%로, 내국인 여성의 취업률(51%)을 크게 밑돌면서 ‘저소득’과 ‘저취업’의 이중고를 실감케 했다. 실제 이주여성들은 취업이유로 가족생계유지(31.8%)를 비롯, 생활비 보충(26%), 자녀교육비 충당(22.6%) 등 한결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고 있다.
더구나 이주여성 취업자 가운데 80%가량이 농·어업이나 음식점,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누리안’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자녀양육부담(35.2%)과 낮은 임금(12.2%), 의사소통의 어려움(10.9%) 등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출신국 별로는 언어소통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선족 출신 여성들이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 25%가 종사하고 있을뿐 베트남의 경우 10명 중 8명이 남편과 함께 농·어업에 종사할 만큼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
물론 조선족의 경우도 취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음식점이나 공장 등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특유의 억양과 업주들의 선입견 등으로 인해 백화점이나 사무직 등에 대한 취업은 엄두조차 못내기 때문이다.
조선족 출신 최금녀(34)씨는 “식당일이나 이불판매 등 갖은 일을 해봤지만 남편의 반대나 업주의 선입견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백화점을 비롯한 일부 직종의 경우 ‘이력서’를 냄과 동시에 번번히 취업이 좌절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특히 필리핀 출신의 경우 상당수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는 공장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후 영어강사 활용 등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담양군과 무안군 등 일부 지자체가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이주여성을 취업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여성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출신의 비아트리스(37)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농촌진흥원의 시간제 영어강사, 방과후 교사 등을 통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는데 최근 그마저도 끊긴 상황”이라며 “무안군에서 주는 보조금 39만원으로 세 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갈 생각만 하면 그저 막막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도 이주여성의 취업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의 경우 취업 및 지원 프로그램이 소폭 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이 남편이나 가족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석창원 목사는 “최근 설문 결과 이주여성 가운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음식값을 줄이거나 굶은 사람이 13%에 달할 만큼 경제적 빈곤이 심각하다”며 “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한글교실을 비롯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하지만 이 가운데 네 명의 ‘온누리안’은 유독 근심스런 얼굴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근 1년간 함께 근무하던 일자리를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했지만 지난달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나란히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중국 연길 출신의 박성화(35)씨는 “한국생활 10여년간 전단지 돌리기와 우유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했는데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이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였다”며 말끝을 흐렸다.
국제결혼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정착한 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는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생계나 생활비 충당을 위해 경쟁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도의 이주여성실태조사 결과 이주여성 가정의 총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132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이주여성의 취업률은 31.8%로, 내국인 여성의 취업률(51%)을 크게 밑돌면서 ‘저소득’과 ‘저취업’의 이중고를 실감케 했다. 실제 이주여성들은 취업이유로 가족생계유지(31.8%)를 비롯, 생활비 보충(26%), 자녀교육비 충당(22.6%) 등 한결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고 있다.
더구나 이주여성 취업자 가운데 80%가량이 농·어업이나 음식점,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누리안’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자녀양육부담(35.2%)과 낮은 임금(12.2%), 의사소통의 어려움(10.9%) 등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출신국 별로는 언어소통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선족 출신 여성들이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 25%가 종사하고 있을뿐 베트남의 경우 10명 중 8명이 남편과 함께 농·어업에 종사할 만큼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
물론 조선족의 경우도 취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음식점이나 공장 등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특유의 억양과 업주들의 선입견 등으로 인해 백화점이나 사무직 등에 대한 취업은 엄두조차 못내기 때문이다.
조선족 출신 최금녀(34)씨는 “식당일이나 이불판매 등 갖은 일을 해봤지만 남편의 반대나 업주의 선입견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백화점을 비롯한 일부 직종의 경우 ‘이력서’를 냄과 동시에 번번히 취업이 좌절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특히 필리핀 출신의 경우 상당수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는 공장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후 영어강사 활용 등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담양군과 무안군 등 일부 지자체가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이주여성을 취업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여성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출신의 비아트리스(37)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농촌진흥원의 시간제 영어강사, 방과후 교사 등을 통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는데 최근 그마저도 끊긴 상황”이라며 “무안군에서 주는 보조금 39만원으로 세 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갈 생각만 하면 그저 막막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도 이주여성의 취업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의 경우 취업 및 지원 프로그램이 소폭 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이 남편이나 가족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석창원 목사는 “최근 설문 결과 이주여성 가운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음식값을 줄이거나 굶은 사람이 13%에 달할 만큼 경제적 빈곤이 심각하다”며 “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한글교실을 비롯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