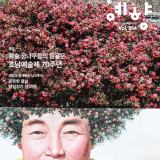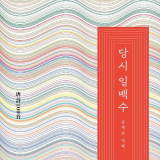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2> 남도-신양호
2017년 06월 22일(목) 00:00 가가
월출산 무위사 나무 위 파랑새는 어디 갔을까
강진 들러 해남 가는 길은 항상 그림이다. 어쩔 수 없이 멈춰, 쉬어가야만 하는 그림 같은 우리 남도의 으뜸길이다. 영암. 듬직한 월출산이 나를 멈추게 하고, 고개 넘어 휘돌아 강진길로 들어서면 월출산 뒷자락이 나를 설레게 한다. 이것은 유혹이다.
감히 지나칠 수 없는 풍경들. 보랏빛과 푸른빛이 섞여서 기묘한 색상을 만들어 내는 월출산은 웅장함과 기묘함이 조화스럽다. 그 거침없는 자신감 가득한 기세에 이끌려 계곡의 끝으로 들어가면, 거기 조용히 숨어있는 절이 있다.
강진길에는 무위사가 숨어 있다. 무위사의 극락보전은 정갈하고 단아하다. 툭 떨어진 맞배지붕이 그렇고, 양쪽 벽체의 기하학적인 구성, 그리고 그 색감은 황토의 자연스러움이 햇살에 반응한다. 시간에 따라 다른 색감을 보여준다. 자연의 흐름과 어울리도록 안배한 그 공간감이란…. 월출산 무위사를 들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공간감에 있다.
작가라면 무위를 알아야하는 이유에서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최소의 작위.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하는가? 자연스러움에 자연스럽지 않음을 두어야하는 그림쟁이의 일은, 어떻게 자연스러움에 닿는가 하는 문제에 항상 다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름의 상상력이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을 만들어 내지 않는가. 여기 극락보전의 백의수월관음 후불벽화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한다. 전설은 정말 순수하다.
한 고승이 후불벽화를 그리겠다고 나선다. 49일인지 100일인지 모르지만, 완성되기 전에 누군가 엿본다. 파랑새가 붓을 물어 그림을 그리더라. 인기척을 느낀 파랑새는 붓을 놓고 홀연히 사라져 버린다. 눈동자를 그리지 못한 채….
허망한 설화이지만, 무위의 순수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무위자연에 완성이 있겠는가.
이번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의 그림은, 십여년 전의 옛 시간에 맞춰 그렸다. 소박하지만 절제된 미를 갖췄던, 내 마음의 절. 이것저것 내 기억속에 들어선 것들로만 그려보았다. 주변 사물을 죄다 작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큰 나무 세 그루가 주제이다. 파랑새가 한참을 망설임으로 앉아 있었을 나무 아닐까?
무위사는 해거름이 참 좋다. 어쨌든 무위사를 버리듯 나온다. 아쉬움 남는 파랑새처럼….
강진읍 감칠맛나는 식당을 그냥 지나쳐야 하나? 영랑생가를 들러 모란 있는 장독대 구경을 해야 하나? 동백숲 백련사는 어떡하나? 다산초당은 또 어쩌지.
에라, 그냥 가자. 해지기 전에 녹우당을 가자. 커다란 은행나무 반기는 곳. 비자나무 숲 서늘한 곳. 빨리 가서 녹우, 그 푸른 빗소리를 들어 보자.
나는 가끔, 문화 관련사업을 하는 후배들과 술자리를 한다. 그 때마다 으레, 운업(芸業)이라는 녹우당의 편액을 내 놓는다. 우격다짐 나만의 썰을 펼치면, 슬슬 문화의 개념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운업 편액은 원교 이광사가 쓴 글이고, 동국진체의 결론이라는 등, 옥동 이서가 효시라는 동국진체의 편액이 녹우당이라는 등, 고산 선생이 여기 연동마을에 얼마나 살았을까. 백련지 때문에 연동마을이 되고, 비자나무를 심은 이유 등등. 아는 체를 주절주절 한 끝에 운업(芸業)의 뜻을 얘기한다.
“경작할 운, 잡초를 정리하고 숲과 밭을 무성하게 하라. 그 일이 네가 할 일이다. 이게 Curture잖아.”
날마다 꾸준히 스스로 할 일을 해라.
“문화는 꽃이 아니라 토양이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여 준다. 좋은 토양에 좋은 뿌리가 들고 튼튼하게 할 수 있어야 강한 줄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 600년을 이어온 윤씨 가문의 가보는 운업(芸業)이다. 우리 후세들에게 보낼 코드는 무얼까? 운업(芸業)이다. 좋은 생각을 하기에 어려운 시간은 없다.
월출산에서 무위를 보고, 녹우당에서 운업을 배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감히 지나칠 수 없는 풍경들. 보랏빛과 푸른빛이 섞여서 기묘한 색상을 만들어 내는 월출산은 웅장함과 기묘함이 조화스럽다. 그 거침없는 자신감 가득한 기세에 이끌려 계곡의 끝으로 들어가면, 거기 조용히 숨어있는 절이 있다.
작가라면 무위를 알아야하는 이유에서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최소의 작위.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하는가? 자연스러움에 자연스럽지 않음을 두어야하는 그림쟁이의 일은, 어떻게 자연스러움에 닿는가 하는 문제에 항상 다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름의 상상력이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을 만들어 내지 않는가. 여기 극락보전의 백의수월관음 후불벽화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한다. 전설은 정말 순수하다.
이번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의 그림은, 십여년 전의 옛 시간에 맞춰 그렸다. 소박하지만 절제된 미를 갖췄던, 내 마음의 절. 이것저것 내 기억속에 들어선 것들로만 그려보았다. 주변 사물을 죄다 작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큰 나무 세 그루가 주제이다. 파랑새가 한참을 망설임으로 앉아 있었을 나무 아닐까?
무위사는 해거름이 참 좋다. 어쨌든 무위사를 버리듯 나온다. 아쉬움 남는 파랑새처럼….
강진읍 감칠맛나는 식당을 그냥 지나쳐야 하나? 영랑생가를 들러 모란 있는 장독대 구경을 해야 하나? 동백숲 백련사는 어떡하나? 다산초당은 또 어쩌지.
에라, 그냥 가자. 해지기 전에 녹우당을 가자. 커다란 은행나무 반기는 곳. 비자나무 숲 서늘한 곳. 빨리 가서 녹우, 그 푸른 빗소리를 들어 보자.
나는 가끔, 문화 관련사업을 하는 후배들과 술자리를 한다. 그 때마다 으레, 운업(芸業)이라는 녹우당의 편액을 내 놓는다. 우격다짐 나만의 썰을 펼치면, 슬슬 문화의 개념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운업 편액은 원교 이광사가 쓴 글이고, 동국진체의 결론이라는 등, 옥동 이서가 효시라는 동국진체의 편액이 녹우당이라는 등, 고산 선생이 여기 연동마을에 얼마나 살았을까. 백련지 때문에 연동마을이 되고, 비자나무를 심은 이유 등등. 아는 체를 주절주절 한 끝에 운업(芸業)의 뜻을 얘기한다.
“경작할 운, 잡초를 정리하고 숲과 밭을 무성하게 하라. 그 일이 네가 할 일이다. 이게 Curture잖아.”
날마다 꾸준히 스스로 할 일을 해라.
“문화는 꽃이 아니라 토양이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여 준다. 좋은 토양에 좋은 뿌리가 들고 튼튼하게 할 수 있어야 강한 줄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 600년을 이어온 윤씨 가문의 가보는 운업(芸業)이다. 우리 후세들에게 보낼 코드는 무얼까? 운업(芸業)이다. 좋은 생각을 하기에 어려운 시간은 없다.
월출산에서 무위를 보고, 녹우당에서 운업을 배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