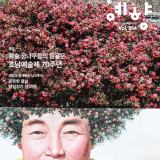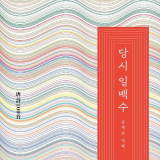[<24>1963년 활터 관덕정] 나를 바로 세우고 덕을 쏜다
2016년 03월 09일(수) 00:00 가가
故 임병룡씨 1920년 구동에 대환정 건립
1927년 폐쇄되자 회원들 십시일반 … 관덕정 지어
사대서 과녁까지 145m … 남녀노소 즐기는 스포츠로
1927년 폐쇄되자 회원들 십시일반 … 관덕정 지어
사대서 과녁까지 145m … 남녀노소 즐기는 스포츠로
두 달 전 국궁을 시작한 동료가 없었다면, 사직공원에 이런 장소가 있는 줄도 모를뻔 했다. 공원 북쪽에 자리한 활터 관덕정(觀德亭)이다. 지난 5일 궁사로첫발을 내딛는 활터 의식인 집궁례(執弓禮)를 마친 그는 이제 관덕정 사대(射臺)에 서서 정식으로 활을 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지난달엔 관덕정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문화재청이 건립된 지 50년 이상 지난 근현대 체육 시설 중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 체육시설 7곳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혀서다. 대상지로는 관덕정을 포함해 이화여대 체육관, 서울 종로 YMCA체육관, 서울 한강조정장 등이 포함됐다. 따뜻한 봄날, 찾아간 관덕정엔 마침 8명의 궁사가 나란히 사대(射臺)에 서 편사(궁사들이 편을 이뤄 한 사람이 모두 스무발씩 쏘는 것)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대에서 과녁까지는 145m. 궁사들이 날린 화살이 말 그대로 ‘쏜살같이’(보통 2∼3초가 걸린다고 한다) 날아갔다. 과녁을 맞추자 불빛이 들어오고 스피커를 통해 들린다. 아깝게 과녁을 비껴날 땐 궁사들 사이에서 탄성도 터진다. 예전에는 명중을 시키면 깃발을 흔들었지만 10여년 전부터 전자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대에서 바라보니 지난해 새로 지은 사직타워가 보인다. 취재 중 만난 이들은 하얀 눈이 쌓일 때 활 시위를 당기는 맛이나, 나무들이 조금씩 푸른 물이 들어갈 때, 벚꽃과 배롱나무, 아카시아가 피는 봄날에 운치가 있다고 전했다.
‘관덕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활터는 전국에 여러 곳이다. 1448년에 지어진 제주도 관덕정은 현재 보물 322호로 지정돼 있다. 관덕정은 예기(禮記) 사의(射儀)편에 ‘활쏘기로 덕을 살핀다’(射以觀盛德)라는 글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사원(射員)들의 우두머리인 사두(射頭)를 역임하고 지금은 고문을 맡고 있는 김석제(70)씨와 현 사두 선계일(71)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무진년에 기록된 ‘관덕계 규약문’ 등 사무실에서 들여다본 낡은 자료들이 세월을 느끼게 한다. 1950년대 활터 모습 등 희귀 사진들과 옛 관덕정 모습도 인상적이다.
관덕정에 걸린 액자에는 연혁이 간략히 적혀 있다. 현재 관덕정 건물은 1963년에 지어졌다. 하지만 그 연원은 3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소개하고 있다. 당시 광산 이씨 문중이 현재 북동 일원에 사정(射亭)을 건축하고 희경당(喜慶堂)이라 이름 지었고, 이어 관덕정으로 개칭했다. 궁사들의 발길이 잦았던 이 곳은 이후 현 충장로 우체국 인근으로 옮겨졌지만, 일제강점기 관공서들이 건축되면서 없어지게 된다.
이후 1920년 고(故) 임병룡씨가 사재를 털어 구동 천변에 대환정(大歡亭)을 짓지만 이 역시 1927년 폐쇄되자 사원들이 십시일반, 현재의 광주공원 노인회관 인근인 구동에 사정을 건립하고 다시 관덕정으로 이름을 바꾼다. 한 문중에 매각된 이 건물은 현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관덕정 건물을 짓는 데 큰 힘을 보탠 이는 관덕정 고문을 지낸 화천기공 권승관 회장과 사원들이었다. 관덕정 입구에 권회장의 공덕비가 세워진 연유다.
관덕정 사대 좌우에는 사원들이 마음에 새겨야할 문구가 걸려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여 활을 쏘라’는 ‘정기발사(正己發射)’와 ‘공손한 모습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보의 미덕을 가져라’는 ‘읍양진퇴(揖讓進退)’다.
또 본채인 관덕정 이외에 1967년 시중당(時中堂)이라는 별도의 건물을 건립했으며 낙성기념남녀활쏘기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경기도 여러차례 열렸다.
오랫동안 활 쏘기는 놀이 문화의 하나였다. 1940∼50년대까지 기생이 함께 어울리는 경우도 많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故)이연술 화니백화점 창업주 등 사업가나 공직에서 퇴직한 지역 유지들이 참여했고 연령대도 50대 이후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예전에는 놀이 문화 성격이 강했습니다. 제가 처음 입문할 때만 해도 회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청을 하면 족보까지 뒤져 엄하게 심사를 하곤 했지요. 사원들 연령대도 높아서 1989년 입문 땐 제가 막내였어요. 지금은 고등학생 회원도 있습니다. ”(선계일 사두)
할아버지 대부터 4대가 활을 쏴온 김석제 고문은 호남 지역 국궁 역사의 산증인으로 아버지를 따라 활터에 다녔던 기억을 더듬었다.
“서석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 아버지를 따라 관덕정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53년 동안 꾸준히 활을 놓지 않았죠, 지금은 아들과 함께 활을 쏘고 있습니다. 활을 쏘는 게 별 운동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엄청난 전신운동이 됩니다.”
김석제 고문은 “예전에는 깍듯이 예의를 차려 활을 쏘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고 했다. 예로부터 사원들은 활을 쏘아 과녁을 맞추는 데 필요한 실력 연마 뿐 아니라 마음과 자세, 하나 하나의 거동을 바르게하는 수양의 덕도 쌓으려 애썼다.
9단의 실력을 자랑하는 김고문은 물소 뿔과 소 힘줄 등으로 만드는 각궁장이기도 하다. 5단 이상 궁사는 보통 각궁과 시누대로 만든 화살(죽시)을 쓴다. 초보자나 초급 궁사들은 카본으로 제작한 활과 화살을 사용한다.
관덕정은 휴일 없이 오전 5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현재 사원은 130여명으로 회사원, 주부, 퇴직 공무원 등 다양하다. 오후에는 편사를 진행하고, 그 이외에 시간에는 자유롭게 활을 쏠 수 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깍지(활시위를 걸어서 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쇠뿔)를 끼고 활을 든 여성 궁사의 모습이 보였다. 사대에 선 그녀가 시위를 당긴다. 숨을 멈추는 5초 정도의 정지 상태가 지나자 화살이 날아가 과녁에 꽂힌다. 무언가 닫힌 마음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다,
기회가 닿는다면 직접 활을 쏴보는 것도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그냥 관덕정을 찾아 활 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 공원안에 자리 잡은 터라 산책하며 들러 보기 좋다. 관덕정에서 내려다 보는 광주 풍경과 저녁 노을 지는 모습도 볼 만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관덕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활터는 전국에 여러 곳이다. 1448년에 지어진 제주도 관덕정은 현재 보물 322호로 지정돼 있다. 관덕정은 예기(禮記) 사의(射儀)편에 ‘활쏘기로 덕을 살핀다’(射以觀盛德)라는 글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관덕정에 걸린 액자에는 연혁이 간략히 적혀 있다. 현재 관덕정 건물은 1963년에 지어졌다. 하지만 그 연원은 3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소개하고 있다. 당시 광산 이씨 문중이 현재 북동 일원에 사정(射亭)을 건축하고 희경당(喜慶堂)이라 이름 지었고, 이어 관덕정으로 개칭했다. 궁사들의 발길이 잦았던 이 곳은 이후 현 충장로 우체국 인근으로 옮겨졌지만, 일제강점기 관공서들이 건축되면서 없어지게 된다.
이후 1920년 고(故) 임병룡씨가 사재를 털어 구동 천변에 대환정(大歡亭)을 짓지만 이 역시 1927년 폐쇄되자 사원들이 십시일반, 현재의 광주공원 노인회관 인근인 구동에 사정을 건립하고 다시 관덕정으로 이름을 바꾼다. 한 문중에 매각된 이 건물은 현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관덕정 건물을 짓는 데 큰 힘을 보탠 이는 관덕정 고문을 지낸 화천기공 권승관 회장과 사원들이었다. 관덕정 입구에 권회장의 공덕비가 세워진 연유다.
관덕정 사대 좌우에는 사원들이 마음에 새겨야할 문구가 걸려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여 활을 쏘라’는 ‘정기발사(正己發射)’와 ‘공손한 모습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보의 미덕을 가져라’는 ‘읍양진퇴(揖讓進退)’다.
또 본채인 관덕정 이외에 1967년 시중당(時中堂)이라는 별도의 건물을 건립했으며 낙성기념남녀활쏘기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경기도 여러차례 열렸다.
오랫동안 활 쏘기는 놀이 문화의 하나였다. 1940∼50년대까지 기생이 함께 어울리는 경우도 많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故)이연술 화니백화점 창업주 등 사업가나 공직에서 퇴직한 지역 유지들이 참여했고 연령대도 50대 이후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예전에는 놀이 문화 성격이 강했습니다. 제가 처음 입문할 때만 해도 회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청을 하면 족보까지 뒤져 엄하게 심사를 하곤 했지요. 사원들 연령대도 높아서 1989년 입문 땐 제가 막내였어요. 지금은 고등학생 회원도 있습니다. ”(선계일 사두)
할아버지 대부터 4대가 활을 쏴온 김석제 고문은 호남 지역 국궁 역사의 산증인으로 아버지를 따라 활터에 다녔던 기억을 더듬었다.
“서석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 아버지를 따라 관덕정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53년 동안 꾸준히 활을 놓지 않았죠, 지금은 아들과 함께 활을 쏘고 있습니다. 활을 쏘는 게 별 운동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엄청난 전신운동이 됩니다.”
김석제 고문은 “예전에는 깍듯이 예의를 차려 활을 쏘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고 했다. 예로부터 사원들은 활을 쏘아 과녁을 맞추는 데 필요한 실력 연마 뿐 아니라 마음과 자세, 하나 하나의 거동을 바르게하는 수양의 덕도 쌓으려 애썼다.
9단의 실력을 자랑하는 김고문은 물소 뿔과 소 힘줄 등으로 만드는 각궁장이기도 하다. 5단 이상 궁사는 보통 각궁과 시누대로 만든 화살(죽시)을 쓴다. 초보자나 초급 궁사들은 카본으로 제작한 활과 화살을 사용한다.
관덕정은 휴일 없이 오전 5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현재 사원은 130여명으로 회사원, 주부, 퇴직 공무원 등 다양하다. 오후에는 편사를 진행하고, 그 이외에 시간에는 자유롭게 활을 쏠 수 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깍지(활시위를 걸어서 당기는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쇠뿔)를 끼고 활을 든 여성 궁사의 모습이 보였다. 사대에 선 그녀가 시위를 당긴다. 숨을 멈추는 5초 정도의 정지 상태가 지나자 화살이 날아가 과녁에 꽂힌다. 무언가 닫힌 마음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다,
기회가 닿는다면 직접 활을 쏴보는 것도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그냥 관덕정을 찾아 활 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 공원안에 자리 잡은 터라 산책하며 들러 보기 좋다. 관덕정에서 내려다 보는 광주 풍경과 저녁 노을 지는 모습도 볼 만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