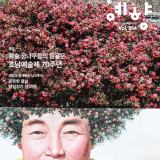라오스 첫 정착민 크무족, 인간과 자연 경계 없는 삶
2013년 12월 31일(화) 00:00 가가
<44>6부 라오스 편 (1) 크무족과 애니미
크무족·라오족·몽족, 조롱박 탄생 설화 간직
무생물에도 영혼 있다 믿는 ‘애니미즘’ 숭배
돌·나무·냇물 등 정령 부여 … 마을 안녕 기원
크무족·라오족·몽족, 조롱박 탄생 설화 간직
무생물에도 영혼 있다 믿는 ‘애니미즘’ 숭배
돌·나무·냇물 등 정령 부여 … 마을 안녕 기원


애니미즘을 숭상하는 소수민족인 크무족이 마을 인근 제단에서 정령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1년에 두차례 있는 폰싸왓 마을 축제이기도 하다. /라오스 루앙프라방=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쌈매 쌈능, 쌈매 쌈능(영이시여, 영이시여).”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17㎞가량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크무(Kmhmu)족 마을 폰싸왓. 지난해 12월25일 꼬불꼬불한 비포장 도로를 1시간 20여분 남짓 달려 도착한 폰싸왓 마을은 ‘파카오’와 ‘팟짐’으로 불리는 거대한 절벽 아래 놓여있었다. 파카오와 팟짐은 각각 여성과 남성을 나타내는 절벽으로 이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 마을 주민들은 신성한 산에 함부로 발을 디디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은 폰싸왓 마을 크무족들이 한 해 벼 수확을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하며 정령을 위한 축제를 여는 날이었다. 마을에서 1㎞ 떨어진 울창한 숲에 있는 ‘신성한 나무’(지름 2.5m·둘레 10m·높이 30∼40m)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 마을 꼰짬(샤먼)과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이 마을 샤먼 쏨씨(54)씨는 “이 곳은 커다란 나무와 함께 앞에 냇물이 흐르고, 커다란 바위가 있어 영(靈)에게 기도를 하는 장소로 정했다”며 “땅이 부족해도 이곳에서는 경작을 하지 않고, 나무도 꺾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종의 ‘금기 지역’으로, 대나무를 쪼개 만든 ‘딸래오’라고 불리는 표식이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신성한 나무는 한국의 ‘당산나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샤먼은 전날 밤 이곳에 들어와 정령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샤먼과 주민들은 신성한 나무 옆에 있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제단에서 정령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나뭇잎을 둘둘 말아 꽃으로 치장한 제물과 가족 수에 따라 정성스레 준비한 바나나 잎에 싼 찰밥을 제단에 바쳤다.
샤먼은 주민들이 준비한 제물과 찰밥을 제단에 올리면서 끊임없이 정령을 불렀다. 또 항아리에 든 술을 마을 주민들과 나눠 마셨다. 쌀로 만든 술은 청주와 맛이 비슷했다. 주민들의 행렬과 샤먼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닭을 잡아 제단에 바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2시간 남짓 흐르자 샤먼과 주민의 기도가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찰밥과 닭 등을 모두 제단에 올리고 마을 주민들이 나눠 먹으면서 의식이 끝이 났다. 이후 샤먼은 마을 사람들의 손목에 ‘바시’라고 불리는 실을 감아준다. 마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장신구다.
주민들은 “1년에 두 차례밖에 없는 성스러운 의식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는 축제와 마찬가지”라며 “이날은 마을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즐긴다”고 말했다.
크무족은 라오스에 있는 소수민족이 대부분 그렇듯 애니미즘을 숭상한다. 모든 사물과 생물에 정령이 서려있다고 믿고, 또 그 정령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령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나무와 바위, 냇물에도 서려있다. 샤먼은 주민과 정령의 조화를 위해 존재하며,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을 보살펴 달라며 정령에게 기도를 올린다. 주민과 정령들의 조화가 깨지면 정령이 떠나버리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등 마을에 불행이 닥친다고 믿는다. 또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도 각종 나무나 동물에서 이름을 빌려와 사용하기도 한다.
크무족은 오늘날 라오스를 최초로 발견한 민족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이야기는 ‘막남 따우뿡’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지구에는 두 남매만이 존재했다. 이 둘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편평하다고 믿었다. 이들은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됐고, 각자의 신랑과 신부를 찾기 위해 지구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가도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고, 둘은 처음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남매는 세상에 자신들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한다. 부부가 된 남매는 농사를 짓기 위해 밭에 씨앗 두 톨을 심었다. 그 씨앗은 ‘조롱박’이었다. 조롱박은 부부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랐고, 부부는 조롱박을 수확해 오두막집에 가져와 보관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 말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들이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부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잘못 들었겠거니”라며 곧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됐다.
도저히 참지 못한 부부는 박을 열어보기로 하고, 나무를 이용해 박에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아이가 있었고, 얼마 후 아이는 박을 스스로 깨고 나온다. 이 아이가 크무족의 시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박에서 또 다르게 생긴 아이들이 연이어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라오스 저지대에 사는 라오족, 세 번째는 몽족이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게 된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설화에 나타난 소수민족의 얼굴 색깔이다. 크무족의 얼굴 색깔이 다른 라오스 민족들에 비해 유난히 검은 이유가 부부가 나뭇가지로 박에 구멍을 내면서 나뭇가지에 묻어 있던 재가 크무족의 얼굴에 묻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크무족 다음에 태어난 라오족은 얼굴이 조금 더 하얗고, 마지막에 태어난 몽족의 얼굴 색깔은 라오족보다 더 하얗다. 실제 세 부족의 얼굴 색깔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취재진을 안내한 몽족 출신 가이드는 “7세기 무렵 크무족이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건너왔고, 두 번째로 14세기에 라오족이, 세 번째로 19세기 몽족이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김경인 기자 kki@kwangju.co.kr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17㎞가량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크무(Kmhmu)족 마을 폰싸왓. 지난해 12월25일 꼬불꼬불한 비포장 도로를 1시간 20여분 남짓 달려 도착한 폰싸왓 마을은 ‘파카오’와 ‘팟짐’으로 불리는 거대한 절벽 아래 놓여있었다. 파카오와 팟짐은 각각 여성과 남성을 나타내는 절벽으로 이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 마을 주민들은 신성한 산에 함부로 발을 디디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마을 샤먼 쏨씨(54)씨는 “이 곳은 커다란 나무와 함께 앞에 냇물이 흐르고, 커다란 바위가 있어 영(靈)에게 기도를 하는 장소로 정했다”며 “땅이 부족해도 이곳에서는 경작을 하지 않고, 나무도 꺾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종의 ‘금기 지역’으로, 대나무를 쪼개 만든 ‘딸래오’라고 불리는 표식이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신성한 나무는 한국의 ‘당산나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샤먼은 전날 밤 이곳에 들어와 정령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2시간 남짓 흐르자 샤먼과 주민의 기도가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찰밥과 닭 등을 모두 제단에 올리고 마을 주민들이 나눠 먹으면서 의식이 끝이 났다. 이후 샤먼은 마을 사람들의 손목에 ‘바시’라고 불리는 실을 감아준다. 마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장신구다.
주민들은 “1년에 두 차례밖에 없는 성스러운 의식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는 축제와 마찬가지”라며 “이날은 마을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즐긴다”고 말했다.
크무족은 라오스에 있는 소수민족이 대부분 그렇듯 애니미즘을 숭상한다. 모든 사물과 생물에 정령이 서려있다고 믿고, 또 그 정령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령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나무와 바위, 냇물에도 서려있다. 샤먼은 주민과 정령의 조화를 위해 존재하며,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을 보살펴 달라며 정령에게 기도를 올린다. 주민과 정령들의 조화가 깨지면 정령이 떠나버리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등 마을에 불행이 닥친다고 믿는다. 또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도 각종 나무나 동물에서 이름을 빌려와 사용하기도 한다.
크무족은 오늘날 라오스를 최초로 발견한 민족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이야기는 ‘막남 따우뿡’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지구에는 두 남매만이 존재했다. 이 둘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편평하다고 믿었다. 이들은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됐고, 각자의 신랑과 신부를 찾기 위해 지구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가도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고, 둘은 처음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남매는 세상에 자신들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한다. 부부가 된 남매는 농사를 짓기 위해 밭에 씨앗 두 톨을 심었다. 그 씨앗은 ‘조롱박’이었다. 조롱박은 부부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랐고, 부부는 조롱박을 수확해 오두막집에 가져와 보관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 말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들이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부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잘못 들었겠거니”라며 곧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됐다.
도저히 참지 못한 부부는 박을 열어보기로 하고, 나무를 이용해 박에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아이가 있었고, 얼마 후 아이는 박을 스스로 깨고 나온다. 이 아이가 크무족의 시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박에서 또 다르게 생긴 아이들이 연이어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라오스 저지대에 사는 라오족, 세 번째는 몽족이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게 된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설화에 나타난 소수민족의 얼굴 색깔이다. 크무족의 얼굴 색깔이 다른 라오스 민족들에 비해 유난히 검은 이유가 부부가 나뭇가지로 박에 구멍을 내면서 나뭇가지에 묻어 있던 재가 크무족의 얼굴에 묻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크무족 다음에 태어난 라오족은 얼굴이 조금 더 하얗고, 마지막에 태어난 몽족의 얼굴 색깔은 라오족보다 더 하얗다. 실제 세 부족의 얼굴 색깔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취재진을 안내한 몽족 출신 가이드는 “7세기 무렵 크무족이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건너왔고, 두 번째로 14세기에 라오족이, 세 번째로 19세기 몽족이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김경인 기자 k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