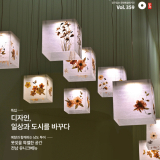[수필의 향기] 다시 처음처럼 -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2024년 01월 01일(월) 22:00 가가
갑진년 푸른 용(龍)의 해다. 용하면 우리 광주다. 영산강과 황룡강은 굽이굽이 흐르면서 마을을 형성했고 그 마을 지명 곳곳에 용이 살고 있다. 한 마리는 우치공원이 있는 생용동에서 용전동·용강동을 거쳐 용두교 아래 신용동 꿈틀꿈틀 등룡산 방향으로 내려가고, 또 한 마리는 용진산을 휘돌아 오룡동·용동·용곡동을 돌아 복룡산의 용봉동·황룡동으로 흘러내린 강, 황룡강이다. 두 마리 용은 용봉동에서 만나 승천보로 흘러간다. 이 지형은 마치 거대한 두 용이 꿈틀대고 형국이어서, 어쩜 머지않아 이곳에 큰 용이 출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동안 광주에 정·재계 예술 문화계 등에 수많은 인재가 뜨고 졌지만 아쉽게도 딱히 선두 주자가 없다. 몇은 진흙탕 냄새를 남기고 떠나기도 했다. 광주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맑고 향기로운 신화적인 인물, 용 한 마리쯤 있었으면 좋겠다.
동학과 독립운동, 여순사건과 독재정권, 5.18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고장은 핍박과 차별을 너무 받아서 쉽사리 나서려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인재와 동량들이 쓸쓸히 초야에 묻혔지만, 이제는 누구나 훌륭했다고 감사하다고 여길 인물 몇 명쯤 나타날 때이다.
이돈명 변호사나 김황식 총리, 박현채, 송기숙, 법정, 정약용, 김환기 등 생각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간디나 처칠, 고흐나 헤밍웨이, 마더 테레사나 바보 김수환 추기경 같은 인물이 그립다. 복룡이었다면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 환호작약할 때가 많다. 게으름과 자만심에 빠져 경솔할 때도 있다. 허나 새해가 아니더라도 항상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언제나 좋다.
회장도 처음에는 노동자였고, 목사나 주지도 신도부터 시작했다. 장관 사장 기관장도 처음에는 일반인 평사원이었듯이 누구나 처음부터 용인 사람은 없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아집을 벗어나서 맑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새해는 그렇게 낮은 곳으로 돌아가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했으면 한다. 첫 직장 처음 출근하는 마음으로, 첫사랑처럼, 처음 만나는 마음가짐으로 용의 해를 출발했으면 싶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암울했던 1960년대, 20년 20일 동안, 깜깜한 교도소라는 절망 속에서도 사색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대의 지식인, 긍정의 힘을 찾으려 했던 신영복 교수처럼….
새해면 더 많은 이들이 무등산을 오른다. 산을 오를 때 내딛는 첫발처럼 힘차고 꿈 가득하길 바란다. 무등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우리 얼굴이고 자체가 큰 바위 얼굴이다. 영산강과 황룡강, 두 마리 용을 따라 자전거를 탄다. 강줄기를 따라 페달을 밟으면서 큰 뜻을 품어본다.
윤한봉, 박관현, 이한열 열사가 살았다면 가능했을까. 어른 김장하, 이태석 신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들처럼 용의 기운을 타고 우리 고장에서 어깨 쭉 펴고 날개를 펴는 이가 새해에 나오기를 소망한다.
혹여 곁에 있는데 발굴 못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키워야지 싶다. 나아가 우리 모두 내가 용이 되겠다, 아니면 각자가 하나하나 비늘이 되어 거대한 용의 일부가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2024년 새 아침이다. 새 옷 입은 이처럼, 선물 받은 새해, 푸릇푸릇 새 학기처럼, 새봄처럼, 호기심 가득한 아이처럼, 생기발랄한 젊은이처럼 시작했으면 좋겠다.
처음은 누구나 생의 에너지가 넘친다. 엎드려 있었던 도시 광주, 용의 해를 맞이하여 우뚝 일어나 무등산과 월출산 어딘가 있을 여의주를 물고 활짝 비상하기를 바란다.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 환호작약할 때가 많다. 게으름과 자만심에 빠져 경솔할 때도 있다. 허나 새해가 아니더라도 항상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언제나 좋다.
회장도 처음에는 노동자였고, 목사나 주지도 신도부터 시작했다. 장관 사장 기관장도 처음에는 일반인 평사원이었듯이 누구나 처음부터 용인 사람은 없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아집을 벗어나서 맑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새해는 그렇게 낮은 곳으로 돌아가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했으면 한다. 첫 직장 처음 출근하는 마음으로, 첫사랑처럼, 처음 만나는 마음가짐으로 용의 해를 출발했으면 싶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암울했던 1960년대, 20년 20일 동안, 깜깜한 교도소라는 절망 속에서도 사색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대의 지식인, 긍정의 힘을 찾으려 했던 신영복 교수처럼….
새해면 더 많은 이들이 무등산을 오른다. 산을 오를 때 내딛는 첫발처럼 힘차고 꿈 가득하길 바란다. 무등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우리 얼굴이고 자체가 큰 바위 얼굴이다. 영산강과 황룡강, 두 마리 용을 따라 자전거를 탄다. 강줄기를 따라 페달을 밟으면서 큰 뜻을 품어본다.
윤한봉, 박관현, 이한열 열사가 살았다면 가능했을까. 어른 김장하, 이태석 신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들처럼 용의 기운을 타고 우리 고장에서 어깨 쭉 펴고 날개를 펴는 이가 새해에 나오기를 소망한다.
혹여 곁에 있는데 발굴 못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키워야지 싶다. 나아가 우리 모두 내가 용이 되겠다, 아니면 각자가 하나하나 비늘이 되어 거대한 용의 일부가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2024년 새 아침이다. 새 옷 입은 이처럼, 선물 받은 새해, 푸릇푸릇 새 학기처럼, 새봄처럼, 호기심 가득한 아이처럼, 생기발랄한 젊은이처럼 시작했으면 좋겠다.
처음은 누구나 생의 에너지가 넘친다. 엎드려 있었던 도시 광주, 용의 해를 맞이하여 우뚝 일어나 무등산과 월출산 어딘가 있을 여의주를 물고 활짝 비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