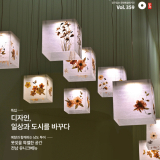[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두부의 맛
2023년 12월 20일(수) 22:00 가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백석(1912~1996)의 시다. 국수라는 제목을 모른다면 두부를 묘사한 것이라 해도 될 듯하다. 우리 음식에서 두부는 오래 전부터 윗길이었고, 이른바 ‘있는 집 음식’이었다가 대중들의 너른 사랑을 받아왔다. 나는 한식에서 딱 세 가지를 꼽으라면 쌀밥, 김치 그리고 두부를 든다. 부대찌개와 치즈닭갈비도 한식이 된 마당이지만, 위의 세 음식은 한식에서 가장 본령에 있다고 생각한다. 쌀밥은 모든 반찬을 포용하는 엄청난 관용력에서, 김치는 익히고 절이는 탁월한 고유기술에서, 두부는 그 순수하며 풍만한 여유가 한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두부는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각기 다른 포지션을 갖는다. 순두부는 갓 엉기어 몽글몽글한 여린 식감이 우리를 끌어들이고, 모두부는 형태를 갖추었으나 쉬이 부스러지며 제 맛을 한껏 표현한다. 막 한 점 떴을 때 숟가락에 전해지는 두부의 용해를 그대로 느껴보라. 아, 그것은 너무도 푸근하여 차라리 눈물이 울컥거리는 바가 아닐까. 그렇다. 찌개에 넣고 끓인 모두부 한 점을 떠서 밥에 올려 비비면 제 몸을 다 바쳐 밥에 투신하는 순정한 두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비지는 순두부도 모두부도 다 내준 콩의 마지막 헌정이다. 비지가 비지다운 것은 다 짜내어서 버려질 운명에서조차 다시 거칠게나마 두부의 일파를 선언하는 기개다. 비지찌개를 누가 하품이라 할까. 돼지기름이나 뚝뚝 끊어넣고, 아니면 멸치 몇 가닥과 신김치 몇 점으로 끓여낸 비지찌개는 비록 두부 서열의 종착이나 맛은 다른 결에서 순두부에 결코 지지않는 패기가 느껴진다. 나는 신김치와 돼지갈비 토막을 몇 개 넣어 기름이 뜨게 푹 끓여 마지막에 비지를 듬뿍 넣어 끓인 찌개를 잊을 수 없다.
옛날 두부장수는 종을 치거나 나팔을 불어 손님을 불렀다. 댕그렁거리는 그 청동 종소리는 묵직하고 여운이 길었다. 골목이 있던 시절의 삽화다. 이제 사람들은 골목 없는 빌딩에 산다. 아파트 빌딩 사이를 누가 골목이라 부를 수 있을까. 골목은 삶의 실핏줄 같아서 그 혈관에 두부장수도 생선장수도 출입했다. 두부장수는 새벽에 다녀가니, 때를 놓치면 가게에서 샀다. 얼음같은 찬물에 쟁여진 판두부에, 주문에 따라 칼로 반듯하게 잘라 한 모를 길어내던 왕년의 구멍가게, 연쇄점 아저씨의 손길을 나는 목도하였고 그 두부반찬으로 뼈와 내장을 일구어 자랐다. 다 꿈 같은 기억이다.
요즘도 두부를 손수 만드는 식당이 더러 있다. 보통은 교외에 너른 마당이 있는 집에서 그리 한다. 두부를 만들자면 아무래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부는 내력 있는 집에서 할머니의 내림으로 전해지는 전통음식이기도 하다. 전라도에서는 물과 콩이 좋기로 소문나서 두부가 좋았다. 지금도 콩 생산 1등은 전라도다. 왕년에 전주(화심) 두부가 유명했다. 과문하여 타 고을의 두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어느 마을에 좋은 두부가 없었으랴. 예전에 강릉 초당두부를 취재할 때 새벽 첫 버스에 두부 함지를 싣던 할매들 얘기를 들었다. 시내로 통학하는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버스에 두부 함지랑 학생들이 나란히 실려 돈 벌러, 공부하러 가던 마음이 읽혀 또 울컥한 적이 있다. 그 유명한 초당두부는 그런 사람의 역사로 만들어진 셈이다. 두부 두루치기가 유명한 대전 역시 시내로 연결되는 옛날 대덕군 산내면 두부장수 아주머니들이 만들어낸 역사다. 두부는 생활비와 학비를 만들던, 불 때는 장작연기처럼 매운 눈물의 음식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이런 민족의 두부가 거의 사라지고, 마트에서 고만고만한 두부를 팔고 산다. 두부는 갓 만든 시간의 작품이다. 그래서 손두부라 하고 숨두부라 한다. 사람 손으로 만들고 숨결이 사라지기 전에 먹어야 제맛이란 뜻이다. 공장 두부는 그것대로, 갓 만든 가게두부는 또 그대로 오래 살아남아 두부의 시대를 이어가길 바랄 뿐이다.
<음식 칼럼니스트>
백석(1912~1996)의 시다. 국수라는 제목을 모른다면 두부를 묘사한 것이라 해도 될 듯하다. 우리 음식에서 두부는 오래 전부터 윗길이었고, 이른바 ‘있는 집 음식’이었다가 대중들의 너른 사랑을 받아왔다. 나는 한식에서 딱 세 가지를 꼽으라면 쌀밥, 김치 그리고 두부를 든다. 부대찌개와 치즈닭갈비도 한식이 된 마당이지만, 위의 세 음식은 한식에서 가장 본령에 있다고 생각한다. 쌀밥은 모든 반찬을 포용하는 엄청난 관용력에서, 김치는 익히고 절이는 탁월한 고유기술에서, 두부는 그 순수하며 풍만한 여유가 한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요즘도 두부를 손수 만드는 식당이 더러 있다. 보통은 교외에 너른 마당이 있는 집에서 그리 한다. 두부를 만들자면 아무래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부는 내력 있는 집에서 할머니의 내림으로 전해지는 전통음식이기도 하다. 전라도에서는 물과 콩이 좋기로 소문나서 두부가 좋았다. 지금도 콩 생산 1등은 전라도다. 왕년에 전주(화심) 두부가 유명했다. 과문하여 타 고을의 두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어느 마을에 좋은 두부가 없었으랴. 예전에 강릉 초당두부를 취재할 때 새벽 첫 버스에 두부 함지를 싣던 할매들 얘기를 들었다. 시내로 통학하는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버스에 두부 함지랑 학생들이 나란히 실려 돈 벌러, 공부하러 가던 마음이 읽혀 또 울컥한 적이 있다. 그 유명한 초당두부는 그런 사람의 역사로 만들어진 셈이다. 두부 두루치기가 유명한 대전 역시 시내로 연결되는 옛날 대덕군 산내면 두부장수 아주머니들이 만들어낸 역사다. 두부는 생활비와 학비를 만들던, 불 때는 장작연기처럼 매운 눈물의 음식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이런 민족의 두부가 거의 사라지고, 마트에서 고만고만한 두부를 팔고 산다. 두부는 갓 만든 시간의 작품이다. 그래서 손두부라 하고 숨두부라 한다. 사람 손으로 만들고 숨결이 사라지기 전에 먹어야 제맛이란 뜻이다. 공장 두부는 그것대로, 갓 만든 가게두부는 또 그대로 오래 살아남아 두부의 시대를 이어가길 바랄 뿐이다.
<음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