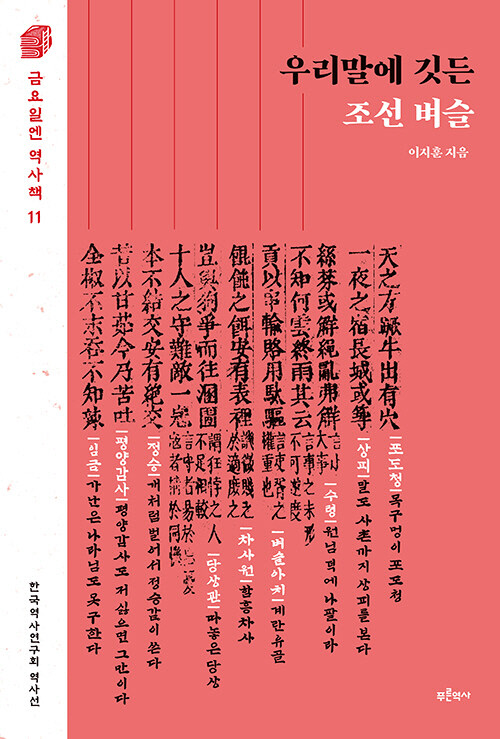우리말에 깃든 조선 벼슬 - 이지훈 지음
2025년 02월 22일(토) 00:00 가가
‘따놓은 당상’,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원님 덕에 나팔’, ‘목구멍이 포도청’… 한번쯤은 들어봤을 속담 속에 조선시대 벼슬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고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 조선 벼슬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말에 남아 있는 걸까? 바로 속담의 힘이다. 속담의 힘 덕분에 조선 벼슬은 몇 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말 안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벼슬을 둘러싼 옛사람들의 통찰과 애환을 흥미롭게 풀어낸 ‘우리말에 깃든 조선 벼슬’이 출간됐다. 조선시대의 관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저자 이지훈이 재미있고 쓸모있는 역사를 위해 준비한 색다른 시도다.
저자는 “우리말에 깃든 덕분에 조선 벼슬은 우리 입으로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무형의 유산이 되었다”며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남아있는 조선 시대 문화유산의 모습을 새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책은 다섯 장과 열네 절로 구성돼 있으며 절마다 속담 하나씩을 다루고 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속담이 있다. 돈을 벌 때는 힘들게 벌고 쓸 때는 떳떳하고 보람있게 쓴다는 뜻이다. 정승은 얼마나 높은 벼슬이기에 속담에까지 사용됐을까.
정승은 조선 건국 직후 최상위 관청 가운데 하나인 문하부에 설치된 벼슬이었다. 1414년 공식 벼슬 명칭에서는 사라졌지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가리키는 별명으로 남았다. 정승 세 벼슬이 소속한 의정부는 관청 가운데 종친부 다음으로 서열이 높았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높은 벼슬아치였으니 정승 관련 속담도 많을 수밖에. 그 좋은 자리가 얼마나 따내기 어려운지, 또 어렵게 따내더라도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속담으로 남겨두었다. <푸른역사·1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고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 조선 벼슬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말에 남아 있는 걸까? 바로 속담의 힘이다. 속담의 힘 덕분에 조선 벼슬은 몇 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말 안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저자는 “우리말에 깃든 덕분에 조선 벼슬은 우리 입으로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무형의 유산이 되었다”며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남아있는 조선 시대 문화유산의 모습을 새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