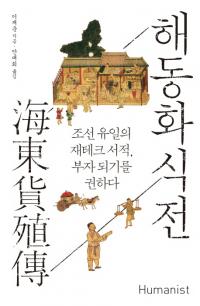유학의 경제관 뒤집은 조선 유일 재테크 서적
2019년 08월 23일(금) 04:50 가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해동화식전'
이재운 지음·안대회 옮김
이재운 지음·안대회 옮김
“사람에게는 항상 똑같은 마음이 없고, 가문에는 정해져 변치 않는 생업이 없으며, 재물에는 본디 임자가 없어 능력이 있는 자가 사용한다. 재물을 잘 운용하는 자는 손자(孫子)와 오자(吳子)가 군대를 다스리고, 제갈량이 나라를 다스리듯 한다. 반면에 재물을 잘못 운용하는 자는 소가 쥐를 잡듯 하고, 호랑이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한다.”(본문 중에서)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재산을 모았을까? 아니 부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을까? 당시에도 재테크에 대한 정보나 서적이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에 대한 인식도 재테크 관련 책도 있었다. ‘해동화식전’(海東貨殖傳)이 그것. 북인 당파의 영수인 이산해의 직계후손으로 서파 지식인이었던 이재운이 펴낸 책은 부의 획득을 긍정한다.
이번 책은 우리 고전을 알리기 위해 힘써온 안대회 교수의 발굴을 계기로 세상에 나왔다. 안 교수는 300년 가까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해동화식전’을 세심하게 번역했고 일반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
‘병세재언록’의 저자 이규상은 “변화가 무궁하며 붓끝이 굉장하고 빛이 나서 근세 100년 사이에 이런 작품이 없다. 요사이 연암 박지원이 기굴한 명가로 일컬어지나 ‘해동화식전’에 견주면 대우가 난삽하고 기괴하여 손색이 있다”고 평한다.
먼저 ‘해동화식전’은 조선후기를 배경으로 한다. 시전상인들이 장터를 돌아다니고 물산이 두루 유통되던 시기로, 유수원의 ‘우서’와 이중환의 ‘택리지’ 그리고 박제가의 ‘북학의’와 같은 책들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조선 팔도 물산을 정리한 책들도 널리 읽히던 무렵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은 강력한 유교사회였다. 사대부들은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됐으며 상업은 천한 직종으로 치부됐다.
이 즈음에 등장한 ‘해동화식전’은 유학의 경제관을 과감하게 뒤집는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군자는 의로움을, 소인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논리가 ‘군자도 이익을 추구하고, 소인도 의로울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체된다.
책에는 모두 아홉 편의 상인 열전이 실려 있다. 자수성가한 이들부터 거지까지 신분도 천차만별이다. 저자는 부자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치산(治山)을 잘하는 사람은 재물을 크게 불리고, 그다음 사람은 아끼고 절약하며, 그다음 사람은 변화를 일으켜 형통하고, 그다음 사람은 고생을 참고 근면하게 일한다. 아무 수완이 없는 사람은 거지로 산다.”
그 가운데 이재운은 애써 부를 일군 사람들이야말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다. 부자의 미덕을 예찬하고 빈자의 악덕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부자들은 탐욕과 부정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욕망과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추구한다.
“저 진욱은 여항의 필부이자 시정의 자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권세가 장수와 재상을 눌렀고, 사람들이 시기하여 몰래 해코지하려 들지 않았다. 사치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도 집안이 망하지 않았다. 사이가 먼 사람에게도 은덕을 베풀었고, 이웃나라까지 명성이 났다. 이야말로 ‘치산(治山)을 잘하는 사람은 재물을 크게 불린다’는 사례이다.”
이재운의 주장은 조선후기 중상주의적 경제론이 만개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를 하지만 당대를 변화시키는 마중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서자 출신 지식인이 던진 경제경영론으로 인식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책은 시대를 거스른 중상주의적 경영론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남다르다. 팔도 물산을 정리한 물산기 세 편도 함께 수록돼 있어 당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각기 자기 일을 열심히 하여 즐겁게 이윤을 추구하니 마치 바싹 마른 장작에 불이 옮겨붙어 활활 타는 것과 같다. 밤낮으로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각자 애지중지하는 재물을 내놓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쩨쩨하게 굴거나 아까워하는 표정을 짓지 않으니 이치로 보아 자연스럽고 누구나 욕망을 추구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휴머니스트·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에 대한 인식도 재테크 관련 책도 있었다. ‘해동화식전’(海東貨殖傳)이 그것. 북인 당파의 영수인 이산해의 직계후손으로 서파 지식인이었던 이재운이 펴낸 책은 부의 획득을 긍정한다.
이번 책은 우리 고전을 알리기 위해 힘써온 안대회 교수의 발굴을 계기로 세상에 나왔다. 안 교수는 300년 가까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해동화식전’을 세심하게 번역했고 일반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은 강력한 유교사회였다. 사대부들은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됐으며 상업은 천한 직종으로 치부됐다.
이 즈음에 등장한 ‘해동화식전’은 유학의 경제관을 과감하게 뒤집는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군자는 의로움을, 소인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논리가 ‘군자도 이익을 추구하고, 소인도 의로울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체된다.
책에는 모두 아홉 편의 상인 열전이 실려 있다. 자수성가한 이들부터 거지까지 신분도 천차만별이다. 저자는 부자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치산(治山)을 잘하는 사람은 재물을 크게 불리고, 그다음 사람은 아끼고 절약하며, 그다음 사람은 변화를 일으켜 형통하고, 그다음 사람은 고생을 참고 근면하게 일한다. 아무 수완이 없는 사람은 거지로 산다.”
그 가운데 이재운은 애써 부를 일군 사람들이야말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다. 부자의 미덕을 예찬하고 빈자의 악덕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부자들은 탐욕과 부정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욕망과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추구한다.
“저 진욱은 여항의 필부이자 시정의 자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권세가 장수와 재상을 눌렀고, 사람들이 시기하여 몰래 해코지하려 들지 않았다. 사치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도 집안이 망하지 않았다. 사이가 먼 사람에게도 은덕을 베풀었고, 이웃나라까지 명성이 났다. 이야말로 ‘치산(治山)을 잘하는 사람은 재물을 크게 불린다’는 사례이다.”
이재운의 주장은 조선후기 중상주의적 경제론이 만개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를 하지만 당대를 변화시키는 마중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서자 출신 지식인이 던진 경제경영론으로 인식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책은 시대를 거스른 중상주의적 경영론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남다르다. 팔도 물산을 정리한 물산기 세 편도 함께 수록돼 있어 당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각기 자기 일을 열심히 하여 즐겁게 이윤을 추구하니 마치 바싹 마른 장작에 불이 옮겨붙어 활활 타는 것과 같다. 밤낮으로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각자 애지중지하는 재물을 내놓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쩨쩨하게 굴거나 아까워하는 표정을 짓지 않으니 이치로 보아 자연스럽고 누구나 욕망을 추구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휴머니스트·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