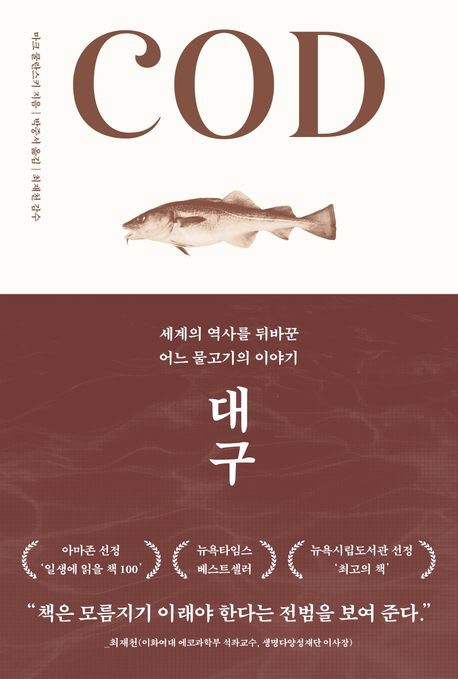밥상 위 생선 대구, 인류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2025년 01월 10일(금) 00:00 가가
대구
마크 쿨란스키 지음, 박중서 옮김
마크 쿨란스키 지음, 박중서 옮김
“이놈들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다산을 할 뿐 아니라 질병과 추위에 강하고 거의 모든 식량자원을 섭취할 수 있다. 게다가 얕은 물로 찾아가서 해안에 가까이 살아 그야말로 완벽한 상업용 물고기였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연안 수심 30m대에서 주로 서식하며, 1m크기 암컷 한 마리 당 300만 개의 알을 낳고, 소금에 절여 건조시키면 단백질 성분이 80%에 달하는 ‘상업용 물고기’는 뭘까? 게다가 크기 1~2m·무게 100㎏에 이르고, 수명도 20~30년에 달한다. 해답은 대구(大口)이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마크 쿨란스키가 1997년 펴낸 ‘대구’(Cod)는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어느 물고기의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대서양대구’라는 특정 바닷물고기가 바이킹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한다. 국내에는 2014년 소개된 후 절판됐으나 최근 독자들의 북 펀딩을 통해 재출간됐다.
식탁에 오르는 생선 대구에 1000여 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농축돼 있을 줄 미처 몰랐다. 저자는 중세부터 ‘머나먼 미지의 해역’에서 대구를 잡아오는 바스크인들과 10세기 무렵 새로 발견한 황량한 땅에 ‘그린란드’(녹색의 땅)라는 이름을 붙인 바이킹부터 대구 이야기를 풀어낸다. 일찍이 바스크인과 바이킹은 대구를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시켜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대구시장을 확장시켰고, 현재의 북미까지 장거리 탐험에 나설 수 있었다. 특히 단백질 18% 이상, 지방 0.3%에 불과한 대구는 건조 과정을 거쳐 수분을 증발시키면 단백질 성분 80%에 달하는 ‘바다의 빵’이나 다름없었다.
북미 대륙붕 가장자리에 있는 대구의 황금어장 ‘그랜드 뱅크스’는 멕시코 만류와 북극권 그린란드 해류가 합류하는 해역이다. 바스크인들이 영업비밀로 유지해왔던 이곳이 영국 탐험가 존 캐벗에 의해 발견된 때는 1497년 6월. 그는 ‘새로 발견한 땅’(New Found Land·오늘날의 뉴펀들랜드)이라 이름 붙였다. 19세기에는 대구가 워낙 많이 잡혀 대구 등을 밟고 대서양을 건널 수 있으리라 상상할 정도였다.
또한 대구는 미국을 독립으로 이끈 매개체다. 1620년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Pilgrim)들은 어업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한세대쯤 지나 ‘대구 귀족’이 됐고 국제적인 대구무역 세력으로 부상했다. 저자는 뉴잉글랜드 ‘대구 귀족’들이 카리브해 서인도제도간 대구 무역 과정에서 영국 제재에 반발해 독립전쟁을 벌이는 역사를 흥미롭게 들려준다. 소금에 절여 말린 뉴잉글랜드산 대구는 서인도제도 설탕 플랜테이션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노예들의 단백질원이었다. 영국의 제재로 1780~1787년 대구무역이 금지됐을 때 자메이카에서 1만5000명의 흑인 노예가 굶어죽었다고 한다.
저자는 대구와 인류의 시간여행에서 한발 나아가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깊이 있게 살핀다. 그동안 간과했던 남획은 이제 직면해 있는 전지구적 문제이다. 특히 ‘(어업이) 자국민을 중세에서 풍요의 세계로 끌어올린 기적’이었던 아이슬란드는 영국과 3차례 ‘대구 전쟁’을 벌였고, 영해선을 200마일로 확장한다.
이제 더 이상 동해에서 잡히지 않는 명태(왕눈폴락대구) 또한 대구의 일종이라고 한다. 누군가 한·중·일 중심으로 대구 이야기를 새롭게 썼으면 좋겠다. 부록으로 에스파냐 바스크 지방의 소금절임대구 요리 등 각 지역의 다양한 대구 조리법을 수록했다. 대구는 영국 ‘피시 앤 칩스’의 주재료이기도 하다.
<알에이치코리아·2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연안 수심 30m대에서 주로 서식하며, 1m크기 암컷 한 마리 당 300만 개의 알을 낳고, 소금에 절여 건조시키면 단백질 성분이 80%에 달하는 ‘상업용 물고기’는 뭘까? 게다가 크기 1~2m·무게 100㎏에 이르고, 수명도 20~30년에 달한다. 해답은 대구(大口)이다.
또한 대구는 미국을 독립으로 이끈 매개체다. 1620년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Pilgrim)들은 어업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한세대쯤 지나 ‘대구 귀족’이 됐고 국제적인 대구무역 세력으로 부상했다. 저자는 뉴잉글랜드 ‘대구 귀족’들이 카리브해 서인도제도간 대구 무역 과정에서 영국 제재에 반발해 독립전쟁을 벌이는 역사를 흥미롭게 들려준다. 소금에 절여 말린 뉴잉글랜드산 대구는 서인도제도 설탕 플랜테이션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노예들의 단백질원이었다. 영국의 제재로 1780~1787년 대구무역이 금지됐을 때 자메이카에서 1만5000명의 흑인 노예가 굶어죽었다고 한다.
저자는 대구와 인류의 시간여행에서 한발 나아가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깊이 있게 살핀다. 그동안 간과했던 남획은 이제 직면해 있는 전지구적 문제이다. 특히 ‘(어업이) 자국민을 중세에서 풍요의 세계로 끌어올린 기적’이었던 아이슬란드는 영국과 3차례 ‘대구 전쟁’을 벌였고, 영해선을 200마일로 확장한다.
이제 더 이상 동해에서 잡히지 않는 명태(왕눈폴락대구) 또한 대구의 일종이라고 한다. 누군가 한·중·일 중심으로 대구 이야기를 새롭게 썼으면 좋겠다. 부록으로 에스파냐 바스크 지방의 소금절임대구 요리 등 각 지역의 다양한 대구 조리법을 수록했다. 대구는 영국 ‘피시 앤 칩스’의 주재료이기도 하다.
<알에이치코리아·2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