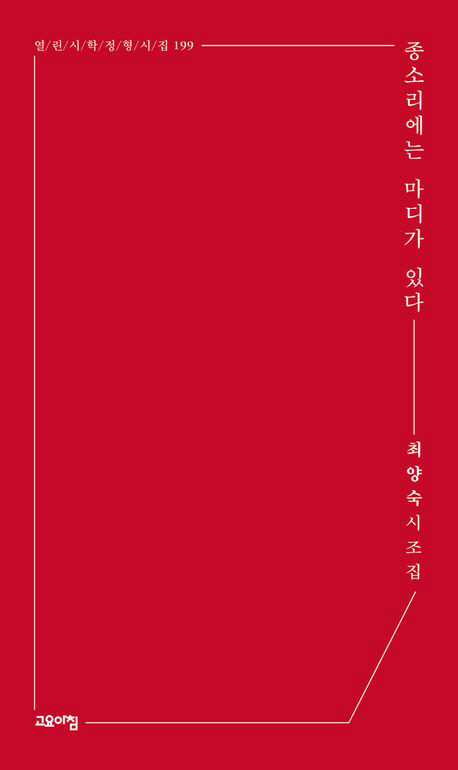“자연의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시조로 형상화”
2025년 03월 30일(일) 17:55 가가
최양숙 시인 작품집 ‘종소리는 마디가 있다’ 펴내
“시조는 제 몸이며 밥이고 제안에 흐르는 피”
“시조는 제 몸이며 밥이고 제안에 흐르는 피”
  |
| 최양숙 시인 |
시조집에서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 다양한 소리를 시적으로 형상화했다는 말일 것이다.
최양숙 시인의 ‘종소리는 마디가 있다’(고요아침)를 펼치자, 다채로운 소리가 들려온다. “내 주변에서 함께 듣고 함께 울었던 소리들을 모아 거침없이 썼던 것 같다”는 말에서 이번 작품집의 창작 배경이 대략 가늠이 된다.
시인은 첫 시조집에서부터 소리에 천착했다. 일상의 소리, 자연의 소리,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매개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입히는 작업을 해왔던 것.
표제시 ‘종소리에는 마디가 있다’는 사물을 섬세하게 관찰해 울림이 있는 시어로 형상화했다. 종소리에서 ‘마디’를 읽어내는 감성고 사유는 읽는 이에게 ‘보고, 듣는’ 맛을 선사한다.
“몰락한 그곳에서 또 몰락은 시작된다/ 언덕 위 교회당에 우연히 도착할 무렵/ 휘어진 소나무 위로 은행잎이 떨어지고// 종탑은 노란 물결을 지그시 바라본다/ 지켜 온 모든 것이 바람에 쓸려가도/ 가을을 탓할 수 없다 마음이 헐어간다// 천 번의 매질에도 깊게 울었던 종은/ 절대, 라는 소리를 위해 자신을 내리치고/ 스스로 듣지 못하는 마디를 갖고 있다”(‘종소리에는 마디가 있다’ 전문)
화자는 폐허의 언덕에 자리한 교회당 종탑을 보며 수많은 매질을 견뎌냈을 종을 생각한다. “마음이 헐어간다”는 표현에서 종의 일대기가 짐작된다. “천번의 매질에도 깊게 울었던” 그 마음은 기실 화자의 마음이었을 터다. 아니 그 쓸쓸한 종탑을 바라보며 지나쳐야 했을 뭇 사람들의 허허로운 마음도 담겨 있을 것이다.
박영주 강릉원주대 명예교수는 “여기에서의 ‘마디’는 외마디 비명의 마디이자 악보 한 소절의 마디”라며 “중층적 복합적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고통과 반복과 전환의 은유”라고 평했다.
그동안 시인은 창작을 위해 남모를 ‘사투’를 벌여왔다. “제 방이 책과 종이와 다 쓴 볼펜심으로 가득하다”는 표현은 저간의 여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창작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다. 맞춤한 시어를 골라내고, 정연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은 문인이면 감당해야 할 원초적인 고통이다. “때로는 다투고 조여오는 손길에 옴짝달짝 못한 채 며칠씩 대치하면서 지내기도 했다”는 말에서 간단치 않은 창작의 과정이 그려졌다.
최 시인은 동인지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문학의 길을 가는 동료들과 작품을 매개로 소통하며, 성취와 성장을 도모해왔다. 고교 1학년 때 전남학생시조협회에 친구 따라갔다가 시조에 입문한 것이 오늘의 시인의 길로 이어졌다.
“남도규수문학동인회, 우리시, 사래시, 세계시조시인포럼, 한국여성시조문학회, 열린시학회, 반전, 율격, 후조, 광주문학아카데미 등등 자의반 타의반 활동을 해 온 것 같아요. 개인 사정으로 꽤 오랫동안 시조 곁을 떠나 있었는데 문우들이 기다려준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의지처가 되어주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가 더더욱 시조를 쓰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길을 꾸준히 갈 생각이다. “시조는 제 몸이며 밥이고 제안에 흐르는 피”라며 “한 편 한 편 써갈 때의 진통은 있으나 시조가 있어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것 같다”고 시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최 시인은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9년 ‘열린시학’으로 등단했다. 중등학교 국어교사로 활동했으며 시조집 ‘활짝, 피었습니다만’ 등을 펴냈으며 시조시학상, 열린시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