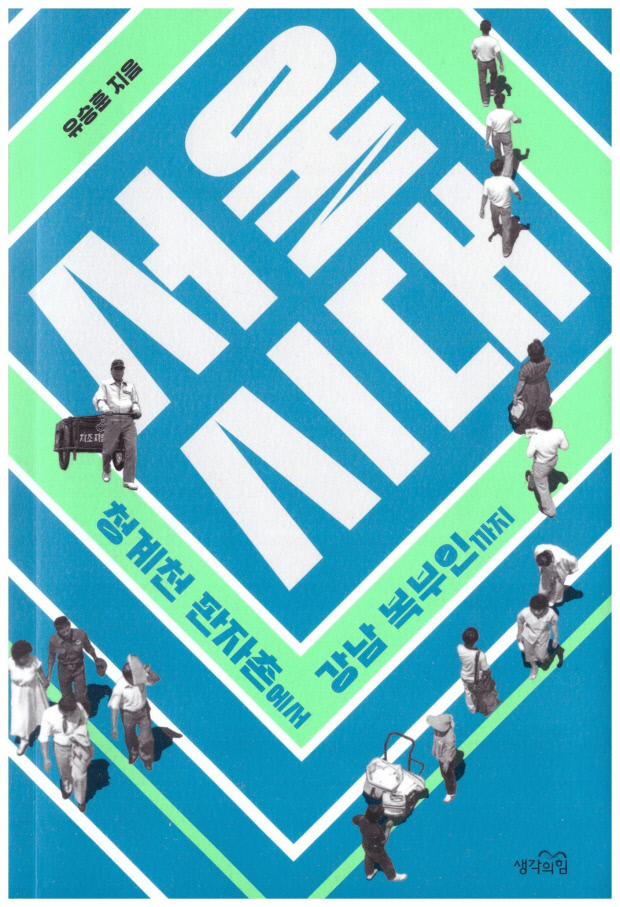1960~90년대 성장·개발 시대, 서울의 자화상
2025년 03월 09일(일) 16:40 가가
서울시대 유승훈 지음
“도시화 시절, 온몸으로 부딪치며 서울 시대를 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급속히 잊히는 것이 아쉬웠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시대를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민속학자인 유승훈 박사(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팀장)는 ‘거시사에 역사의 안방을 내주고 건넌방에 조용히 앉아있는 미시적 풍속’에 관심을 둔다. 신간 ‘서울 시대’에 담긴 왕십리 똥파리와 기생충, 판자촌과 달동네, 연탄, ‘손 없는 날’과 아파트살이, 만원버스와 ‘자동차 고사(告祀)’, ‘콩나물 교실’ 등이다. 이는 1960년대 산업화 물결을 타고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벌어지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서울 태생인 저자는 신간 프롤로그에서 “이 책은 산업화 시절 서울의 자화상이거니와, 동시대를 겪은 나에게도 젊은 시절의 자화상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힌다. 서울을 무대로 다이내믹하게 변했던 1960~1990년대 시기를 저자는 ‘서울 시대’(Seoul Period)라고 이름 붙였다. ‘서울 시대’는 한국전쟁 이후 너도 나도 서울로 상경하던 시절이었고, 산업화·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또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시절이었다.
저자는 크게 1부 ‘서울 시대: 생겨난 풍속, 사라진 풍속’, 2부 ‘서울살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3부 ‘서울내기: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일상’으로 나눠 1960~1990년대 서울살이와 공간의 변화상을 기록한다. 인분이 채소 농사를 짓는 거름으로 활용되던 시절, ‘왕십리 똥파리’라는 말이 어떠한 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등 저자가 들려주는 불과 30~60년 전 서울의 시대상은 새롭고 흥미롭다. 60명 정원인 초등학교 한 교실에 104명을 수용하기도 했던 ‘콩나물 교실’은 ‘나홀로’ 입학도 하는 요즘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저자는 판자촌과 달동네, 아파트 등 서울의 주거공간 변화를 세밀하게 살핀다. 농촌을 떠나 상경한 농민들은 청계천과 양동, 이촌동 등 판자촌을 보금자리로 삼았다. 저자는 “판잣집은 한국전쟁 시절, 폐허와 고통의 시대에 탄생한 발명품이었다”면서 “판자촌 거주민의 네트워크는 생업의 연결망이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쫓겨난 서민들은 ‘달동네’로 불리는 외곽 산등성이로 올라가야 했다. 서민들의 셋방살이 등으로 인해 이사가 많았던 1970년대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시대였다. 서울 100만 가구 가운데 4%(1972년)가 아파트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사하는 날은 여전히 ‘손 없는 날’(음력 9, 0일)을 택했다. 강남 개발과 부동산 열풍에 따라 ‘강남 복부인’이 등장한 때도 1970년대 후반이다. 민속학자인 저자는 아파트 추첨 당시 도당굿 제관을 뽑을 때와 마찬가지로 은행 알을 사용한 것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저자는 산업화 시절, 새로 등장한 풍속인 ‘자동차 고사’와 한국 초등교육의 바로미터인 ‘콩나물 교실’ 등을 통해 당시의 교통·교육문제를 들여다본다. 또한 시대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결혼 풍속과 가족계획 정책, 출산과 장례 등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제는 풍속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1960~1990년대 서울살이의 나이테는 한국 현대사 그 자체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115장의 자료사진과 함께 민속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저자의 애정 어린 눈길로 인해 서울내기들의 땀과 눈물, 분투(奮鬪)를 더욱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2012년)과 같이 ‘민속과 풍속, 풍속과 유행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저자의 다음 저술을 기대한다. <생각의힘·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민속학자인 유승훈 박사(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팀장)는 ‘거시사에 역사의 안방을 내주고 건넌방에 조용히 앉아있는 미시적 풍속’에 관심을 둔다. 신간 ‘서울 시대’에 담긴 왕십리 똥파리와 기생충, 판자촌과 달동네, 연탄, ‘손 없는 날’과 아파트살이, 만원버스와 ‘자동차 고사(告祀)’, ‘콩나물 교실’ 등이다. 이는 1960년대 산업화 물결을 타고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벌어지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서울 태생인 저자는 신간 프롤로그에서 “이 책은 산업화 시절 서울의 자화상이거니와, 동시대를 겪은 나에게도 젊은 시절의 자화상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힌다. 서울을 무대로 다이내믹하게 변했던 1960~1990년대 시기를 저자는 ‘서울 시대’(Seoul Period)라고 이름 붙였다. ‘서울 시대’는 한국전쟁 이후 너도 나도 서울로 상경하던 시절이었고, 산업화·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또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시절이었다.
  |
| 한국 농업인구는 농촌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에 따라 1970년 46%에서 1980년 29%로 떨어졌다. 이농민들을 흡수했던 청계천 판자촌 내 골목길 풍경. <서울역사 아카이브 제공> |
이제는 풍속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1960~1990년대 서울살이의 나이테는 한국 현대사 그 자체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115장의 자료사진과 함께 민속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저자의 애정 어린 눈길로 인해 서울내기들의 땀과 눈물, 분투(奮鬪)를 더욱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2012년)과 같이 ‘민속과 풍속, 풍속과 유행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저자의 다음 저술을 기대한다. <생각의힘·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