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의 원사(原絲)는 ‘비애’, 그 실을 감는 게 저의 시 쓰기입니다”
2024년 03월 04일(월) 17:30 가가
영암 출신 조정 시인 시집 ‘마법사의 제자들아 껍질을 깨고 나와라’ 펴내
“문학의 원사(原絲)는 ‘비애’입니다. 공중이나 풀밭이나 사람들 눈 속에 커다란 실 뭉치가 공처럼 던져져 있고, 저는 그 끝을 붙들게 돼요. 그 실을 감는 게 제 시 쓰기인데 원사가 ‘비애’더군요.”
영암 출신 조정 시인은 시 쓰기를 그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많은 시인들이 정의한 시 쓰기와는 다른 느낌을 환기한다. ‘비애’라는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조 시인은 지난 2022년 시집 ‘그라시재라’로 제22회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어린 시절 동네 어귀에서 들었던 할머니, 어머니의 말 등을 토대로 울림있는 시를 창작했다. 작품이 모두 전라도 방언으로 돼 있어서 이색적인데다 구성진 전라도 말이 오래도록 여운을 줬다.
조 시인이 얼마 전 시집 ‘마법사의 제자들아 껍질을 깨고 나오라’(이소노미아)를 펴냈다.
굳이 분류하자면 저항 정신을 계승한 ‘참여시’이자 ‘생태시’의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아마도 시인이 말한 ‘비애’와 맞닿는 말인 듯하다.
그는 “박세당 선생이 노자를 해석한 문장 중에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을 내가 모르고 내가 죽은 후의 일을 내가 모른다’는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곳’뿐이지요”라고 작가의 말에서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곳조차 장악하지 못하는 무력감, 내 존재의 허랑함에 대한 당혹,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인간계의 부조리에 대한 조절의지 같은 것들이 제 문학의 베틀에 얹히는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시집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춘분위 갈채’, ‘쓸쓸하게 바삭거리는 미농지처럼’, ‘측간을 위하여’ 등 조정 시인만이 구사할 수 있는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깊이와 감성, 비유, 독자를 현장으로 초대하는 이입의 힘 등은 여느 시인의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골프장 쪽 둔덕을 내려온 초록색 뱀은/ 내 오른손 검지를 스쳐/ 오엽딸기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산길에 떨어진 골프공을 줍던 나도 놀라고 비탈을 흐르던 저도 놀라고/ 야생이 스쳐간 손에 뱀 비린내가 돋아/ 슬픔이 독처럼 몸에 퍼졌다/ 직립의 슬픔과 배로 기는 슬픔이 서로 감염되어/ 산에 슬픔이 가득했다(중략)/ 허물 한 채에 적힌 결승문자를 받아 읽었다/ 숲이 커야/ 사람도 슬픔을 벗을 수 있다고”
‘허물’이라는 작품은 한편의 짤막한 서사를 담고 있다. 산길을 걷다 땅에 떨어진 골프공을 줍는데, 때마침 골프장 둔덕을 내려온 뱀이 손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직립의 슬픔과 배로 기는 슬픔이 서로 감염되어” 온 산에 가득한 슬픔을 느끼는 화자는 “숲이 커야 사람도 슬픔을 벗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신화적 상상력과 현실적 감각이 빚어낸 울림이 오래도록 전해진다.
이소노미아의 정우성은 “민주주의를 농약치듯 악용하는 인간들에 맞서 숲을 지켜낸 시민들의 이야기를, 옥수수와 솔부엉이와 맹꽃이와 상수리나무와 힘없고 연약한 마을사람들이 연대하는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잃어버린 우리말의 춤을 꺼내놓았습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조 시인은 200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이발소 그림처럼’ ‘그라시재라’ 동화 ‘너랑 나랑 평화랑’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암 출신 조정 시인은 시 쓰기를 그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많은 시인들이 정의한 시 쓰기와는 다른 느낌을 환기한다. ‘비애’라는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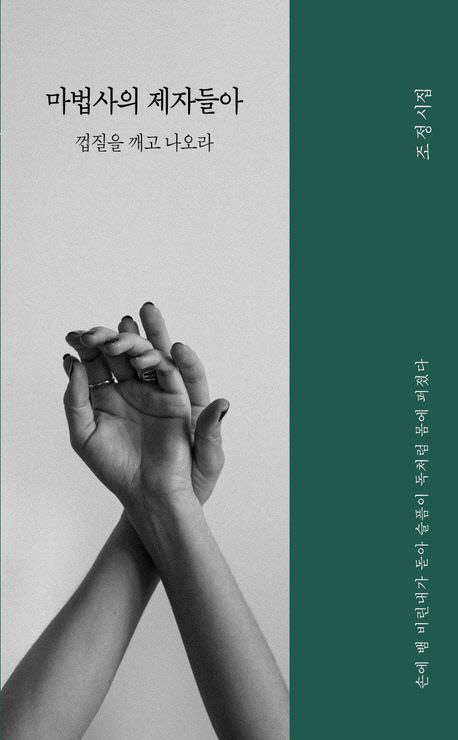  |
그는 “박세당 선생이 노자를 해석한 문장 중에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을 내가 모르고 내가 죽은 후의 일을 내가 모른다’는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곳’뿐이지요”라고 작가의 말에서 언급했다.
시집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춘분위 갈채’, ‘쓸쓸하게 바삭거리는 미농지처럼’, ‘측간을 위하여’ 등 조정 시인만이 구사할 수 있는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깊이와 감성, 비유, 독자를 현장으로 초대하는 이입의 힘 등은 여느 시인의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골프장 쪽 둔덕을 내려온 초록색 뱀은/ 내 오른손 검지를 스쳐/ 오엽딸기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산길에 떨어진 골프공을 줍던 나도 놀라고 비탈을 흐르던 저도 놀라고/ 야생이 스쳐간 손에 뱀 비린내가 돋아/ 슬픔이 독처럼 몸에 퍼졌다/ 직립의 슬픔과 배로 기는 슬픔이 서로 감염되어/ 산에 슬픔이 가득했다(중략)/ 허물 한 채에 적힌 결승문자를 받아 읽었다/ 숲이 커야/ 사람도 슬픔을 벗을 수 있다고”
‘허물’이라는 작품은 한편의 짤막한 서사를 담고 있다. 산길을 걷다 땅에 떨어진 골프공을 줍는데, 때마침 골프장 둔덕을 내려온 뱀이 손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직립의 슬픔과 배로 기는 슬픔이 서로 감염되어” 온 산에 가득한 슬픔을 느끼는 화자는 “숲이 커야 사람도 슬픔을 벗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신화적 상상력과 현실적 감각이 빚어낸 울림이 오래도록 전해진다.
이소노미아의 정우성은 “민주주의를 농약치듯 악용하는 인간들에 맞서 숲을 지켜낸 시민들의 이야기를, 옥수수와 솔부엉이와 맹꽃이와 상수리나무와 힘없고 연약한 마을사람들이 연대하는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잃어버린 우리말의 춤을 꺼내놓았습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조 시인은 200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이발소 그림처럼’ ‘그라시재라’ 동화 ‘너랑 나랑 평화랑’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