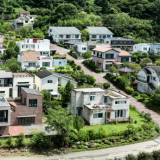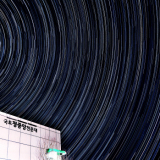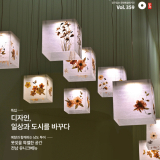어느 쓸쓸한 그림이야기 - 안민영 지음
2023년 08월 19일(토) 12:00 가가
이념의 굴레에 갇혀 잊혀진 ‘경계의 화가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 어느 날, 한 40대 화가가 붓을 잡고 아내와 어린 남매를 모델로 그림을 그린다. 그림속 흰 저고리와 푸른 치마 차림을 한 아내는 곤히 잠든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있고, 딸은 탁자에 턱을 받친 채 생각에 잠겨있다.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해 시작된 작품 ‘가족’은 끝내 미완성으로 남았다. 화가가 같은 해 9월에 북으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화가 임군홍(1912~1979)의 이야기다. 아들은 “나에게 ‘화가 임군홍’은 있지만, ‘아버지 임군홍’은 그때부터 없었다”고 말한다. 화가 가족은 경제적·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작품들을 오롯이 지켰다.
‘경계의 화가들을 찾아서’라는 부제를 붙인 안민영 작가의 ‘어느 쓸쓸한 그림이야기’는 월북 화가(이쾌대·임군홍·김용준)와 고려인 화가(변월룡·신순남), 재일조선인 화가(전화황), 남한에서 태어나 북한과 유럽에서 활동한 화가(박경란·이응노), 5·18민주화운동과 양심수 등을 작품화한 일본 화가(도미야마 다에코)를 중심에 둔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잊혔거나, 존재했으나 보이지 않았던 미술가들”, “한반도에서 살지 않았으나 우리 역사의 한편에 있는 이들”에게 ‘경계의 화가’라는 이름을 붙였다.
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40대초 연수휴직을 내고 대학원에 들어가 한국 근·현대시기 미술사를 공부했다. 저자는 ‘책을 펴내며’에서 “나에게 미술사공부는 역사 사건과 같은 보통명사를 그 안에 내던져진 인물의 고유명사로 다시 보게 하는 전환점이었다”고 밝힌다.
신간은 지난 2020~2021년 전국 역사교사모임 회보 ‘역사교육’에 연재했던 글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저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국 근·현대미술가들의 흔적을 찾아 발품을 들였다. 미국 국립 문서기록관리청과 의회도서관 등지를 직접 방문하고, 일본 경매사이트와 중국 중고책 사이트를 뒤적이고, 화가 가족을 만나며 ‘읽혀지기를, 들려지기를, 보여지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술작품과 일기, 편지 등 많은 자료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이쾌대의 ‘3·1봉기’(1959년 작)와 박경란의 ‘딸’(1957년 작)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다.
또한 독자들은 화가 이쾌대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보낸 편지, ‘동백림 사건’으로 투옥된 고암 이응로가 ‘가장 춥고 괴롭던 날’에 그린 수묵작품 ‘자화상’(1968년 작) 등을 통해 이념의 굴레에 갇힌 ‘경계의 화가’들의 인간적 면모와 함께 작가적 고뇌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남과 북 어느 역사에도 기록되지 못한’ 화가 변월룡은 우리 역사의 디아스포라를 상징한다. 신순남(신니콜라이)의 ‘진혼제, 이별의 촛불, 붉은 무덤’ 연작은 1937년 연해주에서 6400㎞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해야했던 ‘몸으로 겪어낸 한국사의 생채기’를 고스란히 담았다.
독립운동가(박창빈)의 딸인 화가 박경란은 소련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평양미술대학 최초의 여성 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뒷날 북한 미술계는 ‘평범한 가정 주부로 전락한 유학생 여성’이라는 저평가를 내렸다. 저자는 박경란의 작품 ‘딸’을 설명하며 “누군가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응노의 ‘군상’과 도미야마 다에코의 ‘광주의 피에타’ 이야기가 독자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도미야마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뉴스로 본 후 ‘죄어드는 심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판화 연작인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를 제작했다고 한다. 식민과 해방, 분단, 독재, 디아스포라를 겪은 ‘경계의 화가’들의 삶의 궤적은 그대로 한국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빈칸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이제는 포용해야 할 때다.
<빨간소금·1만7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또한 독자들은 화가 이쾌대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보낸 편지, ‘동백림 사건’으로 투옥된 고암 이응로가 ‘가장 춥고 괴롭던 날’에 그린 수묵작품 ‘자화상’(1968년 작) 등을 통해 이념의 굴레에 갇힌 ‘경계의 화가’들의 인간적 면모와 함께 작가적 고뇌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남과 북 어느 역사에도 기록되지 못한’ 화가 변월룡은 우리 역사의 디아스포라를 상징한다. 신순남(신니콜라이)의 ‘진혼제, 이별의 촛불, 붉은 무덤’ 연작은 1937년 연해주에서 6400㎞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해야했던 ‘몸으로 겪어낸 한국사의 생채기’를 고스란히 담았다.
독립운동가(박창빈)의 딸인 화가 박경란은 소련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평양미술대학 최초의 여성 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뒷날 북한 미술계는 ‘평범한 가정 주부로 전락한 유학생 여성’이라는 저평가를 내렸다. 저자는 박경란의 작품 ‘딸’을 설명하며 “누군가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응노의 ‘군상’과 도미야마 다에코의 ‘광주의 피에타’ 이야기가 독자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도미야마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뉴스로 본 후 ‘죄어드는 심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판화 연작인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를 제작했다고 한다. 식민과 해방, 분단, 독재, 디아스포라를 겪은 ‘경계의 화가’들의 삶의 궤적은 그대로 한국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빈칸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이제는 포용해야 할 때다.
<빨간소금·1만7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