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시대, 중세 - 매슈 게이브리얼 외 지음·박수철 옮김
2023년 08월 05일(토) 09:00 가가
‘암흑의 시대’ 중세를 빛낸 ‘빛’의 재발견
“독자여, 나와 함께 눈을 들어 저 높은 바퀴들을 보라. … 염원을 담아 그 대가(大家)의 예술을 바라보기 시작하라.”
14세기, 이탈리아 동부에 자리한 도시 라벤나의 조그만 예배당에 앉아 천장 스테인드글라스를 올려다보는 50대 망명객을 상상해보라. 430년께 아들 대신 서로마제국을 섭정한 갈라 플라키디아 황후를 위해 지어진 ‘산 비탈레 성당’이다. 성당 천장에는 유리 테세라(청금석의 푸른색이 가득 스며든 사다리꼴 모양의 작은 유리 조각들)와 금빛 유리조각들로 성인과 푸른 하늘, 금빛 별들이 모자이크돼 있었다. 성당이 지어진 지 1000여 년 후 찾은 망명객은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이탈리아 토착어인 토스카나어로 장편 서사시 ‘신곡’(神曲)을 썼다. 망명객은 바로 단테 알리기에리(1265~1321)였다.
1차 사료와 씨름하며 중세유럽을 연구하는 역사가 매슈 게이브리얼와 데이비드 M. 페리는 흔히 ‘암흑시대’라고 하는 중세를 ‘빛의 시대’라고 재해석한다. ‘폭력과 아름다움, 문명과 종교가 교차하던 중세 이야기’를 찾아 나선 그들의 대장정은 라벤나 ‘산 비탈레 성당’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두 저자는 중세기를 관통하는 ‘빛’에 주목한다. ‘로마제국과 기독교의 장엄함이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설치한 모자이크를 비롯해 금지된 책을 태우는 ‘분서’(焚書), 성스러운 유물의 ‘금빛’ 등이다. 1241년 6월, 파리 그레브 광장에서 손수레 20대 분량의 ‘탈무드’가 불태워졌다. 이를 지켜본 유대교 율법학자 마이어의 “나와 그대를 어둠에 빠뜨린다”는 개탄처럼 690여 년 뒤 1933년 나치정권에 의해 그대로 재연됐다.
저자들은 라벤나와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파리, 피렌체 등 주요 도시, 갈라 플라키디아 황후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모세(마이모니데스), 바이킹, 루이 9세, 징기스칸 등 중요인물, 유명 사건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중세라는 다채로운 비단을 짜낸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가 공존하던 중세 이베리아 반도를 살펴보며 ‘콘비벤시아’(Convivencia·‘함께 산다’는 의미)와 ‘레콩키스타’(Reconquista·재정복)에 주목한다. 중세는 맹신과 폭력, 무지, 재앙의 암흑시대가 결코 아니었다. 중세인들은 사회적·경제적·종교적·지리적 경계들을 넘나들며 교류했고, ‘인간’이라는 빛을 발견하며 근대로 나아갔다.
신간 ‘빛의 시대, 중세’는 독자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중세를 새롭게 인식하게끔 만든다.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 아프리카를 종횡무진 가로지르는 두 저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대유행병과 종교전쟁을 치르던 중세인들이 겪던 세계는 지금과 놀랍게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들은 맺음말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와 지금 사이, 참상과 희망사이에 적어도 어떤 연대기적 차이를 부여하기 위해서 ‘암흑시대’의 안락함으로 돌아간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강조한다.
“과거는 가능한 세계들을 보여준다. 밝은 길 뿐 아니라 밟지 않은 길까지 보여준다. 바라건대 항상 더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더 밝게 조명되는 중세적 과거의 서사가, 다시 말해서 현실과 가능성 모두를 더욱 잘 부각하는 서사가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앞의 길도 더 많이 드러냈으면 한다.”
<까치·2만1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14세기, 이탈리아 동부에 자리한 도시 라벤나의 조그만 예배당에 앉아 천장 스테인드글라스를 올려다보는 50대 망명객을 상상해보라. 430년께 아들 대신 서로마제국을 섭정한 갈라 플라키디아 황후를 위해 지어진 ‘산 비탈레 성당’이다. 성당 천장에는 유리 테세라(청금석의 푸른색이 가득 스며든 사다리꼴 모양의 작은 유리 조각들)와 금빛 유리조각들로 성인과 푸른 하늘, 금빛 별들이 모자이크돼 있었다. 성당이 지어진 지 1000여 년 후 찾은 망명객은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이탈리아 토착어인 토스카나어로 장편 서사시 ‘신곡’(神曲)을 썼다. 망명객은 바로 단테 알리기에리(1265~132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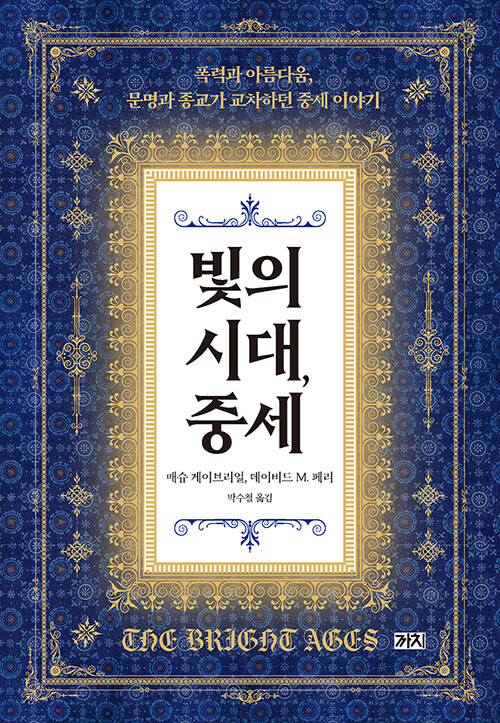  |
신간 ‘빛의 시대, 중세’는 독자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중세를 새롭게 인식하게끔 만든다.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 아프리카를 종횡무진 가로지르는 두 저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대유행병과 종교전쟁을 치르던 중세인들이 겪던 세계는 지금과 놀랍게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들은 맺음말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와 지금 사이, 참상과 희망사이에 적어도 어떤 연대기적 차이를 부여하기 위해서 ‘암흑시대’의 안락함으로 돌아간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강조한다.
“과거는 가능한 세계들을 보여준다. 밝은 길 뿐 아니라 밟지 않은 길까지 보여준다. 바라건대 항상 더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더 밝게 조명되는 중세적 과거의 서사가, 다시 말해서 현실과 가능성 모두를 더욱 잘 부각하는 서사가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앞의 길도 더 많이 드러냈으면 한다.”
<까치·2만1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