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향초대석 -원자에서 인간까지 ‘빅 히스토리’ 엮은 물리학자 김상욱
2023년 07월 31일(월) 19:55 가가
“하늘과 별, 인간… 존재하는 모든 것 이해하고 싶어”


양자역학을 전공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저술과 강연, 방송출연 등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와 대중들의 ‘과학적 사고’를 넓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물리학자의 시각에서 원자에서 인간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에 관한 ‘빅 히스토리’를 썼다.
“물리학자는 우주의 시(詩)에 반한 사람이자 매혹된 상태다.” 양자물리학자 김상욱(53)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수학으로 쓰여 어렵게만 여겨지는 물리학·양자역학을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내는 저술과 강연, 방송출연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와 대중들의 ‘과학적 사고방식’ 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고교 2학년 때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책을 접하고 진로를 정한 그는 ‘경계’를 뛰어 넘어 문학과 철학, 미술, 음악 등 인문학으로 시야를 넓혔다. 최근 물리학자의 시각에서 원자에서 인간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에 관한 빅 히스토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바다출판사)을 펴냈다.
◇“‘빅 히스토리’, 인문학자들이 과학자들에게 말을 건 것”=“이 책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경계를 넘은 물리학자의 좌충우돌 여행기이자,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지도책이다.”
김상욱 교수가 펴낸 신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은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물질의 근원인 ‘원자’에서 문화를 창조하는 생물종 ‘인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룬 ‘빅 히스토리’(Big History·거대사)이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서울캠퍼스 이과대동(‘스페이스21’타워) 김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양쪽 벽면에 부착된 라파엘로의 ‘라 포르나리나’(La Fornarina·제빵사의 딸)와 바실리 칸딘스키, 파블로 피카소 등 10여 장의 명화 포스터가 첫 눈에 들어왔다. 또한 한쪽 벽면에는 수식으로 가득 채워진 화이트보드가, 천장에는 자그마한 원자모형이 매달려 있었다. 물리학과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김 교수의 연구 공간은 앞서 출간한 책 제목 그대로 ‘뉴턴의 아틀리에’를 연상시켰다.
▲지난 2020년 내신 ‘뉴턴의 아틀리에’(민음사) 이후 만 3년 만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을 선보이셨습니다. 원자에서 인간에 이르는 장구한 여정을 ‘빅 히스토리’로 어떻게 서술하셨나요?
“‘빅 히스토리’라는 건 사실 인문학자들이 과학자들한테 말을 건 것 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뭔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자의 시선을 벗어날 수는 없죠. 물리학의 시각으로 가능한 모든 걸 설명해보자는 식으로 쓰지 않고, 물리학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 가서 한번 말을 걸어보는 느낌으로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물리학자가 생물학을 거닐면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런 점들이 궁금하고, 생명이라는 건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원자에서 인간에 이르는 ‘빅 히스토리’ 중간 중간마다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낸 궁극의 상상력’(신), ‘원자의 소멸이 아니라 원자의 재배열’(죽음), ‘물리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필연의 우주에서 너를 만난 이 사건은 내가 아는 유일한 우연’(사랑) 등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신(神)과 죽음, 사랑에 관해 쓴 에세이와 ‘외계에서 온 외계 동물학자의 눈으로 본 호모사피엔스 연구보고서’가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내용은) 약간 각을 잡고 쓴 거라 딱딱하고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까, 정공법으로 쓴 거를 다시 고치기보다는 중간 중간에 쉬어가는 에세이 같은 글을 넣으면 어떨까, 하나씩 넣어봤죠. ‘죽음’은 같이 원자를 연구했던 분을 추모하며 쓴 것인데, 원자는 불멸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생각이 떠오른 대로 쓴 것인데, 과학적으로는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인간’을 다루는 4부에서 “인간은 상상을 통해 인간만의 문화를 만들었고, 문화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유동물이 되었다”면서 “문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날,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인간 진화과정에서 ‘문화’는 왜 중요한가요?
“인간이 침팬지 영장류와 겉모습은 비슷한데 뭔가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층위를 달리하면 새롭게 창발(創發)된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은 인간의 ‘상상’입니다. 인간의 ‘상상’이 처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동굴벽화이거든요. 생물학적인 겉모습이 ‘호모 사피엔스’가 된 것은 35만 년 전, 프랑스 쇼베 동굴벽화가 그려지던 그 즈음에 비로소 인간이 된 시점이라고들 말하는 ‘인지혁명’(5만 년 전)이 뇌에서 일어납니다. 종교, 정치제도, 사회체제, 도덕, 문화·예술… 모두 상상의 산물입니다. 이것(상상)이야말로 인간이 갖는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게 왜 있는지 모른다고 전 생각해요. 여전히 인간의 문화에는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알게 될 테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이 거기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물은 원자로 되어있다”=김상욱 교수는 양자역학(量子力學)을 전공한 물리학자이다. 항상 그의 이름 앞에는 ‘철학하는 과학자’ ‘다정한 물리학자’ ‘미술을 좋아하는 물리학자’ ‘미술관에서 과학을 보는 물리학자’ ‘예술을 사랑하는 물리학자’ ‘스타 물리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만큼 물리와 함께 미술, 예술 등에 대한 열정이 지대함을 보여준다. 연구년을 맞아 일본 도쿄에 머무를 때 살바도르 달리 특별전을 찾았다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으로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한다.
물리학자 시각에서 ‘1920년대, 유럽’이라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탄생한 양자역학과 초현실주의 회화 사이의 연관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김 교수와 유지원 타이포그래피연구자가 함께 펴낸 ‘뉴턴의 아틀리에’(2020년)에 실린 ‘친애하는 마그리트 작가님께’라는 제목의 편지글에서 하나의 장면 속에 낮과 밤이 공존하는 작품 ‘빛의 제국2’(1950년 작)을 ‘양자 중첩’으로 해석하며 이렇게 끝맺음한다.
“1920년대 유럽이라는 시공간은 양자역학과 초현실주의를 동시에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사건이 2020년대 한반도라는 시공간에서 다시 한 번 일어나길 기대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 사고방식’이 중요=김상욱 교수는 미래 한국 물리학계를 이끌 동량(棟樑)을 키우는 교수이면서 저술과 강연, 방송출연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 저술가’,‘과학 커뮤니케이터’이다. 무엇보다 수학으로 쓰인 물리학, 또는 양자역학의 세계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언어로 고쳐서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러한 대중적 활동은 단순한 과학지식의 전달이 아닌 ‘과학의 대중화’와 대중들의 ‘과학적 사고’를 넓히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김상욱의 과학 공부’(2016년)에서 소개한 데릭 시버스의 TED 강연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강연 요지는 ‘첫 번째 춤추는 남자를 따라 두 번째 사람이 용기를 내 춤을 출 때 의미를 가진 행위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자연스럽게 ‘과학적 태도’와 ‘과학적 사고방식’이란 무엇인지로 귀결됐다.
“저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물질적 증거에만 기반을 둬 결론을 내리는 것을 ‘과학적 태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과학의 정확한 모습을 사회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팩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과학이 작동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과학은 귀납법이고, 의심에 대한 답을 쌓아가는 겁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확률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신뢰받는 데이터가 없으면 과학은 아무 말도 못해요. 리스크를 감당할지 안 할지는 정치가 하는 건데, 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거죠. 과학이 준 불확실성에 대한 지표(데이터)를 놓고 사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글=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김상욱 교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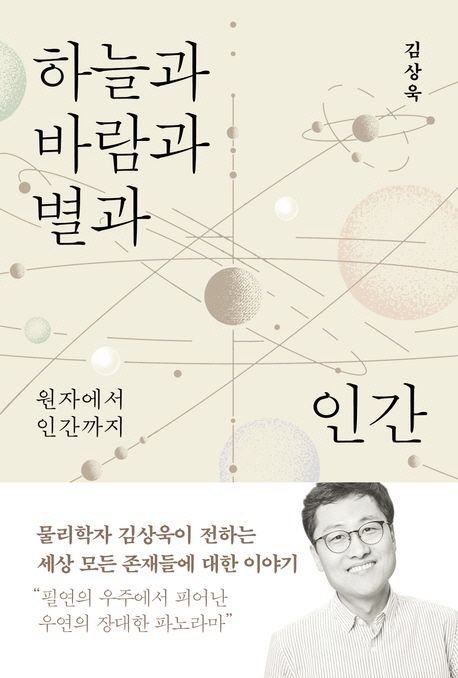  |
| 최근 펴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
“‘빅 히스토리’라는 건 사실 인문학자들이 과학자들한테 말을 건 것 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뭔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자의 시선을 벗어날 수는 없죠. 물리학의 시각으로 가능한 모든 걸 설명해보자는 식으로 쓰지 않고, 물리학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 가서 한번 말을 걸어보는 느낌으로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물리학자가 생물학을 거닐면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런 점들이 궁금하고, 생명이라는 건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원자에서 인간에 이르는 ‘빅 히스토리’ 중간 중간마다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낸 궁극의 상상력’(신), ‘원자의 소멸이 아니라 원자의 재배열’(죽음), ‘물리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필연의 우주에서 너를 만난 이 사건은 내가 아는 유일한 우연’(사랑) 등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신(神)과 죽음, 사랑에 관해 쓴 에세이와 ‘외계에서 온 외계 동물학자의 눈으로 본 호모사피엔스 연구보고서’가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내용은) 약간 각을 잡고 쓴 거라 딱딱하고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까, 정공법으로 쓴 거를 다시 고치기보다는 중간 중간에 쉬어가는 에세이 같은 글을 넣으면 어떨까, 하나씩 넣어봤죠. ‘죽음’은 같이 원자를 연구했던 분을 추모하며 쓴 것인데, 원자는 불멸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생각이 떠오른 대로 쓴 것인데, 과학적으로는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
| tvN 예능 ‘알쓸인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잡학사전)에서 진화론에 대해 얘기하는 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 |
“인간이 침팬지 영장류와 겉모습은 비슷한데 뭔가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층위를 달리하면 새롭게 창발(創發)된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은 인간의 ‘상상’입니다. 인간의 ‘상상’이 처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동굴벽화이거든요. 생물학적인 겉모습이 ‘호모 사피엔스’가 된 것은 35만 년 전, 프랑스 쇼베 동굴벽화가 그려지던 그 즈음에 비로소 인간이 된 시점이라고들 말하는 ‘인지혁명’(5만 년 전)이 뇌에서 일어납니다. 종교, 정치제도, 사회체제, 도덕, 문화·예술… 모두 상상의 산물입니다. 이것(상상)이야말로 인간이 갖는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게 왜 있는지 모른다고 전 생각해요. 여전히 인간의 문화에는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알게 될 테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이 거기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물은 원자로 되어있다”=김상욱 교수는 양자역학(量子力學)을 전공한 물리학자이다. 항상 그의 이름 앞에는 ‘철학하는 과학자’ ‘다정한 물리학자’ ‘미술을 좋아하는 물리학자’ ‘미술관에서 과학을 보는 물리학자’ ‘예술을 사랑하는 물리학자’ ‘스타 물리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만큼 물리와 함께 미술, 예술 등에 대한 열정이 지대함을 보여준다. 연구년을 맞아 일본 도쿄에 머무를 때 살바도르 달리 특별전을 찾았다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으로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한다.
물리학자 시각에서 ‘1920년대, 유럽’이라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탄생한 양자역학과 초현실주의 회화 사이의 연관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김 교수와 유지원 타이포그래피연구자가 함께 펴낸 ‘뉴턴의 아틀리에’(2020년)에 실린 ‘친애하는 마그리트 작가님께’라는 제목의 편지글에서 하나의 장면 속에 낮과 밤이 공존하는 작품 ‘빛의 제국2’(1950년 작)을 ‘양자 중첩’으로 해석하며 이렇게 끝맺음한다.
“1920년대 유럽이라는 시공간은 양자역학과 초현실주의를 동시에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사건이 2020년대 한반도라는 시공간에서 다시 한 번 일어나길 기대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
|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작품 앞에서. |
마지막으로 ‘김상욱의 과학 공부’(2016년)에서 소개한 데릭 시버스의 TED 강연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강연 요지는 ‘첫 번째 춤추는 남자를 따라 두 번째 사람이 용기를 내 춤을 출 때 의미를 가진 행위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자연스럽게 ‘과학적 태도’와 ‘과학적 사고방식’이란 무엇인지로 귀결됐다.
“저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물질적 증거에만 기반을 둬 결론을 내리는 것을 ‘과학적 태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과학의 정확한 모습을 사회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팩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과학이 작동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과학은 귀납법이고, 의심에 대한 답을 쌓아가는 겁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확률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신뢰받는 데이터가 없으면 과학은 아무 말도 못해요. 리스크를 감당할지 안 할지는 정치가 하는 건데, 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거죠. 과학이 준 불확실성에 대한 지표(데이터)를 놓고 사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글=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김상욱 교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