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건축기행]<44>전주 학산숲속시집도서관
2025년 10월 27일(월) 19:25 가가
책을 접어 놓은 듯 숲속 도서관…오늘 나는 詩人이라네
나무 피해 기둥 세우고 저수지 향해 큰 창 내고
숲과 책, 햇살과 바람이 어우러진 감성 도서관
도시의 분주함 속 ‘쉼표’ 선사하는 공공건축의 모범
나무 피해 기둥 세우고 저수지 향해 큰 창 내고
숲과 책, 햇살과 바람이 어우러진 감성 도서관
도시의 분주함 속 ‘쉼표’ 선사하는 공공건축의 모범
  |
| 전주 ‘학산숲속시집도서관’내부전경. /전북일보=조현욱 기자 |
◇개인의 사색에서 마을의 무대로=낭독회와 워크숍이 열리는 날, 공간은 또 다른 리듬을 얻는다. 시인의 목소리와 숲의 속삭임이 겹치면, 읽기는 개인의 내면을 넘어 공동의 사건이 된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르신의 조용한 미소, 청소년의 집요한 시선이 한데 모여 도서관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을 잇는 작은 광장이 된다. 관광객은 풍경을, 시민은 일상을 찾아오고, 도서관은 두 부류의 시간을 한 지붕 아래 포개 둔다. 특화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큐레이션, 계절 프로그램과 필사·낭독 모임,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이 이어지며 ‘숲속 시집도서관’은 전주의 문화적 자존감과 시민적 친밀감을 동시에 키운다.
공공건축의 미덕은 과장보다 배려에 있다. 이 도서관은 ‘작음’으로 충분함을 증명한다. 많은 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되, 필요한 것을 분명히 한다. 독자의 키와 속도, 숲의 결과 빛의 각도를 헤아리며, 장면 하나하나에 체류의 이유를 만들어 둔다. 그래서 이곳의 체험은 건물의 외양보다 오래 남는다. 창가에 앉아 시집을 한 장 넘길 때, 방문자는 ‘읽는 사람’에서 ‘머무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으로 천천히 변한다.
◇경험의 연속으로 완성된 도서관= 도시는 건물의 밀도가 아니라 경험의 연속으로 완성된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그 경험을 설계한 장소다. 숲길을 따라 오르던 호흡이 실내에서 고르고, 창밖의 계절이 책속의 문장과 만나며, 독자의 하루가 조금 느려진다. 작은 공공건축이 도시의 삶을 바꾸는 방식은 늘 비슷하다. 과하게 주장하지 않고, 반복 가능한 모범을 남기는 것. 숲과 시를 묶어낸 이 ‘한 권의 집’은 공공건축이 어디까지 친밀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조용히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끝내 이 건축이 남기는 인상은 장엄함이 아니라 다정함이다. 숲을 해치지 않으려 비켜 선 자리, 사계절을 통째로 들이는 창, 독자와 어린이를 위해 높낮이를 조절한 바닥. 그 사소한 선택들이 겹쳐 공공의 품격이 된다. 도시가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꼭 거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잘 읽힌 한 권의 집, 잘 앉은 한 줌의 쉼표가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마침내 도시의 문장을 단정히 고쳐 쓴다.
/전북일보=이종호 기자 lee7296@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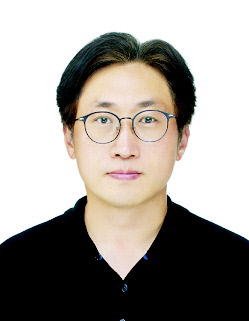  |
육광돈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채담 대표)는 전주신흥고, 전북대 건축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거쳐 2013년 채담을 열었다. 덕진동 연화마을주택, 운암 하루찻집, 코티지683, 나주 마중3917 등 생활 건축에서 간납대도서관·삼천도서관 리모델링·자작자작 책공작소 등 지역 문화시설로 스펙트럼을 넓혔다. 효천LH공중화장실로 전주시 건축상, 부안행안초등학교로 전라북도건축문화상을 받았고,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노송동 천사마을 주민소통공간·부안밀 제빵학교 등 공모를 잇달아 따냈다. 최근 전주 신흥고 구정문 복원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전통과 현대, 도시와 사람, ‘채(棟)와 담(?)’의 관계를 오늘의 건축 언어로 고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