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고, 흔들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뚫어내는 움직임들”
2024년 03월 18일(월) 17:50 가가
장욱 시인 제4회 시산맥창작기금 공모당선시집 '태야의 눈 기억함을 던져라' 펴내
예술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니 시의 본질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다. 새로운 것은 기존의 것들을 부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시인들은 기존의 문법, 기존의 시 세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열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다. 본질적으로 예술은 옛 것과 새 것의 길항관계에서 생명의 ‘싹’이 튼다.
전주기전중 교장을 역임한 장욱 시인이 제4회 시산맥창작기금 공모당선시집 ‘태양의 눈 기억함을 던져라’를 펴냈다. 도서출판 ‘달을 쏘다’에서 발간된 이번 시집은 오민석 평론가의 말대로 “깨고, 흔들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뚫어내는 움직임들”을 시로 구현한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나의 시는 나를 스스로 존재하게 하고, 현재를 부스러뜨리고 영원의 뜰로 끌어가는 구원자이기를 소망한다”며 “나는 흔들림으로 살아 있다. 살아간다”고 전한다.
그의 말대로 이번 작품들에서 “현재를 부스러뜨리”는 열정은 새로움을 향한 에너지로 전이된다.
“내면을 흔들어// 질문하고 답하고 소리치고 내동댕이쳐, 부스러진 껍데기 파편을 버리는 중이다// 비틀린 모서리 핏빛 관절을 못질하여 하나의 의자로 깊이를 파내는, 끙끙 앓는 사랑 망가진 시간 틈에 끼어들어 고뇌와 고심을 앓는 병…”
위 시 ‘의자, 출렁이다’는 “편한 팔걸이와 등받이 높이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새롭게 나아가려는 변신을 상징화한다. 고뇌와 고통이 없을 수 없다.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아픔을 인내하며 화자는 ‘버리고’, ‘부수는’ 일을 감행하는 것이다.
오민석 평론가는 “그에게 있어서 해체는 더 궁극적인 만남을 위한 과정이다. 한 울타리를 부수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세계로 넘어갈 것인가”라며 “그의 시들은 ‘영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한 자기 해체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고 평한다.
한편 장욱 시인은 1992년 문학사상 신인발굴대상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한국예총회장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사랑살이’, ‘겨울 십자가’, ‘두방리에는 꽃꼬리새가 산다’, ‘분꽃 상처 한 잎’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전주기전중 교장을 역임한 장욱 시인이 제4회 시산맥창작기금 공모당선시집 ‘태양의 눈 기억함을 던져라’를 펴냈다. 도서출판 ‘달을 쏘다’에서 발간된 이번 시집은 오민석 평론가의 말대로 “깨고, 흔들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뚫어내는 움직임들”을 시로 구현한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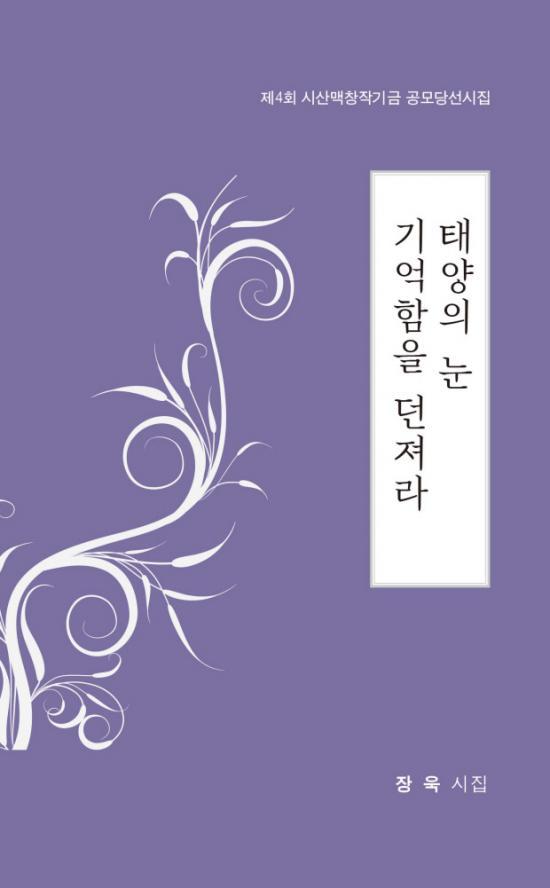  |
“내면을 흔들어// 질문하고 답하고 소리치고 내동댕이쳐, 부스러진 껍데기 파편을 버리는 중이다// 비틀린 모서리 핏빛 관절을 못질하여 하나의 의자로 깊이를 파내는, 끙끙 앓는 사랑 망가진 시간 틈에 끼어들어 고뇌와 고심을 앓는 병…”
위 시 ‘의자, 출렁이다’는 “편한 팔걸이와 등받이 높이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새롭게 나아가려는 변신을 상징화한다. 고뇌와 고통이 없을 수 없다.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아픔을 인내하며 화자는 ‘버리고’, ‘부수는’ 일을 감행하는 것이다.
오민석 평론가는 “그에게 있어서 해체는 더 궁극적인 만남을 위한 과정이다. 한 울타리를 부수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세계로 넘어갈 것인가”라며 “그의 시들은 ‘영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한 자기 해체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고 평한다.
한편 장욱 시인은 1992년 문학사상 신인발굴대상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한국예총회장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사랑살이’, ‘겨울 십자가’, ‘두방리에는 꽃꼬리새가 산다’, ‘분꽃 상처 한 잎’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