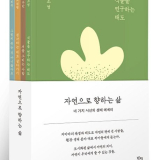‘달멍’ - 유제관 편집담당1국장
2023년 11월 03일(금) 00:00 가가
“잘생긴 부잣집 맏며느리를 보는 흐뭇함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순우의 백자 달항아리 예찬이다. 미술사학자 김원룡은 “이론을 초월한 백의의 미(美)로 이것은 그저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미의 아이콘’인 달항아리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된 시기는 17~18세기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국력이 쇠퇴하던 시기로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추구할 때다. 도공들은 잘 만들겠다는 욕심 없이 무심한 경지로 항아리를 빚어냈다. 물레질로 단번에 뽑아 올리기엔 너무 커 사발 모양 두 개를 위 아래로 붙이고, 구울 때 수축률이 달라져 모양이 일그러져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얗고 커다란 항아리를 조선시대에는 백항(白缸) 백대항(白大缸) 백자대호(白磁大壺)라고 불렀는데 이 무미건조한 이름을 ‘달항아리’로 멋들어지게 바꾼 이는 신안 출신 추상미술의 거장 수화 김환기다. 스스로 ‘달항아리 귀신’이라고 했던 수화는 “단순한 원형이, 순백이, 그렇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미를 발산할 수가 없다. 실로 조형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밤하늘에 둥실 떠 있는 보름달 같은 백자를 열심히 화폭에 옮겼다. 그에게 달은 달항아리였고, 달항아리가 곧 달이었다.
최근 달항아리가 서울옥션 경매에서 34억 원에 낙찰돼 국내에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47.5cm에 달하는 대형 작품으로 담백한 유백색을 띠어 ‘국보급’이라는 평가를 받은 도자기다. 지난 3월에는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45.1cm 높이의 달항아리가 456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에 낙찰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몸값을 자랑했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붓으로 빚은 달항아리도 인기다. 김환기 이후 도상봉, 최영욱 등 많은 화가들이 달항아리를 그렸는데 요즘엔 특히 빙열(잔금)까지 정밀하게 묘사한 극사실화가 곳곳에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불을 바라보며 멍때리는 ‘불멍’처럼 달항아리를 쳐다보며 ‘달멍’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힘들고 외로울 때, 마음이 지쳐있을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보자. 달항아리의 꾸미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이 잔잔한 위로를 줄 것이다.
/jkyou@kwangju.co.kr
‘한국미의 아이콘’인 달항아리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된 시기는 17~18세기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국력이 쇠퇴하던 시기로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추구할 때다. 도공들은 잘 만들겠다는 욕심 없이 무심한 경지로 항아리를 빚어냈다. 물레질로 단번에 뽑아 올리기엔 너무 커 사발 모양 두 개를 위 아래로 붙이고, 구울 때 수축률이 달라져 모양이 일그러져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jk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