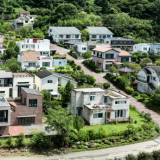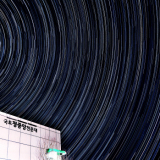광주역사민속박물관·비움박물관에서 만나는 ‘복’
2022년 11월 23일(수) 19:45 가가
12월 18일까지 200여점 전시
예로부터 행복한 삶을 이야기할 때 흔히 ‘오복을 갖추었다’고 한다. 유교 경전인 ‘서경’에는 오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장수를 누리고, 부를 쌓고, 건강하고, 덕을 쌓아 천수를 누리는 것’이다.
옛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 이름을 떨치는 입신양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과거 합격에 대한 열망은 특히 선비의 공간인 사랑방에 투영됐다. 선비가 글공부를 위해 먹을 가는데 쓰였던 벼루는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 문양으로 디자인됐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복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짓는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복을 받기 위한 마음과 선한 행실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시 전통 문화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복도 짓는다는 개념을 상정했다.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는 것처럼 복도 소중한 마음과 언행을 통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복(福)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오는 12월 18일까지 개최하는 ‘福을 짓다’전이 그것.
이번 전시는 다양한 민속품을 전시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해 온 광주 대표 사립박물관인 비움박물관과 공동 주최해 의미를 더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올해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비움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전시는 그 연장선이다.
이번 전시는 비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복과 관련된 민속품광주역사민속박물관·비움박물관 200여점을 소개한다. 다양한 민속품을 매개로 복이 지니는 삶의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 ‘복을 빌다’에서는 복을 비는 일에 주목한 전통사회를 들여다보았다.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나와 가족 그리고 구성원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은 무엇보다 간절한 염원이었다.
대표적인 유물은 조왕중발이다. 가정신 가운데 조왕신은 재물을 담당하는 신이다. 조왕중발은 조왕신을 모시는 그릇으로 부뚜막 뒤에 올려놓았다. 매일 아침 우리네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우물가에 가서 새로 길러온 물을 채웠다.
전시장에는 가내의 평안과 부귀 번영을 가정신들에게 비손하는 것을 ‘성주상’과 ‘삼신상’으로 재현돼 있다.
2부 ‘복을 짓다’는 집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볼 수 있었던 조상들의 복을 바라는 마음에 무게중심을 뒀다.
복과 관련된 글자나 문양이 새겨진 선비의 사랑방 도구와 안방의 세간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식복을 책임지는 부엌의 식기류 등도 만날 수 있다.
안주인의 일상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머릿장은 다복을 상징하는 박쥐문양으로 장식돼 있다. 부엌 찬장에는 복(福) 자가 새겨진 식기류들이 가득했고, 제례와 혼례, 회갑 등 특별한 날에 사용했던 다식판에도 복(福) 자가 새겨져 있다.
태어나면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일생 전반에 걸쳐 찾아오는 다양한 복의 모습들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제3부 ‘복을 받다’는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통과의례를 매개로 복의 의미를 생각하는 코너다.
아기의 장수와 부귀를 염원했던 돌잔치를 비롯해 가문의 번성은 물론 화합을 바랬던 혼례, 부모의 무병장수를 소원하는 회갑례가 그것이다. 아울러 망자의 명복을 빌며 치르는 상례에 나타난 복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도 엿불 수 있다.
특히 전시장에서는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안내하고 위로하며 액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던 상여 장식인 꼭두도 볼 수 있다.
한편 이영화 비움박물관장은 “비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민속품 가운데 출산부터 장례까지 복을 짓는 것과 연관된 민예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라며 “우리 조상들이 복을 받기 위해, 아니 복을 짓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옛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 이름을 떨치는 입신양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과거 합격에 대한 열망은 특히 선비의 공간인 사랑방에 투영됐다. 선비가 글공부를 위해 먹을 가는데 쓰였던 벼루는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 문양으로 디자인됐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민속품을 전시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해 온 광주 대표 사립박물관인 비움박물관과 공동 주최해 의미를 더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올해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비움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전시는 그 연장선이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
|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안내하고 위로하며 액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던 상여 장식 꼭두. <비움박물관 제공> |
대표적인 유물은 조왕중발이다. 가정신 가운데 조왕신은 재물을 담당하는 신이다. 조왕중발은 조왕신을 모시는 그릇으로 부뚜막 뒤에 올려놓았다. 매일 아침 우리네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우물가에 가서 새로 길러온 물을 채웠다.
전시장에는 가내의 평안과 부귀 번영을 가정신들에게 비손하는 것을 ‘성주상’과 ‘삼신상’으로 재현돼 있다.
2부 ‘복을 짓다’는 집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볼 수 있었던 조상들의 복을 바라는 마음에 무게중심을 뒀다.
복과 관련된 글자나 문양이 새겨진 선비의 사랑방 도구와 안방의 세간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식복을 책임지는 부엌의 식기류 등도 만날 수 있다.
안주인의 일상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머릿장은 다복을 상징하는 박쥐문양으로 장식돼 있다. 부엌 찬장에는 복(福) 자가 새겨진 식기류들이 가득했고, 제례와 혼례, 회갑 등 특별한 날에 사용했던 다식판에도 복(福) 자가 새겨져 있다.
태어나면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일생 전반에 걸쳐 찾아오는 다양한 복의 모습들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제3부 ‘복을 받다’는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통과의례를 매개로 복의 의미를 생각하는 코너다.
아기의 장수와 부귀를 염원했던 돌잔치를 비롯해 가문의 번성은 물론 화합을 바랬던 혼례, 부모의 무병장수를 소원하는 회갑례가 그것이다. 아울러 망자의 명복을 빌며 치르는 상례에 나타난 복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도 엿불 수 있다.
특히 전시장에서는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안내하고 위로하며 액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던 상여 장식인 꼭두도 볼 수 있다.
한편 이영화 비움박물관장은 “비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민속품 가운데 출산부터 장례까지 복을 짓는 것과 연관된 민예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라며 “우리 조상들이 복을 받기 위해, 아니 복을 짓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