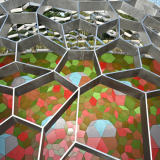[시대를 밝힌노래]<8>-빨치산과 ‘부용산’ ‘피지 못한 채 병든 장미’ 반백년만에 제대로 피었네
2016년 09월 19일(월) 00:00 가가
목포 항도여중 교사 박기동 요절한 누이 위해 지은 시 동료교사 안성현이 곡 붙여
슬픈 사연·애잔한 선율에 빨치산·지식인 즐겨 불러 6·25 이후 금지곡 지정
슬픈 사연·애잔한 선율에 빨치산·지식인 즐겨 불러 6·25 이후 금지곡 지정
부용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한 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부용산’은 슬프고도 애잔한 노래다. 스물 넷 꽃다운 나이에 요절한 누이를 추모한 ‘제망매가(祭亡妹歌)’요, 열 여섯 애제자를 잃은 슬픔을 노래한 ‘제망제가(祭亡弟歌)’다.
사연은 이렇다.
보성 벌교 출신의 시인 박기동에게는 착하고 어여쁜 여섯살 아래 누이(박영애)가 있었다. 누이는 꽃다운 나이 18세에 혼인을 했으나 몇 해 지나지 않아 폐결핵을 앓았다. 순천사범 교사였던 박기동은 학교가 파하면 누이의 병실에 들러 보살폈지만 누이는 덧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 때가 1947년, 누이의 나이 24살의 어느 날이었다. 누이는 죽기 전 “자신이 죽거든 뒷산 부용산에 묻어달라고, 시원스럽게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박기동은 누이와 뛰놀았던 벌교 뒷산 부용산에 누이를 묻고 산기슭 오리 길을 걸어 내려오며 사무치는 슬픔과 허망함을 못이겨 한 편의 시를 지으니 이 시가 ‘부용산’이다.
“부용산 오리길에 /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 솔밭 사이 사이로 / 회오리 바람 타고 / 간다는 한 마디 없이 / 너는 가고 말았구나 / 피어나지 못한 채 /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 부용산 봉우리에 /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나주 남평 출신으로 ‘엄마야 누나야’를 작곡한 안성현에게도 누이(안순자)가 있었다. 가야금 명인이던 아버지(안기옥)가 북으로 떠난 뒤 그가 보살핀 어린 누이였다. 그 누이도 1947년 박기동의 누이가 세상을 떠나던 해, 15살의 나이로 광주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1년 뒤 1948년 박기동과 안성현은 목포 항도여중에서 운명적으로 만났다. 박기동은 영어교사로, 안성현은 음악교사로. 그리고 그 곳에서 또 다른 죽음을 맞았다. 제자 김정희가 누이들처럼 폐결핵으로 요절한 것이다. 당시 16세였다. 특별히 아꼈던 제자를 유달산에 묻고 내려오면서 안성현이 박기동의 시 ‘부용산’에 선율을 입히니, 이 노래가 ‘부용산’이다.
◇ 기구한 운명의 ‘부용산’
시 ‘부용산’의 탄생이 기구했듯, 노래 ‘부용산’ 또한 기구했다.
부용산은 1948년 4월11일 목포 평화극장에서 열린 학예회 때 5학년 배금순의 노래로 처음 발표됐다.(안성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자료집) 그리고 8월7일 발간된 안성현의 두번째 작곡집에 실렸다.
사무치는 노랫말과 애잔한 선율은 해방정국 좌우 갈등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쫓기던 이들의 마음을 파고 들었다.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퍼져가던 그 해 10월 여순사건이 발생했고, 산으로 쫓겨난 이들이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노래가 됐다. 그 후 부용산은 빨치산 노래로 붉은 밑줄이 그어졌다. 더욱이 6·25전쟁으로 남도의 좌익이 지리산·조계산·백운산 등으로 대거 입산하면서 노래는 널리 퍼졌다. 달 밝은 밤이면 빨치산들이 워낙 애절하게 불러 대는 바람에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잠을 설쳤다고 전한다.
애당초 이 노래는 이념과는 무관했다. 빨치산이 불렀다고 모두가 ‘혁명가’는 아니다. 부용산으 혁명가가 되기엔 지나치게 느리고 우울하다. 빨치산도 노래에 이념을 넣어 불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처지가 고달파서 즐겨 불렀을 게다.
빨치산의 유래는 일제강점기 야산대에서 출발한다. 본격적으로 무장을 갖추고 투쟁에 나선 것은 1948년 10월19일 여순사건 이후부터다.
여순사건은 여수에 주둔했던 국군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항쟁 진압 명령에 불복해 일으킨 반란이다. 한때 여수와 순천을 점령했지만 곧 패퇴했다. 남로당에서 급파된 이현상은 패주병들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이들이 빨치산이다. 토벌대에 쫓겨 2년여를 이산 저산 헤매던 빨치산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6·25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전세가 일시에 뒤집혀 다시 지리산에 고립됐다.
빨치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전쟁 전부터 좌익활동을 하던 속칭 ‘구빨치’,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낙오한 인민군들과 북한 점령하에서 공산당에 협력한 사람들로 구성된 ‘신빨치’다.
빨치산 이끈 주력은 지식인들이었다. 부용산을 지은 이는 시인이고, 곡을 붙인 이는 작곡가다. 이들은 지식인이자 문화예술인이었다. 금지곡이 됐지만 이 노래가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배경이다.
그러다 다시 세상으로 끄집어 낸 건 안치환이었다. 1997년 낸 앨범 ‘노스탤지어’에 ‘부용산’을 작가미상의 구전가요로 올렸다. 안치환이 부른 부용산은 목포 출신 시인 김지하가 후배인 춤꾼 이애주에게, 이애주는 1980년대 노래운동의 핵심 작곡가인 문승현에게, 다시 안치환으로 구전돼 불리어지면서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렇듯 구전가요 부용산은 안치환에 의해 세상에 존재를 알린 뒤 이동원·한영애 등 가객들에 의해 그 선율이 소개됐다.
◇ 단지 빨치산이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9월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하던 날, 벌교를 향했다. ‘여수에서 돈, 순천에서 인물, 벌교에서 주먹 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벌교는 힘 꽤나 쓴다는 사내들과 조정래의 ‘태백산맥’, 그리고 꼬막으로 유명하다. 이 세 가지는 묘하게 연관성을 지니며, 소설 ‘태백산맥’에 담겨있다.
부용산은 벌교 읍내에서 오리 떨어진 해발 192m의 동네 뒷산이다. 그렇지만 벌교 사람들에게 부용산은 정신적 지주다. 주민들이 꼬막 팔아 모은 성금으로 부용산 오솔길에 큼지막하게 화강암으로 시비를 세우고 내친김에 산책로까지 조성했다.
부용산으로 오르는 길은 염상구의 아지트였던 청년단이 있던 자리다. 나무테크로 정비된 부용산 오리길을 걷는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 부용산공원이 나오고 좀 더 오르면 ‘부용산시비’가 들어온다. 벌교 부용산 오리길에 서 있는 시비는 들꽃처럼 수수하다.
부용정에 오르면 벌교 읍내는 물론 철교와 벌교포구, 중도방죽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그 곳에서 ‘부용산’을 되뇌이다보면 이념과 무관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아픔이 다가온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이영희 선생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벌교·목포=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한 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사연은 이렇다.
보성 벌교 출신의 시인 박기동에게는 착하고 어여쁜 여섯살 아래 누이(박영애)가 있었다. 누이는 꽃다운 나이 18세에 혼인을 했으나 몇 해 지나지 않아 폐결핵을 앓았다. 순천사범 교사였던 박기동은 학교가 파하면 누이의 병실에 들러 보살폈지만 누이는 덧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 때가 1947년, 누이의 나이 24살의 어느 날이었다. 누이는 죽기 전 “자신이 죽거든 뒷산 부용산에 묻어달라고, 시원스럽게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박기동은 누이와 뛰놀았던 벌교 뒷산 부용산에 누이를 묻고 산기슭 오리 길을 걸어 내려오며 사무치는 슬픔과 허망함을 못이겨 한 편의 시를 지으니 이 시가 ‘부용산’이다.
1년 뒤 1948년 박기동과 안성현은 목포 항도여중에서 운명적으로 만났다. 박기동은 영어교사로, 안성현은 음악교사로. 그리고 그 곳에서 또 다른 죽음을 맞았다. 제자 김정희가 누이들처럼 폐결핵으로 요절한 것이다. 당시 16세였다. 특별히 아꼈던 제자를 유달산에 묻고 내려오면서 안성현이 박기동의 시 ‘부용산’에 선율을 입히니, 이 노래가 ‘부용산’이다.
◇ 기구한 운명의 ‘부용산’
시 ‘부용산’의 탄생이 기구했듯, 노래 ‘부용산’ 또한 기구했다.
부용산은 1948년 4월11일 목포 평화극장에서 열린 학예회 때 5학년 배금순의 노래로 처음 발표됐다.(안성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자료집) 그리고 8월7일 발간된 안성현의 두번째 작곡집에 실렸다.
사무치는 노랫말과 애잔한 선율은 해방정국 좌우 갈등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쫓기던 이들의 마음을 파고 들었다.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퍼져가던 그 해 10월 여순사건이 발생했고, 산으로 쫓겨난 이들이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노래가 됐다. 그 후 부용산은 빨치산 노래로 붉은 밑줄이 그어졌다. 더욱이 6·25전쟁으로 남도의 좌익이 지리산·조계산·백운산 등으로 대거 입산하면서 노래는 널리 퍼졌다. 달 밝은 밤이면 빨치산들이 워낙 애절하게 불러 대는 바람에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잠을 설쳤다고 전한다.
애당초 이 노래는 이념과는 무관했다. 빨치산이 불렀다고 모두가 ‘혁명가’는 아니다. 부용산으 혁명가가 되기엔 지나치게 느리고 우울하다. 빨치산도 노래에 이념을 넣어 불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처지가 고달파서 즐겨 불렀을 게다.
빨치산의 유래는 일제강점기 야산대에서 출발한다. 본격적으로 무장을 갖추고 투쟁에 나선 것은 1948년 10월19일 여순사건 이후부터다.
여순사건은 여수에 주둔했던 국군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항쟁 진압 명령에 불복해 일으킨 반란이다. 한때 여수와 순천을 점령했지만 곧 패퇴했다. 남로당에서 급파된 이현상은 패주병들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이들이 빨치산이다. 토벌대에 쫓겨 2년여를 이산 저산 헤매던 빨치산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6·25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전세가 일시에 뒤집혀 다시 지리산에 고립됐다.
빨치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전쟁 전부터 좌익활동을 하던 속칭 ‘구빨치’,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낙오한 인민군들과 북한 점령하에서 공산당에 협력한 사람들로 구성된 ‘신빨치’다.
빨치산 이끈 주력은 지식인들이었다. 부용산을 지은 이는 시인이고, 곡을 붙인 이는 작곡가다. 이들은 지식인이자 문화예술인이었다. 금지곡이 됐지만 이 노래가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배경이다.
그러다 다시 세상으로 끄집어 낸 건 안치환이었다. 1997년 낸 앨범 ‘노스탤지어’에 ‘부용산’을 작가미상의 구전가요로 올렸다. 안치환이 부른 부용산은 목포 출신 시인 김지하가 후배인 춤꾼 이애주에게, 이애주는 1980년대 노래운동의 핵심 작곡가인 문승현에게, 다시 안치환으로 구전돼 불리어지면서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렇듯 구전가요 부용산은 안치환에 의해 세상에 존재를 알린 뒤 이동원·한영애 등 가객들에 의해 그 선율이 소개됐다.
◇ 단지 빨치산이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9월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하던 날, 벌교를 향했다. ‘여수에서 돈, 순천에서 인물, 벌교에서 주먹 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벌교는 힘 꽤나 쓴다는 사내들과 조정래의 ‘태백산맥’, 그리고 꼬막으로 유명하다. 이 세 가지는 묘하게 연관성을 지니며, 소설 ‘태백산맥’에 담겨있다.
부용산은 벌교 읍내에서 오리 떨어진 해발 192m의 동네 뒷산이다. 그렇지만 벌교 사람들에게 부용산은 정신적 지주다. 주민들이 꼬막 팔아 모은 성금으로 부용산 오솔길에 큼지막하게 화강암으로 시비를 세우고 내친김에 산책로까지 조성했다.
부용산으로 오르는 길은 염상구의 아지트였던 청년단이 있던 자리다. 나무테크로 정비된 부용산 오리길을 걷는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 부용산공원이 나오고 좀 더 오르면 ‘부용산시비’가 들어온다. 벌교 부용산 오리길에 서 있는 시비는 들꽃처럼 수수하다.
부용정에 오르면 벌교 읍내는 물론 철교와 벌교포구, 중도방죽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그 곳에서 ‘부용산’을 되뇌이다보면 이념과 무관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아픔이 다가온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이영희 선생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벌교·목포=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