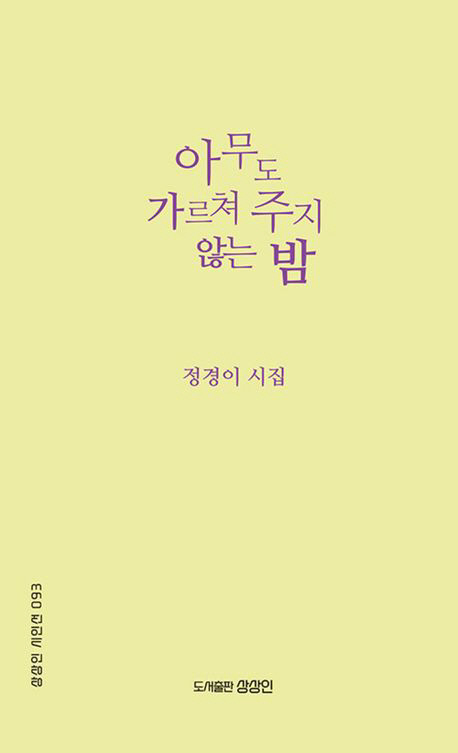보이지 않는 이면을 주목하고 노래하다
2025년 11월 27일(목) 08:18 가가
완도 출신 정경이 시인 시집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밤’ 펴내
시인이 바라보는 대상은 천차만별이다. 크고 거대한 서사를 바라보기도, 반면 작고 협소한 공간을 바라보기도 한다. 세상의 이치가 음양이 있듯,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는 것과 같다.
본질적으로 시인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보는 존재다. 이를 매개로 사유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경이 시인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해왔던 대상이나 미세한 지점을 응시한다. 태생적으로 시인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다.
시집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밤’(상상인)은 보이지 않는 이면을 주목하고 노래한 시들을 다수 담고 있다. 화자는 화려한 이면에 드리워진 쓸쓸하면서도 어두운 순간과 장면을 포착한다.
“등을 헤아리다/ 눈이 흐려지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언제나 등 뒤에서 빛난다”(‘뒷모습에 대한 변주’ 중)
‘등’을 헤아린다는 것은 감춰진 이면을 바라본다는 의미다. 실체 너머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행위의 발로다. “진실은 언제나 등 뒤에서 빛난다”는 깨달음은 생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한 이의 겸허한 고백으로 들려온다.
유랑을 통해 시적 주제를 확장하고 변주하는 작품도 있다. 다음은 시인의 시적 감성과 유연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시다. “그곳에 가면 싱싱한 그리움의 지느러미를 달고 있는 발자국을 신어 볼 수 있다 따뜻한 햇살이 발등을 콕콕 쪼는 해변을 따라 달리면 손톱만 한 꽃들이 까르르 웃음 흩뿌리고 갈대들이 뒷걸음질 치며 다정하게 손 흔드는 호숫가, 생기 넘치는 풍경들은 여러 장의 궁금증을 복사한다”(‘발자국은 길을 묻지 않는다-우항리에서’중)
“생기 넘치는 풍경들”은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정겨움과 평화로움을 선사한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수사는 읽는 이에게 시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싱싱한 그리움의 지느러미”, “햇살이 발등을 콕콕 쪼는 해변”은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눈앞에 펼쳐놓은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정 시인은 “생의 반나절이 씻김의 의식 안으로 들어왔다”며 “씻겨나가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었다”는 말로 작품집에 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했다.
한편 완도 출신의 정 시인은 목포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한국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본질적으로 시인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보는 존재다. 이를 매개로 사유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집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밤’(상상인)은 보이지 않는 이면을 주목하고 노래한 시들을 다수 담고 있다. 화자는 화려한 이면에 드리워진 쓸쓸하면서도 어두운 순간과 장면을 포착한다.
“등을 헤아리다/ 눈이 흐려지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언제나 등 뒤에서 빛난다”(‘뒷모습에 대한 변주’ 중)
“생기 넘치는 풍경들”은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정겨움과 평화로움을 선사한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수사는 읽는 이에게 시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싱싱한 그리움의 지느러미”, “햇살이 발등을 콕콕 쪼는 해변”은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눈앞에 펼쳐놓은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정 시인은 “생의 반나절이 씻김의 의식 안으로 들어왔다”며 “씻겨나가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었다”는 말로 작품집에 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했다.
한편 완도 출신의 정 시인은 목포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한국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