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래 목적”
2024년 07월 15일(월) 19:20 가가
중현 증심사 주지 ‘기도의 이유’ 펴내…광주일보 종교칼럼 필진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 결과보다 ‘진인사대천명’ 자세 필요해”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 결과보다 ‘진인사대천명’ 자세 필요해”
“기도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제대로 알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절에 다니신 신도분들도 별 생각없이 관성적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우선 저부터도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나?’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죠.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주 증심사 주지이자 광주일보 종교칼럼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현 스님이 최근 에세이집 ‘기도의 이유’(불광출판사)를 펴냈다.
그동안 스님은 광주일보 종교칼럼을 통해 특유의 맛깔스러운 문체와 술술 읽히는 에피소드로 대중들과 호흡하며 불교를 친근하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길고양이의 법문’, ‘불교를 안다는 것 불교를 한다는 것’ 등과 같은 책을 펴내며 독자들과 소통을 해왔다.
그는 이번 책을 관통하는 핵심에 대한 물음에 “종교적 기도에서 불교적 수행으로”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언뜻 화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가늠이 될 것도 같았다.
“소통과 간청이라는 종교적 신앙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수행으로 나아갈 때, 기도는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행생활을 관성적으로 하기보다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자기화할 때 본래 신행생활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요.”
중현 스님이 말하는 기도 요체는 바로 ‘신행생활이자 수행’이다. 종교를 떠나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신앙행위에 초점들 둔다. 어떤 대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보니 정작 자신의 삶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이다.
스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소소한 일상에서 수행 아닌 것이 없고 신행생활 아닌 것이 없다”며 “특별히 기도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달리 말하면 기도는 ‘격식을 갖춘 수행’일 터였다.
“기도는 마음 내킬 때,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때와 장소, 방식,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규칙적으로, 의미를 되새기며 하는 행위이지요. 그래야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안으로부터 끌어 낼 수 있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슬람교 등 형식은 다르지만 절대자에게 마음을 내놓는다는 것은 일정 부분 공통적이다. 그럼에도 불교만의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다.
스님은 모든 불교 의식은 ‘귀의’(歸依)로 시작해 ‘발원’(發願)으로 마무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의’란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다짐이며 ‘발원’은 내가 부처이니,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교적 수행으로서의 기도는 “내가 부처의 행을 하고,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생각을 하는 실천을 통해 내가 부처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그는 불가에 귀의하기 전 학생운동을 했다. 고려대 행정학과에 입학했지만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군부세력을 용납할 수 없어 길거리 투쟁을 했다.
“반민주와 반인권의 혹독한 시대가 대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았죠. 저 또한 80년대를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청춘을 보내야했으니까요.”
당시 마음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겠다”는 느낌과 비슷했다. ‘내가 세상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겠다’ 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사회의 변혁과 사회사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 내면의 고통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출가한 뒤에야 불교가 바로 내면의 궁극적인 번뇌를 해결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한 계기로 출가했지만 “정말 제대로 찾아왔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현재 스님은 자비신행회와 함께 아이들에게 꿈과 행복을 전달하는 ‘중현 스님의 행복한 피자가게’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 피자를 구워 아동들에게 나눠준다. 또한 바람직한 종교 역할을 고민하며 불심의 향기를 전파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온라인 불교학당 등을 통해 불교와 일반인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힘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부탁했다. 스님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를 견지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들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주체인 나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인연법의 가르침이지요.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는 시절인연에 맡기는 마음 자세로 살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마음 깊이 새겨봄직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동안 스님은 광주일보 종교칼럼을 통해 특유의 맛깔스러운 문체와 술술 읽히는 에피소드로 대중들과 호흡하며 불교를 친근하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길고양이의 법문’, ‘불교를 안다는 것 불교를 한다는 것’ 등과 같은 책을 펴내며 독자들과 소통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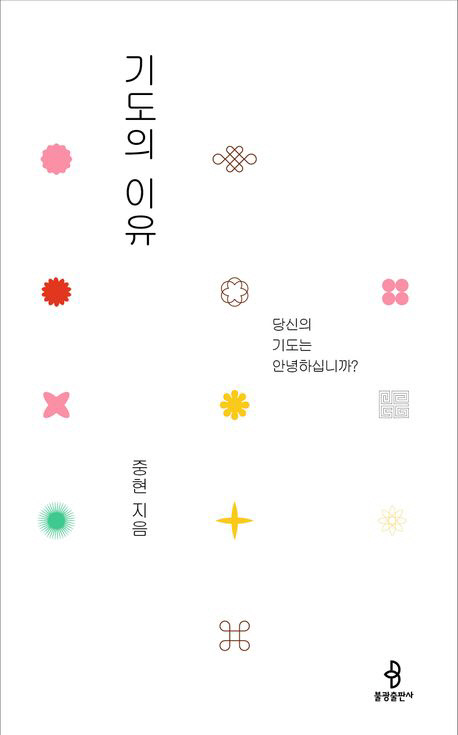  |
“소통과 간청이라는 종교적 신앙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수행으로 나아갈 때, 기도는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행생활을 관성적으로 하기보다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자기화할 때 본래 신행생활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요.”
스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소소한 일상에서 수행 아닌 것이 없고 신행생활 아닌 것이 없다”며 “특별히 기도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달리 말하면 기도는 ‘격식을 갖춘 수행’일 터였다.
“기도는 마음 내킬 때,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때와 장소, 방식,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규칙적으로, 의미를 되새기며 하는 행위이지요. 그래야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안으로부터 끌어 낼 수 있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슬람교 등 형식은 다르지만 절대자에게 마음을 내놓는다는 것은 일정 부분 공통적이다. 그럼에도 불교만의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다.
  |
| 에세이집 ‘기도의 이유’와 저자 중현 증심사 주지. <증심사 제공> |
그는 불가에 귀의하기 전 학생운동을 했다. 고려대 행정학과에 입학했지만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군부세력을 용납할 수 없어 길거리 투쟁을 했다.
“반민주와 반인권의 혹독한 시대가 대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았죠. 저 또한 80년대를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청춘을 보내야했으니까요.”
당시 마음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겠다”는 느낌과 비슷했다. ‘내가 세상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겠다’ 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사회의 변혁과 사회사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 내면의 고통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출가한 뒤에야 불교가 바로 내면의 궁극적인 번뇌를 해결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한 계기로 출가했지만 “정말 제대로 찾아왔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현재 스님은 자비신행회와 함께 아이들에게 꿈과 행복을 전달하는 ‘중현 스님의 행복한 피자가게’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 피자를 구워 아동들에게 나눠준다. 또한 바람직한 종교 역할을 고민하며 불심의 향기를 전파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온라인 불교학당 등을 통해 불교와 일반인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힘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부탁했다. 스님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를 견지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들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주체인 나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인연법의 가르침이지요.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는 시절인연에 맡기는 마음 자세로 살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마음 깊이 새겨봄직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