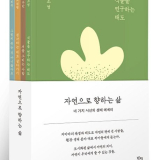주문량 급감·재료비 급등…탈출구 없는 레미콘업계
2025년 03월 09일(일) 20:20 가가
건설경기 침체…골재 가격 줄인상 속 건설회사 가격 인하 압박
광주시·전남도 골재 채취 거부…타지 이송으로 운송비 치솟아
건설사모임과 10차례 가격 협상 실패…‘시멘트 대란’ 올 수도
광주시·전남도 골재 채취 거부…타지 이송으로 운송비 치솟아
건설사모임과 10차례 가격 협상 실패…‘시멘트 대란’ 올 수도


광주와 전남지역 레미콘 생산업체들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골재가격 상승에도 건설회사들의 단가 인하 압박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레미콘을 실은 믹서차량이 광주 한 건설현장을 오가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레미콘 생산업체들이 출하할 수록 손해를 보는 생산구조 속에 위기를 맞았다. 건설경기 악화로 출하량이 줄고있는 데다 레미콘의 40%를 차지하는 골재(모래·자갈) 가격은 품귀현상으로 전년보다 15% 가까이 올랐지만, 건설사들은 레미콘 가격을 낮추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레미콘 생산업체의 경우 타 지역보다 골재 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건설사들과의 레미콘 가격 협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레미콘업계의 골재 채취 요청에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업체들은 레미콘 공급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역 레미콘업체들의 연간 출하량은 지난 2020년 613만㎥(루베)에서 지난해 440만㎥로 무려 28.2%나 감소했다. 특히 주문량은 줄고, 재료비 오르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레미콘의 주재료인 모래가격은 남원산(産) 기준 지난 2020년 ㎥당 2만3000원에서 올해 3월 ㎥당 3만3000원까지 상승했다. 지역 업체들이 남원에서 모래를 사오는 이유는 광주·전남 내 채취되는 골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함평과 곡성, 영광 등지에서 모래를 구매해왔는데, 이들 지역 골재 판매업체가 생산량 부족을 이유로 판매를 줄이면서 남원을 포함한 고창, 순창 등지로까지 손을 뻗쳤다. 전북산 모래만 가격이 오른게 아니다. 함평산 모래만 하더라도 지난 2020년 ㎥당 1만5800원에서 올해 초 ㎥당 2만56000원까지 올랐다. 자갈 가격도 최근 ㎥당 2000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업계는 골재 채취 지역을 늘려달려며 광주시와 전남도에 요청했지만, 시·도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다. 시·도 모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클 것으로 보고 골재 채취 허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레미콘업계 요청 이후 업무 담당자를 배치했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한 레미콘 생산업체 대표는 “골재 채취 인허가도 어렵지만 골재 채취업자가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가격만 올리는 것도 문제”라며 “여기에 운반비와 인건비는 날로 상승하고 있어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건설업체가 레미콘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건설사 구매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와 올해 시멘트 단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양측 사이 단가 차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국제 유연탄 가격이 안정을 찾았다며 레디콘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10차례의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레미콘 업계는 ㎥당 수도권 레미콘 단가인 9만3700원에서 1800원을 내린 9만 1900원으로 한 발 물러섰다. 건자회는 2800원 인하를 제안해 최종합의가 무산됐다.
지방 레미콘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가격 합의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지역 업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유연탄 가격이 안정되기는 했지만 골재가 풍부한 수도권과는 달리 광주·전남의 경우 골재 부족으로 생산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레미콘 업계에서는 지난 2023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도도 적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납품대금연동제도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원재가 가격 변동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시스템이지만, 건설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레미콘 업체가 쉽사리 이 제도의 동의를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최소한의 원가 인상분이라도 레미콘 가격에 반영해줘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부처, 광주시, 전남도가 레미콘 업계 생존을 위한 구조개선과 정책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레미콘 생산업체 대표는 “골재 채취 인허가도 어렵지만 골재 채취업자가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가격만 올리는 것도 문제”라며 “여기에 운반비와 인건비는 날로 상승하고 있어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건설업체가 레미콘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건설사 구매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와 올해 시멘트 단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양측 사이 단가 차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국제 유연탄 가격이 안정을 찾았다며 레디콘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10차례의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레미콘 업계는 ㎥당 수도권 레미콘 단가인 9만3700원에서 1800원을 내린 9만 1900원으로 한 발 물러섰다. 건자회는 2800원 인하를 제안해 최종합의가 무산됐다.
지방 레미콘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가격 합의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지역 업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유연탄 가격이 안정되기는 했지만 골재가 풍부한 수도권과는 달리 광주·전남의 경우 골재 부족으로 생산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레미콘 업계에서는 지난 2023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도도 적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납품대금연동제도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원재가 가격 변동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시스템이지만, 건설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레미콘 업체가 쉽사리 이 제도의 동의를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최소한의 원가 인상분이라도 레미콘 가격에 반영해줘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부처, 광주시, 전남도가 레미콘 업계 생존을 위한 구조개선과 정책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