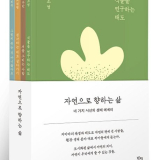12월의 한담(寒談)-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
2024년 12월 26일(목) 00:00 가가
프랑스의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는 연극이란 새로운 관객의 생산이라고 말한다. 배우란 관객의 충분한 관람을 위해 그 미완성의 의미를 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는 12월에 들어 대한민국 최정상 배우들의 연극을 관람하고 있다.
그런데 무대 위에서 전개되는 동작과 대사를, 달리 말해 그 연기의 의미에 관객은 심기가 불편하다.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전개되는 연극은 관객을 불편케 한다.
관객은 3류가 아니다. 여러모로 상위권에 드는 나라 국민으로서 시선이 높고 시각도 바르다. ‘소년이 와서’ 이제 청년이 됐다. 눈물의 의미를 모른 채 눈물을 잘 흘리는 배우를 가려낼 줄 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숙지하고 존중하는 시민이다. 현대의 관객은 뻔한 코미디에 현혹되지 않는다.
관객을 모독하는 연극은 시대착오다. 완장을 두른 연출가들,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감독자들은 그 권위에 배반하는 처신을 경계해야 한다.
12월은 날이 차고 가진 것이 적어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노상 ‘민생’이라는 워딩을 쏟아 내지만 그 작동은 미미하다. 시, 군으로부터 국무위원까지 많은 지도자들, 자칭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치건만 고성과 작태만 목격된다. 설득과 경청에 노력해야 한다. 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공통의 목적 수행자들이니까. 유권자로서 국민은 지혜를 갖춘 지도자를 선호한다. 삼국지 속에서 장비보다 유비가 더 매력적이다.
장관도 대통령도 해보지 않아서 쉽게 말하는 것 같기는 하나 우리가 바라는, 국민이 존경하고 신뢰하고픈 지도자상이 있다. 무엇보다 거친 언행을 구사하는 인물은 싫다. 국민 다수를 경시하고 겁박하는 어투와 태도는 가관이다. 한 나라의 역사적 맥락을 일탈하는 논지 또한 긍정할 수 없다. 지도자는 균형 잡힌 사고를 익혀야 한다.
현대 윤리학 개념으로 존중되는 ‘관용’이 서툰 지도자는 구성원 편 가르기에 급급해 공정한 행정과 정치를 수행할 수 없다. 시민과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치는 건 언표된 말과 다른 속내가 있기 마련이다. 지도자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덕목이 1순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현명하고 유식하고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사람이요 사람다워야 하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다. 윤리적 인간, 도덕적 존재의 요청이다. 이 요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나타나 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아주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너의 행위의 준칙(準則)이 보편적 법칙(法則)이 되도록 행위 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선호하는 행동의 원칙들이 보편적 법칙처럼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그건 내 개인적 취향이 아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커다란 의무이지 개인적 취미가 될 수 없듯이.
나의 개인적 윤리적 태도를 밝힌다면 이렇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와 관계하는 상대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이다. 나의 행위 상대가 미소 짓고 착해지고 행복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착하고 웃고 행복할 때 나타나는 행운일 것 같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국민을 웃음 짓게 해야 한다. 시름을 덜어주어야 한다. 국민을 걱정케 하는 지도자란 자격 미달이다. 2025년 새해에는 서로가 정다운 눈빛, 고운 말로 살 맛을 일궈야 할 것이다.
관객은 3류가 아니다. 여러모로 상위권에 드는 나라 국민으로서 시선이 높고 시각도 바르다. ‘소년이 와서’ 이제 청년이 됐다. 눈물의 의미를 모른 채 눈물을 잘 흘리는 배우를 가려낼 줄 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숙지하고 존중하는 시민이다. 현대의 관객은 뻔한 코미디에 현혹되지 않는다.
관객을 모독하는 연극은 시대착오다. 완장을 두른 연출가들,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감독자들은 그 권위에 배반하는 처신을 경계해야 한다.
현대 윤리학 개념으로 존중되는 ‘관용’이 서툰 지도자는 구성원 편 가르기에 급급해 공정한 행정과 정치를 수행할 수 없다. 시민과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치는 건 언표된 말과 다른 속내가 있기 마련이다. 지도자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덕목이 1순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현명하고 유식하고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사람이요 사람다워야 하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다. 윤리적 인간, 도덕적 존재의 요청이다. 이 요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나타나 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아주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너의 행위의 준칙(準則)이 보편적 법칙(法則)이 되도록 행위 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선호하는 행동의 원칙들이 보편적 법칙처럼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그건 내 개인적 취향이 아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커다란 의무이지 개인적 취미가 될 수 없듯이.
나의 개인적 윤리적 태도를 밝힌다면 이렇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와 관계하는 상대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이다. 나의 행위 상대가 미소 짓고 착해지고 행복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착하고 웃고 행복할 때 나타나는 행운일 것 같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국민을 웃음 짓게 해야 한다. 시름을 덜어주어야 한다. 국민을 걱정케 하는 지도자란 자격 미달이다. 2025년 새해에는 서로가 정다운 눈빛, 고운 말로 살 맛을 일궈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