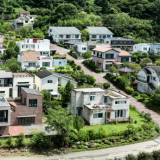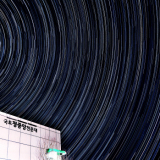강경아 시인 “시공초월 고통받는 민초들의 희망가죠”
2022년 10월 05일(수) 19:30 가가
시와 에세이집 ‘맨발의 꽃잎들’ 출간
고향 여수 배경 국가폭력 희생자 진실 찾기·청년 생존기 담아
“시는 영혼을 살 찌우는 밥…힘들때마다 세계를 보게하는 통로”
고향 여수 배경 국가폭력 희생자 진실 찾기·청년 생존기 담아
“시는 영혼을 살 찌우는 밥…힘들때마다 세계를 보게하는 통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응당 시인으로서, 작가로서의 역사적 사명감이랄까요.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작가정신’ 그 역사적 책무감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인이 아니 작가가 역사적 사명감에서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창작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그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작품이 탄생된다.
그러나 역사의식은 작품 세계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 토대 가운데 하나다. 예술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고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여수 출신 강경아 시인은 그런 발로에서 시를 쓴다. 자신의 표현대로 “너무 거창한지 모르지만” 역사에 대한 책무는 시를 쓰는 명징한 이유다.
강 시인이 이번에 펴낸 시집 ‘맨발의 꽃잎들’(詩와 에세이)은 역사적 상흔의 도시 여수에 대한 작품들을 담고 있다.
작품집에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과 자본의 먹이사슬에 표적이 되는 청년들의 일상이 나온다.
여수는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인터뷰에 앞서 시인에게 아름다운 항구도시 여수는 어떤 이미지일까 라는 궁금증이 일었다. 외부인 관점으로는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인지 남다른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고운 여수는 남도의 밥상처럼 넉넉한 인심이 있어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순10·19의 아픔을 간직한 도시죠.”
여수는 시인에게 “생의 어긋난 통점들이 불쑥불쑥 얼굴을 내미는” 역사적 공간이면서 “적막이 사무치면 바다가 되는”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수는 오랫동안 “국가 폭력에 희생되고 방치된” 슬픔과 한이 서린 지역이었다. 지금도 ‘빨갱이의 도시’, ‘반란의 도시’라는 오명이 씌워진 채 74년 오욕의 역사를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수많은 유가족들이 있다. 시인은 “그들의 아픔과 희생자들의 넋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했다.
그러므로 이번 시집은 그런 방치된 진실 찾기라는 명분에서 출발한다. “역사적 진실이 거대한 무덤속으로 수장돼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작가적 책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인은 “여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제는 갈등과 반목의 이해충돌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시집은 민초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주제로 담았다”고 부연했다.
시 ‘여순의 푸른 눈동자’는 아픈 역사를 사실적으로 소환하고 있는 작품이다.
“누가 너희에게 즉결처분의 권한을 주었느냐/ 여덟 명의 식솔을 거느린 가장에게/ 흙을 일구는 가장 외롭고 가난한 농부에게/ 살뜰했던 윗마을 아랫마을 평화로운 이웃에게/ 누가 너희에게 손가락총을 겨누게 하였느냐/ 좌우로 줄을 세우도록 하였느냐// 하늘이 갈기갈리 찢기는 소리가 들렸다/ 타다당 탕 탕 탕 탕탕…”
작품을 읽다 보면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총살이 진행되던 당시 주암초등학교의 전경이 클로즈업 돼 다가온다. “아버지의 흰 무명옷이 죄인의 수의(囚衣)가 되었다”고 읊조리는 화자의 심상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애절하다.
시집에서는 여순의 비극뿐 아니라 80년 5월 광주, 제주 4·3의 상흔을 풀어낸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시인의 눈은 팽목항, 미얀마, 스페인 광장 등 시대와 공간을 넘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민초들에게로 향한다.
그렇다고 큰 대의나 거시적인 사건들에만 닿아 있지 않다. 우리 이웃들의 아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견고한 성체가 되”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는 연대의 힘을 발견한다.
“소외된 우리 이웃의 아픔은 바짝 눌러 붙어 떨어지지 않는 ‘바닥’을 마주하게 합니다. 바닥의 힘은 곧 맨발의 힘, 그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 고목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목련꽃 한 송이처럼 그들 모두 스스로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 민중인 것입니다.”
현재 시인은 여천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과목 ‘내마음 속 풍경’이라는 시 창작 지도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논술 지도를 하고 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지만 마음 속에 떠오르는 단상을 시로 옮기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명쾌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답을 내놓는다. “시는 내 영혼과 정신을 살찌우게 하는 ‘밥’과 같은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나게 하고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통로 같은 것이죠.”
한편 강 시인은 원광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2013년 ‘시에’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든 시인이 아니 작가가 역사적 사명감에서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창작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그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작품이 탄생된다.
여수 출신 강경아 시인은 그런 발로에서 시를 쓴다. 자신의 표현대로 “너무 거창한지 모르지만” 역사에 대한 책무는 시를 쓰는 명징한 이유다.
강 시인이 이번에 펴낸 시집 ‘맨발의 꽃잎들’(詩와 에세이)은 역사적 상흔의 도시 여수에 대한 작품들을 담고 있다.
여수는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인터뷰에 앞서 시인에게 아름다운 항구도시 여수는 어떤 이미지일까 라는 궁금증이 일었다. 외부인 관점으로는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수는 시인에게 “생의 어긋난 통점들이 불쑥불쑥 얼굴을 내미는” 역사적 공간이면서 “적막이 사무치면 바다가 되는”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수는 오랫동안 “국가 폭력에 희생되고 방치된” 슬픔과 한이 서린 지역이었다. 지금도 ‘빨갱이의 도시’, ‘반란의 도시’라는 오명이 씌워진 채 74년 오욕의 역사를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수많은 유가족들이 있다. 시인은 “그들의 아픔과 희생자들의 넋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했다.
그러므로 이번 시집은 그런 방치된 진실 찾기라는 명분에서 출발한다. “역사적 진실이 거대한 무덤속으로 수장돼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작가적 책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인은 “여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제는 갈등과 반목의 이해충돌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시집은 민초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주제로 담았다”고 부연했다.
시 ‘여순의 푸른 눈동자’는 아픈 역사를 사실적으로 소환하고 있는 작품이다.
“누가 너희에게 즉결처분의 권한을 주었느냐/ 여덟 명의 식솔을 거느린 가장에게/ 흙을 일구는 가장 외롭고 가난한 농부에게/ 살뜰했던 윗마을 아랫마을 평화로운 이웃에게/ 누가 너희에게 손가락총을 겨누게 하였느냐/ 좌우로 줄을 세우도록 하였느냐// 하늘이 갈기갈리 찢기는 소리가 들렸다/ 타다당 탕 탕 탕 탕탕…”
작품을 읽다 보면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총살이 진행되던 당시 주암초등학교의 전경이 클로즈업 돼 다가온다. “아버지의 흰 무명옷이 죄인의 수의(囚衣)가 되었다”고 읊조리는 화자의 심상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애절하다.
시집에서는 여순의 비극뿐 아니라 80년 5월 광주, 제주 4·3의 상흔을 풀어낸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시인의 눈은 팽목항, 미얀마, 스페인 광장 등 시대와 공간을 넘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민초들에게로 향한다.
그렇다고 큰 대의나 거시적인 사건들에만 닿아 있지 않다. 우리 이웃들의 아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견고한 성체가 되”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는 연대의 힘을 발견한다.
“소외된 우리 이웃의 아픔은 바짝 눌러 붙어 떨어지지 않는 ‘바닥’을 마주하게 합니다. 바닥의 힘은 곧 맨발의 힘, 그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 고목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목련꽃 한 송이처럼 그들 모두 스스로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 민중인 것입니다.”
현재 시인은 여천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과목 ‘내마음 속 풍경’이라는 시 창작 지도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논술 지도를 하고 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지만 마음 속에 떠오르는 단상을 시로 옮기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명쾌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답을 내놓는다. “시는 내 영혼과 정신을 살찌우게 하는 ‘밥’과 같은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나게 하고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통로 같은 것이죠.”
한편 강 시인은 원광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2013년 ‘시에’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