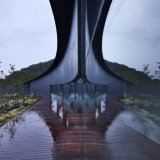인류 진화의 무기, 친화력-윌리엄 폰 히펠 지음, 김정아 옮김
2021년 12월 25일(토) 19:00 가가
인간은 협력 통해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
“진화하면서 우리에게는 갖가지 선호가 생겼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호는 머릿속 생각을 남과 공유하고 싶은 욕구이지 않을까 싶다. 지능 덕분에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도 한 사람 것만 놓고 보면 그리 특별하지 않다. 인간 한 명을 발가벗긴 채 거친 숲에 뚝 떨어뜨리면 곧장 산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 하지만 백 명을 벌거벗긴 채 거친 숲에 뚝 떨어뜨리면 그 불운한 산림지대에 최상위 포식자가 등장한 셈이다.”(본문 중에서)
인간의 여러 특징 가운데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감정 공유’를 꼽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화력’이다. 동물에 비해 여러 가지로 신체적 결함이 많은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것은 친화력 때문이다. 인간은 그렇게 협력이라는 무기를 매개로 많은 분야의 발전을 이뤘다.
친화력을 주제로 쓴 ‘인류 진화의 무기, 친화력’은 진화와 협력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저자인 퀸즐랜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폰 히펠은 인류는 왜 서로에게 친절하도록 진화했는지 조명한다.
저자는 진화는 따뜻하고 포근한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자연계에는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친화력’을 매개로 서로 협력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견해다.
저자는 심리의 변화를 주목한다. 우리 몸은 지난 600~700만년 동안 조금 바뀌었지만 심리는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마음과 두뇌의 적응이자 사회관계 기능으로, 특히 협동 능력과 직결된다.
그 예로 히펠 교수는 침팬지의 원숭이 사냥을 든다. 침팬지 무리는 원숭이를 사냥할 때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녀석들은 광경을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사냥을 지켜보기만 했던 침팬지도 나중에는 고기를 나눠먹는다. 그들은 게으름뱅이와 조력자를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네 살배기 어린아이도 누가 돕고 빈둥거리는지 구별한다. 도움을 준 친구와는 사탕을 나누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외면한다. (고쳐야 할 행동으로 보이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중요하다. “협력자와 방관자를 구별하지 않는 동물은 효과적인 팀을 구성하고 유지할 능력을 절대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사회관계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인간은 집단과 연결을 유지할 다양한 방법을 진화시켰다. 즉 구성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인간은 당장은 이익이 없어도 머릿속 생각을 끊임없이 공유하길 원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사람과 물체를 가리키는 행동은 다른 동물의 발달 단계에서는 목격되지 않는다. 공유에 대한 열망은 인간이 지닌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다.
저자는 이해한 내용과 경험을 나누려는 욕구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감정 반응도 남과 공유하려는 게 인간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책이 도달하는 결론은 간명하다. ‘친화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진화가 더디다’는 의미로 수렴된다.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살아남기 유리한 구조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국경제신문·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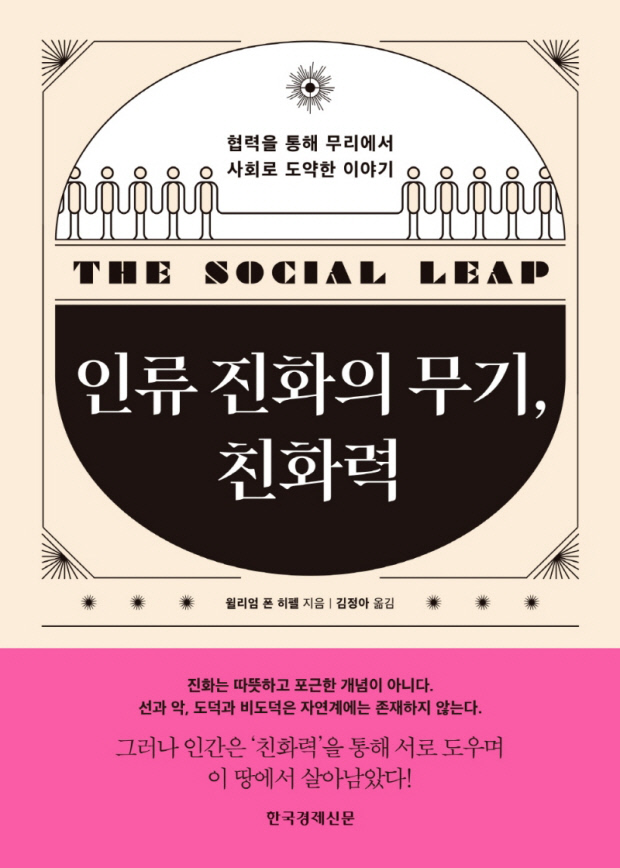  |
저자는 심리의 변화를 주목한다. 우리 몸은 지난 600~700만년 동안 조금 바뀌었지만 심리는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마음과 두뇌의 적응이자 사회관계 기능으로, 특히 협동 능력과 직결된다.
그 예로 히펠 교수는 침팬지의 원숭이 사냥을 든다. 침팬지 무리는 원숭이를 사냥할 때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녀석들은 광경을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사냥을 지켜보기만 했던 침팬지도 나중에는 고기를 나눠먹는다. 그들은 게으름뱅이와 조력자를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네 살배기 어린아이도 누가 돕고 빈둥거리는지 구별한다. 도움을 준 친구와는 사탕을 나누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외면한다. (고쳐야 할 행동으로 보이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중요하다. “협력자와 방관자를 구별하지 않는 동물은 효과적인 팀을 구성하고 유지할 능력을 절대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사회관계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인간은 집단과 연결을 유지할 다양한 방법을 진화시켰다. 즉 구성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인간은 당장은 이익이 없어도 머릿속 생각을 끊임없이 공유하길 원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사람과 물체를 가리키는 행동은 다른 동물의 발달 단계에서는 목격되지 않는다. 공유에 대한 열망은 인간이 지닌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다.
저자는 이해한 내용과 경험을 나누려는 욕구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감정 반응도 남과 공유하려는 게 인간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책이 도달하는 결론은 간명하다. ‘친화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진화가 더디다’는 의미로 수렴된다.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살아남기 유리한 구조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국경제신문·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