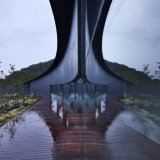황야의 이리-헤르만 헤세 지음, 이준서·이재금 옮김
2021년 09월 30일(목) 21:40 가가
그는 열네 살에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7개월 만에 스스로 그만뒀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때문이었다. 바로 헤르만 헤세(1877~1962)다.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등으로 사랑을 받았던 작가다. 1946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며 독일인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20세기 최고의 문인 가운데 한명이다.
이번에 열림원 헤르만 헤세 컬렉션으로 출간된 세 번 째 작품 ‘황야의 이리’는 70년대 젊은 독자들에게 헤세 붐을 일으켰던 소설이다. 개인의 정체성 탐색을 비롯해 기술문명에 대한 경계, 사회체제를 향한 노골적인 비판과 저항으로 많은 이들에게 각인됐던 명작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위기를 고백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작가의 고통이 페르소나인 하리 할러에게 투영돼 있다. 할러는 자신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이리”라고 믿는 내적 분열이 심각한 남자다. 본질적으로는 부르주아지만 그러면서 평범한 시민사회를 경원시하며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웃사이더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은 헤세의 개인적인 경험이 스며 있다. 이혼을 비롯해 하숙, 통풍에 이르는 할러의 삶은 작가와 뗄 수 없는 요인이다. 할러는 특히 부패한 보수주의자와 정치인들을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으며 언젠가 도래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떤다. 특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시민사회에 대한 비난과 경멸로 이어진다. 헤세는 이렇듯 자신의 분신인 할러를 통해 분열된 자신의 자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시종일관 고통을 해결해 줄 ‘구원’을 찾아 방황한다. <열림원·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위기를 고백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작가의 고통이 페르소나인 하리 할러에게 투영돼 있다. 할러는 자신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이리”라고 믿는 내적 분열이 심각한 남자다. 본질적으로는 부르주아지만 그러면서 평범한 시민사회를 경원시하며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웃사이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