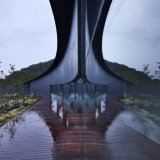“난민·소외이웃 위한 정결한 기도서”
2021년 08월 31일(화) 00:00 가가
광양 출신 박연수 첫 시집 ‘더 이상 부르지 않은 이름’ 발간
이력이 특이한 문인의 경우 작품 세계 또한 범상치 않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결국 모든 작가는 살아온 만큼 글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작품의 토대가 된다는 의미다.
광양 출신 박연수 시인은 이색적인 이력의 작가다.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타직신학대, 유수프신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타지키스탄 선교사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난민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이슬람 전문가이다.
그런 이력 때문일까. 박연수 시인의 첫 시집 ‘더 이상 부르지 않은 이름’(문학들)은 더더욱 눈길을 끈다.
이승하 시인은 “지난 100년 동안 발간된 그 어떤 시집과도 변별되는 색채의 시집”, 이영광 시인은 “정결하고도 뜨거운 기도서 같다”고 상찬했다.
이러한 평은 결국 시인의 삶이 시속에 온전히 투영돼 있다는 의미를 전제로 한다. 오늘의 시대 척박하고 위험한 땅에서 난민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인의 작품은 한편 한편 기도 같기도 하고, 모든 삶을 응축한 고백 같기도 하다.
“자주 부르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을 때/ / 언어가 잘렸다/ 잃어버린 언어에 잃어버린 세계가 있었다// 잘린 문장 하나가 내 삶을 잘랐네”
표제시 ‘더 이상 부르지 않은 이름’은 심오하고 사색적이다. 작품은 이전에는 자주 불렀지만 언젠가부터 부르지 않아 일어난 상황을 그리고 있다. 그 언어가 잘리는 순간, 언어가 함의하는 세계도 그 이상의 것도 함께 상실된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이국의 땅에서 만난 난민들은 단순한 만남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을 이해하고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시인의 진실한 비망록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음의 작품은 간절한 기도로 수렴된다.
“내가 네 통곡을 울기까지/ 네 소외를 살기까지/ 사랑이 아니었다// 언어는 몸 밖으로 나온 물들// 영혼의 몸”(‘눈물 110도’ 중에서)
한편 박 시인은 1994년 MBC 창작동화, 2019년 ‘미래시학’으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양 출신 박연수 시인은 이색적인 이력의 작가다.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타직신학대, 유수프신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타지키스탄 선교사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난민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이슬람 전문가이다.
이승하 시인은 “지난 100년 동안 발간된 그 어떤 시집과도 변별되는 색채의 시집”, 이영광 시인은 “정결하고도 뜨거운 기도서 같다”고 상찬했다.
표제시 ‘더 이상 부르지 않은 이름’은 심오하고 사색적이다. 작품은 이전에는 자주 불렀지만 언젠가부터 부르지 않아 일어난 상황을 그리고 있다. 그 언어가 잘리는 순간, 언어가 함의하는 세계도 그 이상의 것도 함께 상실된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이국의 땅에서 만난 난민들은 단순한 만남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을 이해하고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시인의 진실한 비망록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음의 작품은 간절한 기도로 수렴된다.
“내가 네 통곡을 울기까지/ 네 소외를 살기까지/ 사랑이 아니었다// 언어는 몸 밖으로 나온 물들// 영혼의 몸”(‘눈물 110도’ 중에서)
한편 박 시인은 1994년 MBC 창작동화, 2019년 ‘미래시학’으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