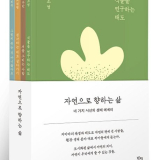10년 후 광주 -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2023년 12월 06일(수) 00:00 가가
가끔 10년 후 광주의 모습을 생각해본다. 지금보다 매력과 아름다움이 더해져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높아지고 타지에서 광주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오는 발길이 더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도처에 늘어선 고층 아파트의 시멘트 벽에 가로막히고 곳곳이 자동차로 가득한 삭막한 도시의 대명사가 될 것인가.
도시 및 국토 개발이 시작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사유지와 공유지를 구분한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넘어온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공유지를 넘겨줬다. 그들이 지배계층으로 자리를 잡아야 조선 통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읍성 내 조선의 공공기관은 일본인들의 상점으로 바뀌었고, 광주천변 등지에는 공장, 주거지 등이 들어섰다. 도시 공간의 왜색화는 공유 공간을 개발해 사유화하고, 일본인과 그 기업들에게 개발하도록 해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다.
1950~60년대 전남도청이 중심인 광주의 구시가지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판잣집이나 임시로 대충 지은 주택들로 가득했다. 수도, 전기, 하수도 등 필수적인 도시 기반시설과 일자리가 구시가지에 집중된 탓이다.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그 혜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쪼개거나 하천변이나 도로 등 그나마 남아 있는 공유지를 점유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건축 기술이 받쳐주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주거 모델은 오로지 아파트였다. 좁은 부지에 높게 지을 수 있으니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택 공급이라는 공적 기여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아파트를 짓기 위한 난개발이 이뤄지고 상품처럼 거래됐다. 그 결과 대로, 골목길, 언덕 위, 공원, 학교 등 어디든 거대한 시멘트 건물이 가득찼다.
이제 100년이 넘는 광주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개발이 과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는가를 되돌아봐야 할 때다. 광주시의 개발 인허가는 앞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반드시 그 내용이 사전에 공개돼야 한다. 공유 공간의 대거 확대, 주택 수요 맞춤형 공급, 거리와 상업의 부흥 같은 처방도 시급하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kwangju.co.kr
이제 100년이 넘는 광주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개발이 과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는가를 되돌아봐야 할 때다. 광주시의 개발 인허가는 앞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반드시 그 내용이 사전에 공개돼야 한다. 공유 공간의 대거 확대, 주택 수요 맞춤형 공급, 거리와 상업의 부흥 같은 처방도 시급하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