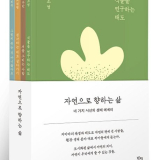“나는 고려 사람이다”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2022년 08월 16일(화) 23:00 가가
“1940년경에 우리 극장에서 적으만한 일을(수직원) 하섯다. 그때 (태)장춘 동무는 집에 다려다 식사를 하게 하고 일하는 장소에 차자 가서 그의 쉽지 않은 이야기를 밤이 깊도록 지나온 생활의 역사를 들엇다. 그때 나 역시 종종 같이 가서 우스며 눈물을 먹음으며 들었다. 성질이 급하고 노인이라도 근력이 좋아서 이야기하실 때는 눈에서 불이 번쩍이는 듯하였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식사를 하실 때는 늘 슬픈 기색이 얼골에 나타났다. 그의 말슴에 의하면 빨찌산에 다닐 때에 늘 이런 음식을 먹고 싶었지….”
광주시 광산구 월곡 고려인문화관 ‘결’에 전시돼 있는 고려극장 인민배우 리함덕의 육필 회상기 ‘홍범도 장군님에게 대한 간단한 추억’의 일부이다. 극작가인 남편 (태장춘)이 희곡 ‘홍범도’(1942년)를 집필할 때 홍 장군과 한 달여간 같이 지내며 겪은 일화를 묘사하고 있다. 연극을 본 장군은 소감을 묻자 “당신들 나를 너무 추켜세웠구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을 맞아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문화관 내에는 문 빅토르 화백이 올 봄 완성한 장군의 초상화를 비롯해 연해주 항일운동과 문화운동,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등 고려인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 가운데 ‘쌀이냐 책이냐?’ 코너가 인상적이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될 때 다수는 ‘쌀’(볍씨)을, 소수는 ‘책’을 가지고 열차에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황무지를 일궈 벼를 재배했고, 모국어와 전통 문화예술을 소중히 지켜 나갈 수 있었다.
광주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여천(汝天) 홍범도(1868~1943) 장군은 고려인들의 자긍심이자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고려인들은 모국어신문 ‘레닌기치’를 재창간하고, 우리말 극장인 ‘고려극장’을 운영하며 민족문화의 명맥을 잇고자 했다. 1942년 연극 ‘홍범도’를 무대에 올렸고, 장편소설과 시 등 많은 문학작품에 홍 장군의 영웅적 서사를 녹여냈다. 또 1951년 방치된 묘소를 새롭게 단장했고, 1984년 묘소에 흉상을 세웠다.
광복 77주년이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을 맞은 15일 광주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다모아 어린이공원 한편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세워진 것이다. 이날 제막식 부제는 ‘바람이 되어 카자흐스탄에서 월곡으로’였다. ‘광복군 아리랑’ 퍼포먼스와 함께 ‘부죤놉카 군모’를 쓴 홍 장군의 모습을 형상화한 흉상(조각가 김희상 작)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군이 세상을 떠난 카자흐스탄 크즐우르다와 고려인 동포들이 모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월곡동 고려인마을이 수천㎞의 거리를 뛰어넘어 하나의 단단한 끈으로 연결되는 듯했다.
부끄럽게도 얼마전까지 홍범도 장군의 발자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고교 시절 역사 시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주역으로 이름 정도만 겨우 배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태 속에서 홍범도 장군의 후반기 생애는 한국 현대사에서 지워지다시피했다.
이동순 시인(영남대 명예교수)은 1984년 서사시 ‘홍범도’ 창작에 나섰다. 그러나 자료 부족과 상상력의 고갈, 건강 악화로 인해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후 2000년부터 ‘새롭고 귀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작품에 매달려 3년 후 민족서사시 ‘홍범도’(전 10권)를 펴낼 수 있었다. 정작 서사시를 완성하고도 출판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인은 출간의 변(辯)에서 “청산리에서의 승전 이래로 줄곧 고통과 좌절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다 기어이 고국땅에서조차 망각의 수렁에 묻혀 반세기가 넘도록 되살아나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의 고독하고 우울하던 후반기 생애와도 무척 닮아있다는 느낌을 절감하였다”고 적었다.
정체성 지켜온 동포들 끌어안아야
월곡 고려인문화관 ‘결’에서는 ‘고려극장 창립 90주년 기획전’과 고려인 민족음악의 집대성자이자 카자흐스탄 재즈 음악의 개척자인 ‘한 야코브 작곡가 특별전’이 함께 열리고 있다. 전시물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고려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지켜내고 자긍심을 갖고 살았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월곡 고려인마을의 역할이 크다.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건립을 계기로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넓게 이해하고, 모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할 것이다.
“나는 로씨야 원동/ 이만강변 사람이다/ 백두산 신령이 먹이지 못해/ 멀리 강 건너로 쫓아낸/ 할아버지의 손자로다./ 로씨야의 ‘마마’보다도/ 카사흐의 ‘아빠’보다도/ 그루시야의 ‘나나’보다도/ 고려의 ‘어머니’란 말이/ 내 정신엔 뿌리 더 깊다.”(김준 ‘나는 고려 사람이다’)
/song@kwangju.co.kr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여천(汝天) 홍범도(1868~1943) 장군은 고려인들의 자긍심이자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고려인들은 모국어신문 ‘레닌기치’를 재창간하고, 우리말 극장인 ‘고려극장’을 운영하며 민족문화의 명맥을 잇고자 했다. 1942년 연극 ‘홍범도’를 무대에 올렸고, 장편소설과 시 등 많은 문학작품에 홍 장군의 영웅적 서사를 녹여냈다. 또 1951년 방치된 묘소를 새롭게 단장했고, 1984년 묘소에 흉상을 세웠다.
광복 77주년이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을 맞은 15일 광주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다모아 어린이공원 한편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세워진 것이다. 이날 제막식 부제는 ‘바람이 되어 카자흐스탄에서 월곡으로’였다. ‘광복군 아리랑’ 퍼포먼스와 함께 ‘부죤놉카 군모’를 쓴 홍 장군의 모습을 형상화한 흉상(조각가 김희상 작)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군이 세상을 떠난 카자흐스탄 크즐우르다와 고려인 동포들이 모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월곡동 고려인마을이 수천㎞의 거리를 뛰어넘어 하나의 단단한 끈으로 연결되는 듯했다.
부끄럽게도 얼마전까지 홍범도 장군의 발자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고교 시절 역사 시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주역으로 이름 정도만 겨우 배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태 속에서 홍범도 장군의 후반기 생애는 한국 현대사에서 지워지다시피했다.
이동순 시인(영남대 명예교수)은 1984년 서사시 ‘홍범도’ 창작에 나섰다. 그러나 자료 부족과 상상력의 고갈, 건강 악화로 인해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후 2000년부터 ‘새롭고 귀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작품에 매달려 3년 후 민족서사시 ‘홍범도’(전 10권)를 펴낼 수 있었다. 정작 서사시를 완성하고도 출판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인은 출간의 변(辯)에서 “청산리에서의 승전 이래로 줄곧 고통과 좌절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다 기어이 고국땅에서조차 망각의 수렁에 묻혀 반세기가 넘도록 되살아나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의 고독하고 우울하던 후반기 생애와도 무척 닮아있다는 느낌을 절감하였다”고 적었다.
정체성 지켜온 동포들 끌어안아야
월곡 고려인문화관 ‘결’에서는 ‘고려극장 창립 90주년 기획전’과 고려인 민족음악의 집대성자이자 카자흐스탄 재즈 음악의 개척자인 ‘한 야코브 작곡가 특별전’이 함께 열리고 있다. 전시물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고려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지켜내고 자긍심을 갖고 살았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월곡 고려인마을의 역할이 크다.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건립을 계기로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넓게 이해하고, 모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할 것이다.
“나는 로씨야 원동/ 이만강변 사람이다/ 백두산 신령이 먹이지 못해/ 멀리 강 건너로 쫓아낸/ 할아버지의 손자로다./ 로씨야의 ‘마마’보다도/ 카사흐의 ‘아빠’보다도/ 그루시야의 ‘나나’보다도/ 고려의 ‘어머니’란 말이/ 내 정신엔 뿌리 더 깊다.”(김준 ‘나는 고려 사람이다’)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