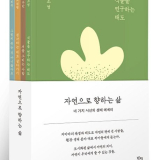선암사의 삼무(三無)를 되새기며-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2022년 07월 26일(화) 22:00 가가
정호승 시인의 ‘선암사’라는 시가 있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로 시작되는 시는 마치 산사에서 구전되어 온 노래처럼 정겹다. 언제 읽어도 그 시는 마음을 다독이는 힘이 있다. 혹여 선암사에 가본 적이 없는 이들도 그 시를 들으면 가슴 한편이 싸해진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계상황에 몰려 폐업을 하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사랑하는 가족과 영영 이별을 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다. 열심히 일해도 최저 생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어쩌면 이들에게 삶은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사막을 횡단하는 것처럼 고달프고 아득한 일일지 모른다.
50여 년 이어진 소유권 분쟁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운 이들에게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는 구절은 따뜻한 위로를 준다. 당장에라도 선암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천년 아름다운 고찰에 안겨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쓸쓸함이 씻겨 나갈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선암사는 ‘속세’의 사람들을 품어 줄 여력이 없는 것 같다.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세웠다고 전해오는 유서 깊은 천년 고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태고종) 두 종단은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오랫동안 분쟁을 벌였다.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점유하는 형태가 수십 년간 지속됐다.
광주지법은 최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야생차 체험관 건물 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초 철거 소송 1·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 선암사가 실질적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 실체가 없고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최근 광주고법에서 열린 사찰 건물, 부지 관련 등기 소송에서도 태고종 선암사가 일부 승소했다. 등기 명의는 조계종 선암사 측에 있지만 소유권은 사찰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온 태고종 선암사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선암사를 둘러싼 두 종단의 갈등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대처 측 승려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태고종은 선암사를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1971년 건물과 토지 등을 등기했다. 그러나 조계종 선암사 측은 박정희 정부 시절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선암사는 조계종 사찰’이라는 사실 증명원을 토대로 1972년 9월 조계종 측 소유로 변경 등기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수십 년간 선암사는 등기상 소유와 실질적인 점유가 다른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 그러다 2014년 순천시가 사찰 부지에 건립한 ‘전통차 체험관’ 소유권을 둘러싸고 두 종단의 다툼이 시작돼, 사찰 재산 전체를 둘러싼 소송으로 확대됐다.
천년 고찰에 깃든 정신 퇴색 우려
사실 선암사를 아끼는 이들은 복잡한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대부분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른 봄 피어나는 눈부신 홍매와 백매, ‘신선이 하늘로 오른다’는 뜻의 승선교(昇仙橋), 8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 고즈넉한 시골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은 너무도 아름답다.
설화에 따르면 선암사(仙巖寺)의 명칭은 크고 평평한 바위에서 유래했다. 조계산 서쪽의 바위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는데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던 모양이다. 10여 장(丈)이나 되는 돌에서의 신선놀음은 아마도 풍광에 취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선암사는 다른 절과 달리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사천왕문, 대웅전 협시보살상과 어간문(대웅전 중앙문)이 그것인데, 이를 삼무(三無)라 한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깨달음과 연관돼 있다. 그 깨달음은 결국 불교의 핵심인 무(無), 공(空) 사상으로 전이된다. 명산대찰의 스님들이 그 ‘없음’의 의미를 모를 리 없으련만, 혹여 작금의 분쟁이 선암사에 깃든 정신을 가릴까 우려스럽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운 이들에게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는 구절은 따뜻한 위로를 준다. 당장에라도 선암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천년 아름다운 고찰에 안겨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쓸쓸함이 씻겨 나갈지 모를 일이다.
광주지법은 최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야생차 체험관 건물 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초 철거 소송 1·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 선암사가 실질적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 실체가 없고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최근 광주고법에서 열린 사찰 건물, 부지 관련 등기 소송에서도 태고종 선암사가 일부 승소했다. 등기 명의는 조계종 선암사 측에 있지만 소유권은 사찰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온 태고종 선암사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선암사를 둘러싼 두 종단의 갈등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대처 측 승려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태고종은 선암사를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1971년 건물과 토지 등을 등기했다. 그러나 조계종 선암사 측은 박정희 정부 시절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선암사는 조계종 사찰’이라는 사실 증명원을 토대로 1972년 9월 조계종 측 소유로 변경 등기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수십 년간 선암사는 등기상 소유와 실질적인 점유가 다른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 그러다 2014년 순천시가 사찰 부지에 건립한 ‘전통차 체험관’ 소유권을 둘러싸고 두 종단의 다툼이 시작돼, 사찰 재산 전체를 둘러싼 소송으로 확대됐다.
천년 고찰에 깃든 정신 퇴색 우려
사실 선암사를 아끼는 이들은 복잡한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대부분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른 봄 피어나는 눈부신 홍매와 백매, ‘신선이 하늘로 오른다’는 뜻의 승선교(昇仙橋), 8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 고즈넉한 시골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은 너무도 아름답다.
설화에 따르면 선암사(仙巖寺)의 명칭은 크고 평평한 바위에서 유래했다. 조계산 서쪽의 바위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는데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던 모양이다. 10여 장(丈)이나 되는 돌에서의 신선놀음은 아마도 풍광에 취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선암사는 다른 절과 달리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사천왕문, 대웅전 협시보살상과 어간문(대웅전 중앙문)이 그것인데, 이를 삼무(三無)라 한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깨달음과 연관돼 있다. 그 깨달음은 결국 불교의 핵심인 무(無), 공(空) 사상으로 전이된다. 명산대찰의 스님들이 그 ‘없음’의 의미를 모를 리 없으련만, 혹여 작금의 분쟁이 선암사에 깃든 정신을 가릴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