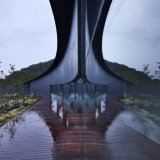‘맛있는 것’보다 ‘유일한 것’…가치를 굽는 사람들
2021년 11월 13일(토) 10:00 가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시골빵집에서 균의 소리를 듣다
와타나베 이타루 외 지음, 정문주 옮김
시골빵집에서 균의 소리를 듣다
와타나베 이타루 외 지음, 정문주 옮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가장 약한 자가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면 된다. 나는 맥주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다양성을 낳고 나아가 맥주 시장의 가치관을 넓히고 싶다. 그래서 내 목적은 ‘맛있는 것’, ‘멋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장하면 ‘맛없는’ 걸 만들면 어떤가 하는 게 내 생각이다.”(본문 중에서)
‘인간이 목숨을 유지하려면 자기 외의 존재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책 첫 문장이 강렬하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은, 아니 의시하지 못한 질문이다.
다른 이를, 타자를 망가뜨리지 않고 존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사뭇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그 같은 질문의 답을 야생 균에서 찾은 이들이 있다. 매일 아침 빵을 만들기 전 이들은 균을 확인한다.
일본 변방의 빵집 주인이었던 와타나베 이타루와 와타나베 마리코 부부. 2014년 이들 부부가 쓴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는 거대한 자본에 저항하는 소박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당시 토마 파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던 때라 ‘자본’과 ‘노동’ 같은 단어들이 회자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삶과 노동이 하나되는 인생을 추구했던 이들 부부의 이야기는 다큐 영화로까지 제작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시골빵집에서 균의 소리를 듣다’는 이들 와타나베 부부가 그 이후의 도전과 변화, 성찰을 담은 책이다. 더욱 가속화하는 자본의 시대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열쇠는 ‘균’이었다. 이들은 균이 인간활동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균은 빵을 만드는 사람은 물론이고 빵집의 위생, 마을 전체의 환경과도 연계됐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으면 유해한 푸른곰팡이가 피었고 괴로워하는 직원이 있으면 반죽이 흐물흐물해졌다. 인근 농지에서 농약을 치면 이후에는 검은곰팡이가 피었다.
작은 균은 그렇게 온 세계와 연결돼 있었다. 단순히 빵을 만드는 데서 나아가 자연에 가까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누룩균을 채취한 지 12년째지만 여전히 그들은 균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한다.
부부가 빵에 이어 새로운 도전에 나선 분야는 수제 맥주다. 천연 효모를 이용해 맥주를 만드는 일은,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목을 잡았다. 대기업이 맥주를 과점하고 ‘맥주 맛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심어놓았던 것.
그러나 부부는 ‘맛있는 것’이 아닌 ‘유일한 것’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기존 맥주 업계에서 무관심했던 유산균을 활용한다.
숙성 기간에는 맥주를 팔 수 없어 이윤이 남지 않는다 했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들고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이야말로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신념을 고수한다. 행위의 목적은 ‘시장의 가치관을 넓히는 일’에 도전하는 데 있었다.
사실 자본주의는 획일성을 요구하며 교육까지도 틀에 맞추길 원한다. 저자들은 야생의 균을 채취하면서 비로소 ‘나다움’을 되찾는다. 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생명은 신비롭다. 다른 방식으로 살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그 결과로 빵과 알코올이라는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니 말이다.
부부는 ‘좋은 균’, ‘나쁜 균’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흑백을 분명하게 가르는 원리주의적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인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 많은 생명체가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진다는 자연계의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려면 자연계가 늘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매일 실감해야 한다. 그렇다고 꼭 나 같은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역동적인 자연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더숲·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른 이를, 타자를 망가뜨리지 않고 존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사뭇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그 같은 질문의 답을 야생 균에서 찾은 이들이 있다. 매일 아침 빵을 만들기 전 이들은 균을 확인한다.
  |
| 오래전 문을 닫은 보육원을 리모델링한 시골빵집 다루마리에서 만든 빵. <더숲 제공> |
  |
| 다루마리의 외관 <더숲 제공> |
작은 균은 그렇게 온 세계와 연결돼 있었다. 단순히 빵을 만드는 데서 나아가 자연에 가까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누룩균을 채취한 지 12년째지만 여전히 그들은 균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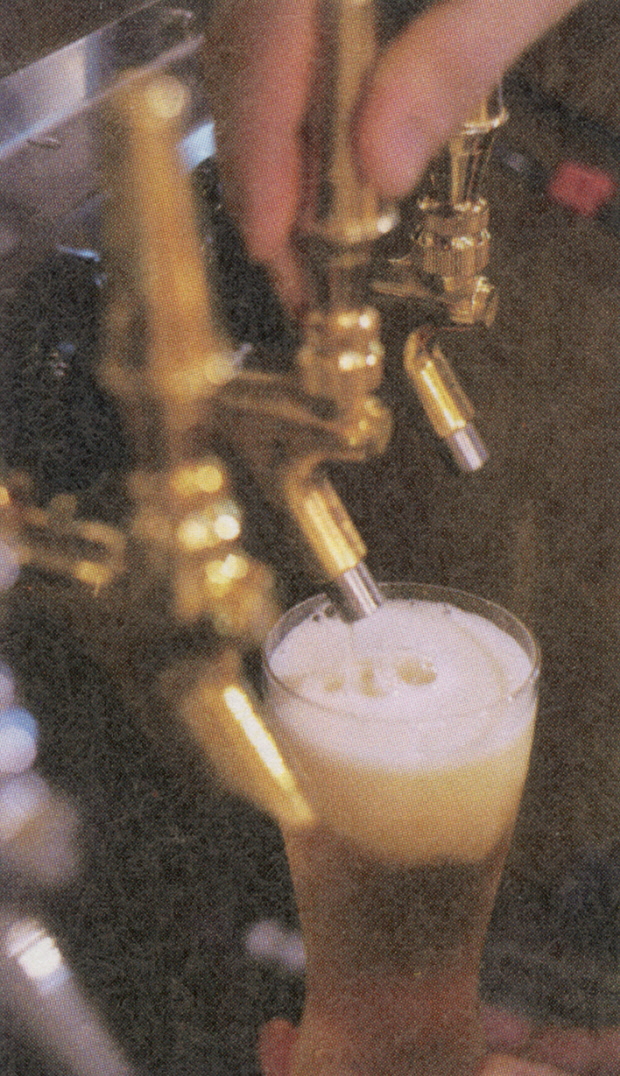  |
| 루마리에서 만든 맥주. <더숲 제공> |
그러나 부부는 ‘맛있는 것’이 아닌 ‘유일한 것’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기존 맥주 업계에서 무관심했던 유산균을 활용한다.
숙성 기간에는 맥주를 팔 수 없어 이윤이 남지 않는다 했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들고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이야말로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신념을 고수한다. 행위의 목적은 ‘시장의 가치관을 넓히는 일’에 도전하는 데 있었다.
사실 자본주의는 획일성을 요구하며 교육까지도 틀에 맞추길 원한다. 저자들은 야생의 균을 채취하면서 비로소 ‘나다움’을 되찾는다. 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생명은 신비롭다. 다른 방식으로 살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그 결과로 빵과 알코올이라는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니 말이다.
부부는 ‘좋은 균’, ‘나쁜 균’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흑백을 분명하게 가르는 원리주의적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인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 많은 생명체가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진다는 자연계의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려면 자연계가 늘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매일 실감해야 한다. 그렇다고 꼭 나 같은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역동적인 자연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더숲·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