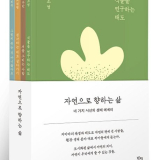조선대, ‘1·8 항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2022년 09월 13일(화) 22:30 가가
조선대 집행부와 법인 이사회가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사실 학내 자유에 민감한 대학 구성원들과 법적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이사회가 갈등하는 것은 조선대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이사진 퇴진 운동도 있었고 특정 이사 퇴출 집회도 여러 차례였다. 다만 이번에는 총장이 징계 대상이 돼 주목받고 있을 뿐이다. 총장이 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적도 있어 이 또한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총장을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대상에 올려놓은 사태의 발단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보고서 누락과 교수의 대리 강의 건이다. 공과대학 모 교수는 무려 여섯 학기 동안 수업을 강사에게 대신 맡기고 강단에 서지 않았다. 미래사회융합대학 모 교수는 지난해 국책 사업인 ‘평생교육체제 지원’과 관련한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 시한을 나흘 앞두고 보직사표를 내고 소속 교수들도 무더기 가세함으로써 조선대는 매년 7억여 원을 지원받았던 해당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 애초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수 등 당사자를 징계했으나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단과대학장 두 명은 징계 대상에서 배제했다. 반면 이사회는 이들에 대해서도 총장 직권으로 징계안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총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7월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7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좌시할 수 없는 위기의 증후들
세상의 눈길이 온통 총장 징계에 쏠리고 있지만 문제가 된 징계 건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도대체 교수가 무려 3년 동안 대리 강사를 내세우고 수업을 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상식 밖이지만 조선대에서는 통했다.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더 기막힌 사실이 기록돼 있다. 학생들이 이 사실을 2016년 제보했음에도 확인되지 않았고 강의 평가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 몇 명 불러 물어보면 드러날 사안이 묻힌 것은 결국,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학교는 물론 교수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해도 부족할 일이다. 학습권을 보장하고 옹호해야 할 교수가 되레 침해한 치명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위기 경보는 조선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무용과 교수 등 두 명은 ‘2022학년도 1학기 강의전담 교원’ 선발 과정 등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공대 교수는 최근 여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는 공과대학 교수 아홉 명이 동료 교수 아들의 출석을 조작하고 논문을 통과시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나마 언론을 타고 외부에 알려진 게 이 정도다. 일련의 사건은 학교가 곪아가고 있다는 심각한 시그널이다. 수많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느슨한 인식의 연대가 있다면 조선대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조선대 안팎에서 이사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대 구성원들로서는 억울한 일이나 차기 총장 후보군이 배후에서 법인 이사회와 집행부 갈등을 부각함으로써 입지를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만으로도 선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런 설이 나돈다면 조선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순수한 고민과 열정이 곡해되기 때문이다.
강력한 개혁으로 미래 기약해야
조선대는 민립 대학을 사유화한 구체제를 1988년 1·8 항쟁으로 퇴출하고 혁명을 단행했다. 총장·이사 등 경영진 퇴진과 학내 민주화를 촉구하며 무려 113일 동안 투쟁과 농성을 벌여 학내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조선대는 혁명은커녕 혁신을 거론하기도 민망한 처지에 놓였다. 총장이 바뀔 때마다 혁신과 변화를 표방했지만 실천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2018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재정 지원 제한과 함께 신입생 선발 인원이 감축되는 사태를 겪었음에도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충격으로 혁신위원회를 꾸려 개혁안을 담아 백서를 만들었지만 사문화됐다.
개혁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필연적으로 구성원들의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조선대 구성원이 개혁하지 않으면 대학의 미래가 없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투쟁했던 1·8 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한 개혁의 첫걸음을 떼야 할 때가 됐다. 철옹성을 무너뜨린 1·8 항쟁의 정신이 조선대 구성원들의 가슴에 면면히 살아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penfoot@kwangju.co.kr
세상의 눈길이 온통 총장 징계에 쏠리고 있지만 문제가 된 징계 건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도대체 교수가 무려 3년 동안 대리 강사를 내세우고 수업을 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상식 밖이지만 조선대에서는 통했다.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더 기막힌 사실이 기록돼 있다. 학생들이 이 사실을 2016년 제보했음에도 확인되지 않았고 강의 평가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 몇 명 불러 물어보면 드러날 사안이 묻힌 것은 결국,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학교는 물론 교수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해도 부족할 일이다. 학습권을 보장하고 옹호해야 할 교수가 되레 침해한 치명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위기 경보는 조선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무용과 교수 등 두 명은 ‘2022학년도 1학기 강의전담 교원’ 선발 과정 등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공대 교수는 최근 여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는 공과대학 교수 아홉 명이 동료 교수 아들의 출석을 조작하고 논문을 통과시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나마 언론을 타고 외부에 알려진 게 이 정도다. 일련의 사건은 학교가 곪아가고 있다는 심각한 시그널이다. 수많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느슨한 인식의 연대가 있다면 조선대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조선대 안팎에서 이사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대 구성원들로서는 억울한 일이나 차기 총장 후보군이 배후에서 법인 이사회와 집행부 갈등을 부각함으로써 입지를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만으로도 선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런 설이 나돈다면 조선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순수한 고민과 열정이 곡해되기 때문이다.
강력한 개혁으로 미래 기약해야
조선대는 민립 대학을 사유화한 구체제를 1988년 1·8 항쟁으로 퇴출하고 혁명을 단행했다. 총장·이사 등 경영진 퇴진과 학내 민주화를 촉구하며 무려 113일 동안 투쟁과 농성을 벌여 학내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조선대는 혁명은커녕 혁신을 거론하기도 민망한 처지에 놓였다. 총장이 바뀔 때마다 혁신과 변화를 표방했지만 실천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2018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재정 지원 제한과 함께 신입생 선발 인원이 감축되는 사태를 겪었음에도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충격으로 혁신위원회를 꾸려 개혁안을 담아 백서를 만들었지만 사문화됐다.
개혁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필연적으로 구성원들의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조선대 구성원이 개혁하지 않으면 대학의 미래가 없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투쟁했던 1·8 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한 개혁의 첫걸음을 떼야 할 때가 됐다. 철옹성을 무너뜨린 1·8 항쟁의 정신이 조선대 구성원들의 가슴에 면면히 살아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