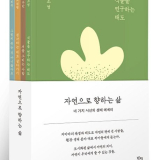‘라떼’의 여름휴가-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2022년 08월 30일(화) 22:00 가가
그토록 기승을 부렸던 폭염도 꺾이고, 아직 하루가 남아 넘기지 않은 달력이 8월에 걸린 여름의 끝자락이다.
책상 위에 놓인 탁상 달력의 날짜 칸들은 빨간색 화살표와 검은색 볼펜으로 쓴 이름들로 빼곡하다. 빨간 펜으로 기자들의 휴가 첫날과 마지막날을 화살표로 그리고, 그 위에 해당 기자의 이름을 적은 탓에 휴가 시즌인 8월의 탁상 달력은 정신 사나울 수밖에 없다.
성수기는 선배가 먼저 찜하던 시절
탁상 달력에 기자들의 휴가나 연가, 개인 스케줄을 적어 관리하는 버릇은 기자 입문 초기인 사건기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중·후반 사회부 사건 막내 기자 시절, 휴가철만 되면 탁상 달력을 들고 부서를 한 바퀴 돌았다. 가장 먼저 데스크에게 “부장님, 휴가 날짜 표시해 주십시요”라고 하면, 부장님은 대부분 빨간 펜으로 엿새 정도를 표시해 준다. 다음 순서는 수석 차장으로, 당시는 시청·도청 출입기자나 교육 담당 기자였다. 수석 차장은 부장님의 휴가일을 피해 대여섯 날을 화살표로 표시해 준다. 이틀이나 사흘로 나눠 두 차례 쉬는 선배들도 있었다. 이어 선후배 순으로 차근차근 날짜를 선택한다. 서로 휴가가 겹치는 날을 피해 선택하다 보니 후배 기자들이 성수기인 7월 말~8월 초 기간에 휴가를 떠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뻔히 사정을 아는 탓에 7월 초에 이른 휴가를 떠나거나 아예 8월 하순 이후로 늦춰 잡기도 했다. 후배일지라도 해외여행이나 가족 여행을 하는 경우, 고3이나 중3 자녀를 둔 경우는 휴가를 길게 쓸 수 있었고 때론 선배와 상의해 날짜를 맞바꾸는 여유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탁상 달력 휴가 표기가 끝나면 막내 기자는 달력을 복사해 부서원 모두에게 나눠줬다.
사회부 사건기자들은 별도의 달력에 표기를 했다. 사건 캡(지방경찰청 담당)과 동·서·남·북 경찰서 담당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된 사건팀은 팀장인 캡과 부팀장격인 동부경찰서 출입기자만이 닷새 내외의 휴가를 갔고, 나머지 저연차 기자들은 사흘 가량 휴가를 갔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이 휴식이었고 휴식이 일이었던, 일과 휴식의 구분이 없던 시기였다. 출입처를 사흘 이상 비워 놓는 것이 불안하고, 혹시라도 대형 사건·사고가 터질까봐 걱정돼 스스로 휴가를 길게 쓰지 않았던 시절이다. 휴가 중이라도 대형 안전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때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복귀해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질 없는 기자로 낙인찍히기 쉬웠다. 당시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복귀하지 않은 사건기자가 있어, 선배들 입살에 올랐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조직은 오직 일만을 중시했고, 기자들도 일밖에 몰랐던 시기였다. 그때는 언론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일에 미쳐 돌아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개인의 권리나 입장보다는 조직 운영과 위계질서가 우선이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휴가 턱을 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 시절 광주일보 사옥이었던 전일빌딩 지하에는 전일다방이 있었다. 여유가 있는 고참 선배들은 휴가에서 돌아오면 전일다방에 주문해 부서원 전원에게 더덕즙이나 매실즙을 쐈다. 20~30년 전에도 더덕즙은 4500원일 정도로 최고급 음료였다. 중간 위치 선배들은 한 잔에 1500원 정도하는 커피를 샀다. 사건기자들끼리는 복귀 시 휴가초(담배)를 사서 돌렸던 기억도 남아 있다.
시대 변하니 개인 일정이 우선
이같이 ‘라떼’(나 때에는)의 여름휴가는 고작 사흘이었고, 그것도 제때 못 찾아 먹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때는 그랬다. 모두가 그래서 문제의식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다.
20~30년 전에는 막내 기자로서 선배들의 휴가 날짜를 받으러 돌아다녔는데, 올 여름에는 정치부 데스크로서 부서 단체 대화방을 통해 휴가 날짜를 받았다. 부원들에게 먼저 날짜 선택 기회를 줬고, 이후 빈 날짜를 찾아 휴가를 잡았다. 애초 사흘을 예정했다가 일이 생겨 데스크를 봐줄 선임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흘을 잡았다.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 옛날 방식으로 기자들의 휴가 일정을 표기한 탁상 달력, 빨간 화살표로 가득한 8월도 내일이면 넘겨야 한다. 여름이 끝나 간다. 방금 부서 단체 대화방에 미처 못 간 여름 휴가는 9월로 순연한다는 공지를 남겼다.
책상 위에 놓인 탁상 달력의 날짜 칸들은 빨간색 화살표와 검은색 볼펜으로 쓴 이름들로 빼곡하다. 빨간 펜으로 기자들의 휴가 첫날과 마지막날을 화살표로 그리고, 그 위에 해당 기자의 이름을 적은 탓에 휴가 시즌인 8월의 탁상 달력은 정신 사나울 수밖에 없다.
탁상 달력에 기자들의 휴가나 연가, 개인 스케줄을 적어 관리하는 버릇은 기자 입문 초기인 사건기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중·후반 사회부 사건 막내 기자 시절, 휴가철만 되면 탁상 달력을 들고 부서를 한 바퀴 돌았다. 가장 먼저 데스크에게 “부장님, 휴가 날짜 표시해 주십시요”라고 하면, 부장님은 대부분 빨간 펜으로 엿새 정도를 표시해 준다. 다음 순서는 수석 차장으로, 당시는 시청·도청 출입기자나 교육 담당 기자였다. 수석 차장은 부장님의 휴가일을 피해 대여섯 날을 화살표로 표시해 준다. 이틀이나 사흘로 나눠 두 차례 쉬는 선배들도 있었다. 이어 선후배 순으로 차근차근 날짜를 선택한다. 서로 휴가가 겹치는 날을 피해 선택하다 보니 후배 기자들이 성수기인 7월 말~8월 초 기간에 휴가를 떠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뻔히 사정을 아는 탓에 7월 초에 이른 휴가를 떠나거나 아예 8월 하순 이후로 늦춰 잡기도 했다. 후배일지라도 해외여행이나 가족 여행을 하는 경우, 고3이나 중3 자녀를 둔 경우는 휴가를 길게 쓸 수 있었고 때론 선배와 상의해 날짜를 맞바꾸는 여유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탁상 달력 휴가 표기가 끝나면 막내 기자는 달력을 복사해 부서원 모두에게 나눠줬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이 휴식이었고 휴식이 일이었던, 일과 휴식의 구분이 없던 시기였다. 출입처를 사흘 이상 비워 놓는 것이 불안하고, 혹시라도 대형 사건·사고가 터질까봐 걱정돼 스스로 휴가를 길게 쓰지 않았던 시절이다. 휴가 중이라도 대형 안전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때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복귀해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질 없는 기자로 낙인찍히기 쉬웠다. 당시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복귀하지 않은 사건기자가 있어, 선배들 입살에 올랐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조직은 오직 일만을 중시했고, 기자들도 일밖에 몰랐던 시기였다. 그때는 언론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일에 미쳐 돌아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개인의 권리나 입장보다는 조직 운영과 위계질서가 우선이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휴가 턱을 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 시절 광주일보 사옥이었던 전일빌딩 지하에는 전일다방이 있었다. 여유가 있는 고참 선배들은 휴가에서 돌아오면 전일다방에 주문해 부서원 전원에게 더덕즙이나 매실즙을 쐈다. 20~30년 전에도 더덕즙은 4500원일 정도로 최고급 음료였다. 중간 위치 선배들은 한 잔에 1500원 정도하는 커피를 샀다. 사건기자들끼리는 복귀 시 휴가초(담배)를 사서 돌렸던 기억도 남아 있다.
시대 변하니 개인 일정이 우선
이같이 ‘라떼’(나 때에는)의 여름휴가는 고작 사흘이었고, 그것도 제때 못 찾아 먹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때는 그랬다. 모두가 그래서 문제의식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다.
20~30년 전에는 막내 기자로서 선배들의 휴가 날짜를 받으러 돌아다녔는데, 올 여름에는 정치부 데스크로서 부서 단체 대화방을 통해 휴가 날짜를 받았다. 부원들에게 먼저 날짜 선택 기회를 줬고, 이후 빈 날짜를 찾아 휴가를 잡았다. 애초 사흘을 예정했다가 일이 생겨 데스크를 봐줄 선임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흘을 잡았다.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 옛날 방식으로 기자들의 휴가 일정을 표기한 탁상 달력, 빨간 화살표로 가득한 8월도 내일이면 넘겨야 한다. 여름이 끝나 간다. 방금 부서 단체 대화방에 미처 못 간 여름 휴가는 9월로 순연한다는 공지를 남겼다.